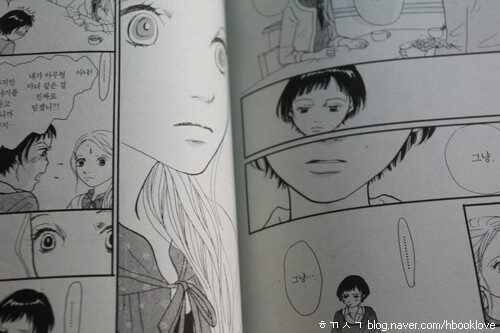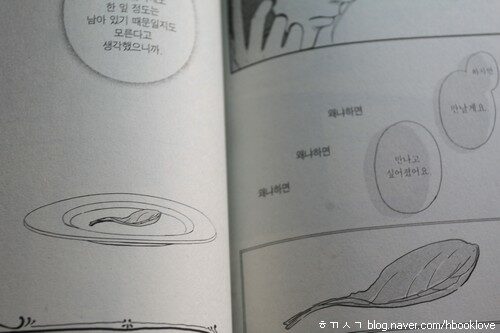-

-
여자의 식탁 8
시무라 시호코 글.그림 / 대원씨아이(만화) / 2013년 7월
평점 : 
품절



만화책 즐겨읽기 260
다 같이 먹는 밥
― 여자의 식탁 8
시무라 시호코 글·그림
장혜영 옮김
대원씨아이 펴냄, 2013.8.15. 4200원
아이들을 씻기고는 옷을 갈아입힙니다. 한여름 흠뻑 흘린 땀으로 젖은 옷을 빨면서 내 몸을 씻습니다. 빨래를 마친 옷은 마당에 넙니다. 후끈후끈 내리쬐는 땡볕에 빨래는 한 시간이 안 되어 바짝바짝 마릅니다. 다 말랐지만 마당에 옷가지를 그대로 둡니다. 오래오래 햇볕 머금으며 따스한 기운 한결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빨래가 마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집살림 이것저것 바깥에 내놓습니다. 나무로 된 살림살이를 말리고 또 말리며 자꾸 말립니다. 햇볕이 한가득 쏟아질 때마다 거듭거듭 말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 듬뿍 머금은 살림살이를 집안으로 들이면 퍽 오랫동안 따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베개도 이불도 기저귀도 옷가지도 주걱도 평상도 걸상도 밀대도 수저도 모두 따스합니다. 날마다 빨래를 하고 언제나 집안일을 하면서 이 햇살이 이렇게 사람살이를 북돋우면서 어루만지는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습니다.
- “난 옛날에 닭껍질을 못 먹었어. 오톨도톨하고 흐물흐물해 보여서 먹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싫어했거든. 이렇게 구운 건 물론이고, 프라이드 치킨도 카라아게도 전부 껍질을 일일이 벗겨 먹었을 정도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 그래서 언제부터 먹게 됐는데?” “아. 그건 말이지. 그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어.” (4쪽)
- “이거 치킨 샌드위치야?” “응.”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언니네 치킨 샌드위치 맛있다고 그랬는데.” “어머, 기뻐라. 내 자신작이야.” “먹고 싶어. 근데 난 닭껍질 싫어하는데. 오톨도톨하고 흐물거려서,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벗겨내고 먹어도 돼?” “응.” (11쪽)

낮잠 자야 할 아이들을 대청마루에 놀립니다. 자장노래를 부른들 시원한 자리에 누인들, 이 아이들이 곱게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눈에는 졸음 가득하고, 아이들 스스로 몸이 무거운 줄 알기에 마루에 드러누운 채 일어나지 않아요. 드러누워서 마루 이곳저곳 뒹굴며 놀아요. 드러누워서 만화책을 집기도 하고, 드러누워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놀아야지. 졸려도 안 자고 싶으면 졸음 가득한 몸으로 놀아야지.
다그친대서 아이들이 잠들지 않아요. 닦달하거나 들볶아도 아이들은 잠들지 않아요. 참말 졸음에 겨워야 잠들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이 아이들마냥 어릴 적에는 낮잠도 밤잠도 달갑지 않았어요. 참말 지쳐서 스르르 곯아떨어질 무렵까지 놀았어요.
시계를 보며 놀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놀고 싶으니 놉니다. 놀고 싶기에 놀아요. 그래서, 새벽이건 아침이건 딱히 대수롭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놀고, 잠들기 앞서까지 놉니다. 하루 내내 온통 놀이입니다.
- “진짜 괜찮아. 안 벗겨도.” ‘미치루 언니 앞에서, 지금,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 늘 아무렇지도 않게 벗겨내고 먹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휙 버렸으면서. 그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16∼17쪽)
- ‘쥬키니 호박을 된장국에. 아. 맛있어.’ “오이처럼 생겼는데 잘라 보니까 속은 가지 같아서, 된장국에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엄마가 만드는 건 다 이런 것뿐이지만. 하하.” ‘난, 정말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요즘 되는 일이 없다지만, 난 여기서 시골을 탓하러 온 건가? 친구에게 시시한 허세를 부리러 온 건가? 아니면 엄마에게 짜증을 내러 온 건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여기 오는 건 언제나, 잠시 도시를 잊고,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잖아.’ (31∼32쪽)


아이들이 먹기 알맞도록 밥을 차립니다. 한여름에는 미리 밥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 말하기 한 시간쯤 앞서 밥을 다 해 놓고 천천히 식힙니다. 국도 조금 일찍 끓여서 식힙니다. 반찬도 그렇지요. 모든 밥차림을 아이들더러 “자, 밥 먹자.” 하고 부르기 앞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고서 30분쯤 지나서야 비로소 “배고프니? 밥 먹을까?” 하고 묻고는 1분도 안 되어 촤라락 밥상에 밥이며 국이며 반찬을 올립니다.
한겨울에는 한겨울대로 밥을 차려요. 한겨울에는 먼저 밥상 앞에 앉힙니다. 그러고서 국이든 밥이든 먼저 다 되는 쪽부터 내어줍니다. 추운 날씨에 몸에 따순 기운 감돌도록 뜨끈뜨끈 김 나는 국이나 밥을 아이들한테 주어요. 한겨울에는 갓 지은 밥과 국도 10분쯤 지나면 다 식어요.
다 같이 먹는 밥이니 밥상맡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다 같이 먹는 밥이니, 아이들 몸을 살펴 밥을 짓습니다. 어른들 입을 살펴서 밥을 짓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밥과 국과 반찬을 마련합니다. 어른들은 아이 몸에 맞춥니다. 아이들더러 어른 입맛에 맞추도록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참 마땅한 일인데, 다 같이 먹는 밥인걸요. 어른만 먹으면 무슨 재미인가요. 어른만 즐기면 무슨 즐거움인가요.
가장 낮고 가장 작으며 가장 여린 숨결을 헤아릴 때에 사랑이 되고 평화가 되며 평등과 꿈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쪽을 헤아리면 사랑도 평화도 평등도 꿈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 맞추는 복지요 문화이지, 돈있는 사람한테 맞추는 복지나 문화가 아니에요. 아이들과 할매 할배 다 함께 누리도록 꾀할 문화요 예술이지, 전문가와 평론가 눈높이에 맞출 문화나 예술이 아닙니다.
- “아이스크림이 녹아 있었거든.” “뭐?” “마지막 두 번은 마유코가 들고 온 아이스크림이 많이 녹아 있었어. 사실은 우리 집 바로 옆이 편의점이라, 다른 때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도 전혀 안 녹았거든. 그런데 마지막 2번은 꽤 녹아 있어서, 멀리 있는 편의점에서 샀나 생각했지만, 그 편의점은 이 근처에는 우리 집 옆 말고는 없어. 그럼 왜 녹았을까. 사고 나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 뭘 하느라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어쩌면, 돈 빌리는 걸 망설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48∼49쪽)
- “어라? 맛이 예전만 못하네.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는데.” “그래? 이 만하면 충분히 맛있는데.” “한 입만 먹어 봐도 돼?” “응. 역시 달라. 이런 게 아니야. 훨씬 더 맛있어서 이 동네에서 최고라고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먹었기 때문에 맛있었던 거야? 아.’ (60∼62쪽)


시무라 시호코 님 만화책 《여자의 식탁》(대원씨아이,2013) 여덟째 권을 읽습니다. 《여자의 식탁》이라는 이름 붙은 만화책은 8권에서 끝납니다. 2011년 봄에 일곱째 권이 한국말로 나온 지 이태만에 여덟째 권이 나오면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만화책 《여자의 식탁》은 책이름 그대로 ‘여자가 밥상맡에서 누리는 삶과 느끼는 생각과 맞이하는 사랑’을 들려줍니다. 밥 한 그릇에서, 반찬 한 가지에서, 차 한 잔에서, 길고 깊으며 너른 이야기를 길어올려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길어올리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를 길어올리기도 합니다. 애틋한 이야기도, 그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도, 이제는 다 아문 이야기도 찬찬히 길어올립니다.
- “그렇게 싫어하면서 말을 못했다고?” “일부러 사왔는데 싫다고 하면, 남친이 상처 받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커피 말고 다른 걸 마셨으면 좋겠는데.” (76쪽)
- ‘누가 말해 줬으면 좋겠어. 루리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루리는 자신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애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말해 줬으면 좋겠어. 루리는 바닐라 에센스처럼 달콤하고 착한, 정말 멋진 아이라고 믿게 해 줬으면 좋겠어.’ (96쪽)

나는 《여자의 식탁》 1권부터 8권까지 읽으며 “남자 식탁”을 누군가 그리면 어떤 이야기 나올까 하고 곱씹어 보았어요. 사내들도 가시내들 못지않게 이런 이야기 저런 삶 있을 테지요. 그런데, 예나 이제나 사내들은 밥상을 스스로 차리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예나 이제나 사내들은 밥 한 그릇에서 사랑과 꿈과 이야기를 누리는 일이 얼마나 잦을까요.
아이들한테 도시락 싸 주는 아버지는 얼마나 있지요? 사랑스러운 짝꿍이나 옆지기한테 날마다 도시락 싸서 내미는 사내는 몇이나 있지요? 웃음과 기쁨과 노래와 춤을 밥 한 그릇에 실어 날마다 살림 아름다이 여미는 사내는 있기나 있는가요?
-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건, 엄마의 접시에도 한 잎 정도는 남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152∼153쪽)
한낮 무더위를 한껏 느끼면서 땀을 흘립니다. 비록 오늘날 시골마을도 농약투성이가 되었기에 풀벌레나 매미나 개구리나 멧새 노랫소리를 먼먼 옛날처럼 아늑하거나 넉넉하게 듣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럭저럭 여러 풀노래와 숲노래를 가만히 듣습니다. 아이들도, 어른인 나 스스로도 고운 노래 기쁘게 누리는 하루를 빛내자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먹는 밥이요, 다 같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다 같이 즐기는 이야기요, 다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노래하는 벗님이면서, 다 같이 꿈꾸는 이웃입니다. 4346.8.9.쇠.ㅎㄲㅅㄱ
(최종규 . 2013 - 시골 아버지 만화책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