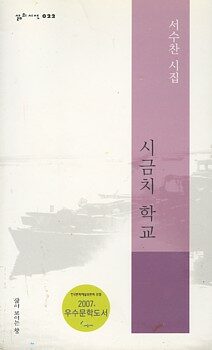-

-
시금치 학교 ㅣ 삶의 시선 22
서수찬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7년 3월
평점 :

품절

어머니를 읽는 책
[시를 노래하는 시 32] 서수찬, 《시금치 학교》(삶이보이는창,2007)
- 책이름 : 시금치 학교
- 글 : 서수찬
- 펴낸곳 : 삶이보이는창 (2007.3.30.)
- 책값 : 6000원
내가 아이였을 적, 내 어머니가 나한테 자장노래를 얼마나 자주 들려주었는지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어머니가 나한테 자장노래를 들려주었다고 몸으로 떠올리고, 몸으로 떠올리는 만큼 내 아이들한테 자장노래를 들려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푸름이가 되고 어른이 될 무렵 저희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자장노래를 날마다 얼마나 불러 주었는가를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몸에 따사롭게 아로새겨지는구나 하고 느끼며 자장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일 적에 나는 그만 내가 아버지요 어버이인 줄 잊고는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마치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아이인 줄 잊고 나를 다그치고 꾸짖으며 회초리질을 하셨듯, 나는 내 아이들한테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때렸듯이 내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바보스런 어버이로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말면서 나 스스로 너무 속이 아프고 괴롭다고 느끼는데, 차마 때리는 짓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내 어버이가 나한테 회초리질을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한테 회초리질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회초리질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빽빽 소리를 지르는 어버이로 지낸다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못하는구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두 대를 때릴 적에 나는 한 대를 살살 때린대서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손찌검은 안 한달지라도 마음으로는 ‘이 녀석 한 대 쥐어박고 싶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손찌검을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 밤새 비린내를 이불로 덮어 주는 / 아버지의 손길이 참 많이 늙어 있었다 .. (그리운 이불)
폭력은 폭력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되풀이되고,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아이도, 또 나도 내 어버이도, 서로서로 사랑으로 얼크러질 때에 참으로 아름다우리라 느껴요. 나부터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즐기며 사랑을 누릴 때에 더없이 아름답구나 싶어요.
요 며칠, 우리 집 큰아이가 참말 왜 이러나 싶도록 말썽을 부립니다. 말썽 부리는 큰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낯을 찡그립니다. 웃는 낯이 없습니다. 저녁나절, 큰아이가 홀로 조용히 공책에 무언가를 한참 끄적이더니 아버지한테 와서 보여줍니다. “웃는 토끼예요. 아버지 보세요. 미안해요.” 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짓을 했나 싶어 “아니야. 서로 미안한 것 없어. 우리 예쁜 아이야.” 하고 말하며 아이를 살살 안으며 토닥입니다.
곰곰이 떠올려 봅니다. 나는 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웃는 얼굴”로 ‘웃는 이야기’를 지어서 살그마니 들려준 적 있는가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 진즉에 어항들이 젊은이들에게 / 말뚝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 일생을 그 말뚝에 옹골차게 묶고 / 마음놓고 저 먼 바다까지 나가서 / 풍랑을 다스리게 하지 못했을까 / 어항은 노인네마저 놓치겠다 싶어 노인데 가슴에만 / 매듭을 아주 굵게 매어 놓았다 .. (말뚝)
날마다 빨래를 합니다. 아이가 둘이 되고부터 빨래감이 무척 많습니다. 아이가 하나일 적에도 빨래가 퍽 많았지만, 둘일 적하고는 견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셋이거나 넷이라면, 또는 다섯이나 여섯, 일곱이나 여덟이라면 어떠할까 헤아려 봅니다. 요즈음이야 아이가 적다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참 많았아요. 예전 사람들은 옷가지가 얼마 없었다지만, 아이 숫자가 많은걸요. 게다가 모두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손으로 이불을 누볐는걸요.
예전 사람들은 집에서 물꼭지 틀어 빨래하지 못했어요. 냇가에 빨랫감을 이고 가서 빨래를 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그날그날 방아를 찧어 쌀겨를 벗긴 다음 밥을 지었어요. 예전 사람들은 나무를 해서 땔나무로 불을 피우고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 삼복을 지나도 우리 마을에 / 늘어나는 것은 개와 빚뿐이다 .. (내 마음의 보물창고 2)
나는 열아홉 살 적부터 빨래와 밥을 혼자 건사했습니다. 서른여덟 살이 된 2012년에 비로소 빨래기계를 집에 들였어요. 스무 해 가까이 모든 빨래를 손으로 했어요. 이불이든 담요이든 청바지이든 잠바이든 무엇이든 손빨래로 주물렀어요.
손으로 빨래를 할 적마다 생각했어요. 여름에는 빨래가 얼마나 시원하고 겨울에는 빨래가 얼마나 손 시린가를 생각했어요. 내 어머니는 집식구 빨래를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내 어머니가 아이였을 적 당신 어머니는 또 어떻게 빨래를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뜨거운 물을 쓸 수 없이 겨울빨래 하던 나날에는 얼음장 깨고 빨래를 해야 했을 내 어머니와 내 어머니 낳은 어머니 들을 생각했어요. 한겨울에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오줌을 누면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어요. 한겨울에도 이불빨래를 하셔야 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어요.
빨갛게 얼어붙으면서 찌릿찌릿 저려 따가운 손가락을 느끼며 겨울빨래를 생각했어요. 예전 어머니들은 빨갛게 언 손가락으로 방아를 찧었을 테고, 소죽을 끓였을 테며, 바느질을 했겠지요. 역사책에는 몇몇 사대부 집안 여자들 이야기만 적바림하지만, 역사책에 안 적힌 내 어머니들, 내 할머니들, 이 겨레 여자들 삶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빨래를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이 밥을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다 마른 옷가지를 개면서, 으레 내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과 이 겨레 여자들을 생각했어요.
.. 전에 살던 사람이 버리고 간 / 헌 장판을 들추어내자 / 만 원 한 장이 나왔다 / 어떤 엉덩이들이 깔고 앉았을 돈인지는 모르지만 / 아내에겐 잠깐 동안 / 위안이 되었다 / 조그만 위안으로 생소한 / 집 전체가 살 만한 집이 되었다 / 우리 가족도 웬만큼 살다가 / 다음 가족을 위해 / 조그만 위안거리를 남겨 두는 일이 / 숟가락 하나라도 빠트리는 것 없이 / 잘 싸는 것보다 / 중요한 일인 걸 알았다 .. (이사)
책을 읽을 적에도 생각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으레 남자로구나 하고 느끼며, 이이가 책을 쓰는 동안 밥은 누가 지어서 차려 주고, 옷은 누가 빨아서 입혀 주며, 집안은 누가 쓸고닦으며 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소꿉놀이를 하듯 설거지놀이나 빨래놀이나 청소놀이를 한다며 이냥저냥 복닥일 적에, 이 예쁘장한 놀이를 바라보는 내 눈길은 얼마나 따사로울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머니 몫을 맡는 여자들이 숨을 거두거나 어디로 떠나면, 이때부터 이 나라 아버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머니가 없어도 ‘아이가 어떻게 되건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가서 돈 버는 일을 하려나요. 어머니가 없어도 ‘전화 걸어 밥을 시켜서 먹으’며 하루를 보내려나요. 어머니가 없어도 ‘빨래꾸러미를 잔뜩 짊어지고 빨래방에 가서 맡기’면 그만이려나요.
회사에 가는 동안 아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집어넣다가, 종일반을 마칠 무렵 ‘친어머니이자 친할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기면 되려나요. 친할머니가 아이들을 하루 내내 맡아 주기를 바라면서 다달이 돈 백만 원씩 드리면 되려나요.
.. 콩알 할머니 / 길 한 편에 / 콩알만하게 앉아 / 콩알을 팝니다 .. (콩알 할머니)
이웃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으레 “저기 꽃이 걸어오네.” 하고 말씀합니다. “이 꽃은 어떤 꽃인데 이렇게 귀엽게 안기나.” 하고 말씀합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꽃’이라고 말하기 앞서까지, 아이들 아버지이자 어버이로서 우리 아이들을 ‘꽃’이라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될까 하고 되새깁니다. 늘 내 곁에서 반짝이는 꽃이요 향긋한 꽃이며 해맑은 꽃인 줄 얼마나 느끼는가 하고 되새깁니다.
아이들은 어버이한테 꽃처럼 다가옵니다. 어버이는 아이들한테 나무처럼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꽃이고 어른들은 나무입니다. 아이들은 꽃답게 삶을 누리고, 어른들은 나무답게 삶을 누려요.
꽃을 바라보며 나무가 튼튼하게 우뚝 섭니다. 나무를 바라보며 꽃이 씩씩하게 자랍니다. 꽃을 바라보며 나무는 열매를 싱그럽게 맺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며 꽃은 씨앗을 알차게 빚습니다.
곧, 서로서로 얼크러지며 숲이 됩니다. 나무와 꽃이 얼크러진 숲이 됩니다. 꽃이랑 나무랑 예쁘게 빛나는 숲이 됩니다.
.. 어머니는 시금치 밭에 늘 / 앉아 계시는 거로 우리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 (시금치 학교)
새벽별은 유난히 빛납니다. 한쪽 하늘은 보랏빛으로 바뀌며 차츰 하얗게 동이 트지만, 다른 하늘은 아직 깜깜한 채 별이 반짝거려요. 보랏빛 새벽하늘이든 아직 까만 하늘이든 별빛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다가 이내 뭇별 반짝거림은 갑작스레 사라지면서 허옇게 새벽빛이 밝고, 어느덧 새벽빛조차 사라지며 노오란 아침볕이 온 마을을 덮어요.
두 아이 어버이로 시골에서 살아가며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삼스레 놀라요. 그런데 나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새벽과 아침에 새삼스레 놀랄 만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느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 나날부터 시골에서 살아가니까 저희 어버이하고는 사뭇 다른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겠지요. 빛을, 그늘을, 바람을, 햇살을, 물을, 흙을, 이야기를 아이들 나름대로 삭히면서 하루하루 새 꿈을 빚겠지요.
그러고 보면, 도시에서는 아침이슬이나 새벽이슬을 거의 못 느꼈어요. 아니, 도시에서는 밤별도 새벽별도 느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별이 얼마나 까만 하늘을 덮는가를 조금도 느낄 수 없었어요.
.. 들판은 설령 콘크리트로 메울 수 있을지언정 /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는 들판은 / 시퍼렇게 눈뜨고 있다는 것을 / 그들만은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 (대추리 도두리 만인보 1)
내가 올려다보지 않아도 별은 뜨고 지겠지요. 아니, 지구에서 바라보지 않더라도 이웃 은하계 별들은 저마다 제 빛을 뽐내겠지요. 지구별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에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은하계 별 가운데에 문화와 문명이 빼어나게 발돋움한 곳이 있거나 없거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할 틈조차 없어요. 지구별은 지구 있는 은하계에서 사람이 예쁘게 살아가는 별이듯, 다른 별은 다른 은하계에서 다른 목숨이 예쁘게 살아가는 터전이 되겠지요.
어쩌면, 지구별은 문명이나 물질이나 문화가 좀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다른 별은 지구별하고 견줄 수 없이 문명이나 물질이나 문화가 대단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달라요. 지구별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자라 해서 즐겁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꽤 부자라 하는 이들도 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않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시골에서 ‘천만 원짜리 집을 사서’ 오붓하게 살아가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십억이나 이십억짜리 집을 사서’ 살아가면서도 오붓하거나 즐겁거나 한갓지거나 기쁜 나날을 못 누린다고도 해요.
자가용을 몬대서 즐거울 수는 없어요. 버스나 전철을 탄대서 안 즐거울 수는 없어요. 두 다리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니까 즐거움하고 동떨어지지는 않아요. 즐거움은 스스로 빚어요. 스스로 찾고 스스로 아끼며 스스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옷을 사서 입어도 즐거웁겠지만, 옷을 얻어서 입어도 즐거워요. 사거나 얻거나 대수롭지 않아요. 옷을 입는 사람 스스로 즐거운 꿈을 키울 수 있을 때에 즐거워요.
.. 우리 손주 머릿속이 / 온통 폭탄으로 가득 차 버린다면 / 남을 죽이는 음모로 철책 속에 숨어 버린다면 / 그건 내가 이 땅에서 평생 배운 언어가 / 아니다 .. (대추리 도두리 만인보 8)
서수찬 님 시집 《시금치 학교》(삶이보이는창,2007)를 읽습니다. ‘시금치 학교’라니 뭔 소리인가 알쏭달쏭합니다. 서수찬 님 시 〈시금치 학교〉를 읽지 않고서야 뭔 소리인지 짚을 수 없습니다.
나긋나긋한 싯말을 천천히 읽습니다. 옳거니. 서수찬 님한테 학교란 ‘시금치밭’이었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시금치를 돌보며 나눈 사랑을 듬뿍 배우면서 당신 삶을 일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금치 학교, 시금치 학교, 가만가만 읊으며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근 학교라든지 배추 학교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설거지 학교나 빨래 학교도 있을 테지요.
노래 한 가락이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춤 한 사위가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글 한 줄도 학교가 되고, 이야기 한 자락도 학교가 돼요.
.. 봄에 저 꽃들이 / 마을에서 사라졌다 해 보라 .. (대추리 도두리 만인보 11)
가을날 가을꽃이 눈부십니다. 봄이나 여름과 달리 가을에는 꽃이 얼마 안 보이지만, 곳곳에 드문드문 보이는 가을꽃은 더없이 눈부십니다. 들판과 멧자락 가을꽃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네가 구절초이니? 네가 쑥부쟁이이니? 나는 참 너희 이름을 모르겠구나.’
참말 꽃잎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꽃잎이 아닌 풀잎을 보면서 똑똑 따서 먹어 보면 이 아이들 이름을 잘 알 텐데, 다시 생각해 보면, 들판이나 밭뙈기에서 뜯어서 먹는 풀마다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이름을 모르지만, 맛나구나 싶어 뜯어서 먹는 풀도 제법 많아요. 아니, 나는 이름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 풀잎을 뜯어서 먹을 때마다 ‘아하, 너희는 이런 맛을 나한테 나누어 주는 풀이로구나.’ 하고 여겨요. 온갖 풀을 골고루 뜯어서 나물버무림을 해서 먹을 때에는, 그야말로 온갖 풀내음이 얼크러진 밥을 즐겨요.
풀이기에 너희는 풀이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곧, 겨울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너희는 눈이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숲마다 우거진 나무를 바라보며, 너희는 나무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어느 북중미 토박이는 ‘눈’을 가리키는 스물일곱 가지 낱말이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케냐사람한테는 눈을 가리키는 낱말이 거의 없을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도시사람한테는 시골자락 풀이 다 비슷해 보여 그냥 풀이라고만 여길는지 몰라요. 시골사람한테는 도시에 넘치는 자동차마다 비슷해 보여 그냥 자동차라고만 여길 수 있겠지요.
.. 들풀 속에는 / 얼마나 너른 들판이 있는지 /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 생명이 들어 있는지를 .. (대추리 도두리 만인보 16)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열 가지 풀을 뜯으면 열 가지 풀은 저마다 다른 맛을 뽐내지만, 한 자리에 비비거나 무치면 사뭇 다른 내음과 맛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오, 그러니까, 시금치밭이라 하더라도 시금치만 있지 않아요. 이런 풀 저런 풀 함께 자라요. 바람은 이웃마을을 거쳐 우리 밭으로 스며요. 저 머나먼 바다에서 풍기는 내음을 바람이 실어서 날리고, 제비들 날아다니던 내음도 실어서 날리며,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 내음도 실어서 날리겠지요. 반가운 내음이 있고 달갑잖은 내음이 있어요. 그러나저러나, 바람은 우리 숨결을 푸르게 북돋아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까요. 다 다른 아이들이 다 다른 빛을 뽐내면서 새삼스럽고 새로운 빛줄기 하나로 환하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저 모두 똑같은 톱니바퀴가 되도록 거칠거나 우악스럽게 등을 떠밀까요.
‘시금치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시금치 학교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몸짓과 모양과 말투로 길들이는 데일까요. 시금치 학교는 다 다른 아이들을 다 다른 몸짓과 모양과 말투로 사랑스레 살아가도록 돕는 데일까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어디에서나 다 같은 ‘어머니’이지만, 이 나라 어머니들이 빚는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김치는 맛이 모조리 달라요. 이 나라 어머니들 밥맛과 국맛과 반찬맛은 몽땅 달라요. 똑같다 싶은 재료로 밥이나 국이나 반찬을 짓더라도 맛이 죄 달라요. 참말 어머니들은 어느 분이나 사랑스러워요. (4345.10.26.쇠.ㅎㄲㅅㄱ)
(최종규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