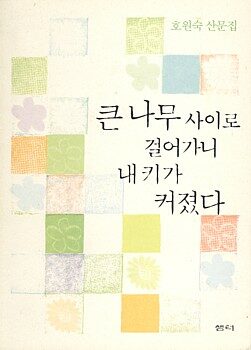-

-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
호원숙 지음 / 샘터사 / 2006년 4월
평점 : 
품절

문학은 삶에서 태어납니다
[책읽기 삶읽기 99] 호원숙,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샘터,2006)
나는 두 아이한테 어버이입니다. 나는 두 어버이한테 아이입니다. 나는 두 아이가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서 착하고 어여삐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내 어버이 또한 나한테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서 착하고 어여삐 살아가기를 빌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걷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걷습니다. 맑은 날은 햇살을 받으며 걷습니다. 바람 부는 날은 바람을 맞으며 걷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우리 살림이기에 으레 걷습니다. 때로는 자전거를 함께 타고, 때로는 버스를 얻어 탑니다. 같은 빠르기로 걷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같은 느낌과 생각까지는 아닐 테지만, 같은 하늘과 들판과 새들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 해가 떠오르기 전 아침노을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 … 나는 단풍나무 숲을 걷는다. 이파리 하나하나 말을 거는 듯 음악이 들리는 듯하다 .. (10, 11쪽)
해가 기울어 어두운 때, 아이를 데리고 마당이나 뒤꼍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합니다.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시골이 좋습니다. 밤에 별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따분한 터전이 될까요. 전기가 없으면 반짝거리지 못하는 데라면 얼마나 메마르고 허전한 터전이 될까요.
아침과 낮과 저녁으로 바깥바람을 쐽니다. 때마다 바람이 다릅니다. 날에 따라 바람이 다르고, 철에 따라 바람이 다릅니다. 나는 나대로 바람을 맞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람을 맞아들일 테지요.
어버이가 살아가는 터전이란 어버이부터 즐거이 누리는 사랑이면서, 아이들한테 곱게 물려주는 사랑입니다. 어버이부터 더 좋은 꿈을 북돋우는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아이들한테 더 기쁜 사랑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부터 하루하루 가까스로 견디거나 힘겨이 버티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동떨어진 채 지낼 수 있습니다. 이동안 아이들은 고되거나 슬픈 아픔을 나날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리지 않으면, 아이들 또한 좋은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 시골 출신인 남편이 건네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서울 아이는 이런 건 모른다. 자연에서 놀지 않았기에 무얼 먹어야 할지 잘 모른다. 연두색의 꼼밥(소나부 꽃은 약간은 새큼하고 약간은 달큼하고 약간은 떫다 …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젊어서 원 없이 사랑도 했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받아 보았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내 젖으로 키웠고 좋은 학교에 보냈다 .. (23, 66쪽)
소설쓰는 박완서 님 딸로 태어나 살아온 호원숙 님이 내놓은 수필책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샘터,2006)를 읽습니다. 박완서는 박완서이고 호원숙은 호원숙일 텐데, 수필책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는 어머니 박완서를 ‘큰 나무’로 삼고 맙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찌할 길 없는 셈이라 할 만할까요.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간대서 내 키가 커질 일이 없습니다. 나무가 크다면 얼마나 크고, 나무가 작다면 얼마나 작을까요. 나무는 그저 나무입니다. 나무 사이를 걸어가는 나는 그저 나 하나입니다. 내가 나무 사이를 걸어갔기에 나무들마다 키가 한껏 자라날는지 모르고, 내가 나무 사이를 걸어간 탓에 나무들마다 키가 한 뼘씩 줄어들는지 모릅니다만, 나 스스로 키가 커지겠다고 꿈꾸지 않는다면, 큰 나무들 사이를 걷는대서 내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키를 키울 수 있어요. 아무 나무 사이를 안 지나더라도 나는 나대로 내 키를 키울 만합니다.
.. 쓸 수 있다는 것, 써진다는 것 모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재미있다고 이런 책을 단숨에 읽을 필요는 없으리라. 하루에 한 편이라도 읽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착해질 것 같다 … 그래도 아이들 어릴 때 쓴 일기 공책은 버리지 못한다. 그걸 버리는 건 그들의 몫이니까 … 어머니의 데뷔작 《나목》을 읽던 날을 잊지 못한다. 단숨에 읽어 버렸지만 읽고 난 후 여태껏의 우리 집의 분위기와 빛깔이 바뀌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 (48, 57, 167, 213쪽)
소설쓰는 박완서 님은 소설쓰는 박완서 님대로 당신 삶을 사랑하면서 일구었습니다. 호원숙 님은 호원숙 님대로 당신 삶을 사랑하면서 일구면 됩니다. 굳이 큰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작은 나무라고 낮출 까닭이 없습니다.
박완서 님은 호원숙 님을 비롯한 여러 아이를 낳아 돌보는 삶을 일구었기에 소설을 쓰는 기운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소설쟁이 한길을 못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원숙 님한테 어머니 박완서 님이 큰 나무가 아니라, 박완서 님한테 호원숙 님이 큰 나무였을 수 있어요.
.. 아이는 그동안 무얼 공부했는지 이상의 수필 〈권태〉는 알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시험 전날 갑자기 무얼 어떻게 하겠는가. 미리 알려준 게 무슨 독과도 같았다. 나는 서재에서 낡은 이상 문학 전집을 꺼내 들고 아이 방으로 갔다. 그 애한테 세로로 조판된, 그것도 오래되어 잉크가 다 날아가 버린 책을 읽으라는 것은 무리였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상의 수필집을 읽어 준다.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듯이 .. (170쪽)
수필이란 내 삶을 드러내며 내 꿈을 나누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란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이란 작지도 크지도 않습니다. 내 삶은 오로지 내 사랑대로 흐릅니다. 내 삶은 오직 내 사랑을 나 스스로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필책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는 처음부터 ‘호원숙 수필’로 썼어야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그늘자리에서 쓰는 수필이 아니라, ‘내 삶자리’에서 쓰는 글이었어야 예쁘게 빛납니다.
차라리, ‘어머니 박완서를 떠올리거나 그리는 이야기’로만 가득 채웠으면 나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머니 박완서하고는 사뭇 동떨어진 이야기’로 알알이 누볐으면 나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그저 큰 나무에 기대어 열매 얻어먹는 셈일 뿐입니다.
살아가노라면, 큰 나무에 기댄대서 잘못일 수 없고, 열매 몇 알 얻어먹는 일이 나쁠 까닭이 없어요. 다만, 호원숙 님으로서는 호원숙 님 한 사람한테만 서린 고운 빛줄기가 있습니다. 이 빛줄기를 곱게 사랑하며 북돋우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이면 어떻고, 숲길 걷기를 좋아하는 도시내기이면 어떤가요. 오늘 내 삶을 꾸밈없이 맞아들여 스스럼없이 아낄 때에 가장 빛나는 하루이고, 이 가장 빛나는 하루를 수수하게 글로 여밀 때에 수필이 태어나요.
문학은 삶에서 태어납니다. 문학은 생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문학은 삶을 아끼는 생각으로 일굽니다. 문학은 삶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빚습니다. (4345.2.22.물.ㅎㄲㅅㄱ)
―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 (호원숙 글,샘터 펴냄,2006.4.25./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