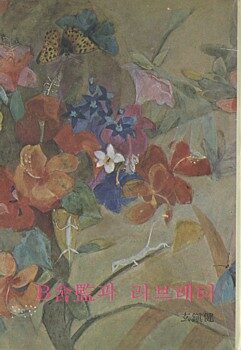문학하는 삶과 공부하는 아이
― 현진건, 《B舍監과 러브레터》
- 책이름 : B舍監과 러브레터
- 글 : 현진건
- 펴낸곳 : 동서문화사 (1977.9.1.)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입시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소설을 읽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잘 치러 이름난 대학교에 더 많이 들어가도록 채찍질을 하고자 현대소설을 가르칩니다.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서던 1988년 3월, 학교에서는 갱지에 등사한 종이를 나누어 줍니다. 1991년 3월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갱지에 등사한 종이를 나누어 줍니다. 이 갱지에는 ‘중학생이 읽을 권장도서’라든지 ‘고등학생이 읽을 필독도서’가 깨알같이 적힙니다.
중학교에 들어서거나 고등학교에 들어서며 받는 ‘꼭 읽으라 하는 책’을 살피면, 그즈음에 나온 새로운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즈음뿐 아니라 ‘오늘날 두루 읽히거나 읽을 만한 책’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문학이라 하면 모두 현대소설로 쏠리고, 김동인이니 이광수이니 현진건이니 김유정이니 이효석이니 황순원이니 하는 분들 작품 가운데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에 쏠립니다. 해방 뒤에 문학을 한 사람들 작품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입시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더러 한두 작품 한두 대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작품에 견주면 아무것 아닙니다. 문학이란 철지난 문학이고, 문학하는 사람은 숨을 거두어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빛을 보는 셈입니다.
.. “그래 음악회에 가기 싫단 말인가?” “자네 혼자서 다녀오게.” “여보게 음악은 모른다 하더래도,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세그려. 주최가 여학교 측이고 보니, 그 학교 학생은 물론이겠고, 서울 안의 하이칼라 여학생은 다 끌어올 것일쎄.” 하고 매우 초조한 듯이, “입장권은 내가 삼세. 음악이 싫거든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세.” “왜?” “왜라니,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자는밖에.” “여학생은 보아 쓸데가 무엇이란 말인가?” .. (216쪽/까막잡기)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갱지를 훑으며 ‘들어 본’ 이름과 ‘처음 듣는’ 이름을 헤아립니다. 들어 본 사람 작품이건 처음 듣는 사람 작품이건 하나하나 찾아서 읽기로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갱지에 적힌 사람들 작품을 ‘학교에 책을 가져가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읽는다’면 무어라 따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학교에서 읽으라 한 책인 만큼 이러한 책을 읽는다 할 때에 책을 빼앗는다든지 무어라 꾸중할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진건 님 작품 〈빈처〉와 〈운수 좋은 날〉을 읽으라 했지, 〈불〉이나 〈그립은 흘긴 눈〉은 읽으라 하지 않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나 〈피아노〉 같은 작품이 ㅅㄱㅇ 같은 대학교 논술시험에 나오기도 하니, 학교 모의시험에 이들 작품 지문이 나오기는 하지만, ㅅㄱㅇ 논술시험 지문하고 똑같이 나올 뿐입니다. 〈우편국에서〉나 〈할머니의 죽음〉이라든지 〈사립정신병원장〉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다루거나 이야기하는 국어 교사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가운데 이들 작품을 읽은 분이 있을는지 모르나, 어쩌면 이들 작품은 안 읽거나 못 읽은 분이 더 많을는지 모릅니다. 교대나 사범대에 다닐 때뿐 아니라, 막상 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일하면서도 ‘당신들이 학생 적에 못 읽은 한국 현대문학’을 뒤늦게 읽는다든지, 이때부터 바지런히 읽는다든지 할 겨를을 못 내는지 모릅니다.
헌책방을 다니며 책을 하나둘 그러모읍니다. 현진건 문학을 읽으려고 생각한 때에는 현진건 님 문학책을 펴낸 갖가지 판본을 모두 살펴서, 겹치지 않은 작품이 하나라도 실렸으면 냉큼 사들여서 읽습니다. 이무영 소설이든 안수길 소설이든 박태원 소설이건 마음껏 읽습니다. 장용학 소설이건 이청준 소설이건 즐거이 읽습니다.
현대소설을 읽으면서, 또 현대를 지난 오늘날 소설을 읽으면서, 오늘날과 가까울수록 문학하는 사람들 말이 재미없다고 느낍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면서 적어 내려간 작품에는 ‘깰락졸락’이라느니 ‘큰심부름 잔심부름’이라느니 ‘꾸중받이’라느니 ‘맞방망이’라느니 ‘염통이 파득파득’이라느니 ‘신트림’이라느니 ‘여기 오는 맡’이라느니 ‘퉁을 주었다’라느니 ‘까막잡기’라느니 ‘멋질린’이라느니 ‘뭇주룩하게’라느니 ‘겅성드뭇’이라느니 ‘무안새김’이라느니 ‘치훑고 내리훑고’라느니 ‘샐닢’이라느니 하는 말마디를 마주합니다. 따로 살려쓴다는 토박이말이 아니라, 여느 자리에서 수수하게 주고받는 말마디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마디 가운데에도 “만족의 미소” 같은 일본 말투가 끼어들곤 합니다.
.. “저를 모르시겠읍니까. 제가 ××이 아닙니까.” “응, 네가 ××이냐…….” 우는 듯이 이런 말을 하고 그윽하나마 내가 잡은 손에 힘을 주는 듯하였다. 그 개개 풀린 눈동자 가운데도 반기는 빛이 역력히 움직였다. 할머니의 병환이 어젯밤에는 매우 위증해서 모두 밤새움을 한 일, 누구누구 자손을 찾던 일, 그 중에 내 이름도 부르던 일, 지금은 한결 돌린 일 …… 온갖 일을 중모는 나에게 아르켜 주었다. 나는 그날 밤을 누울락앉을락, 깰락졸락 할머니 곁에서 밝혔다. 모였던 자손들이 제각기 돌아간 뒤에도 중모만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불교의 독신자인 그는 잠오는 눈을 비비기도 하고 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염불을 그치지 않았다 .. (130∼131쪽/할머니의 죽음)
오늘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권장도서목록’이나 ‘필독도서목록’을 내어주며 이러한 책을 안 읽으면 두들겨 팬다든지 몽둥이찜질을 한다든지 할까 궁금합니다. 문학이란 대학입시를 치르며 살필 시험문제로만 여기면 그만이라고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삶을 다루는 문학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학교에는 아이들 삶이 있는지 궁금하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사랑하며 일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지 궁금합니다. (4344.1.27.나무.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