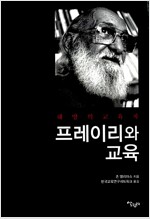숲노래 살림말 / 숲노래 책넋
2025.8.25. 사읽고서
사읽고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받고서 쓰는 사람이 있다. 사읽은 사람은 사읽은 대로 느껴서 글쓰고, 그냥받고서 읽은 사람은 그냥받으면서 느끼는 결을 따라서 글쓴다. 누리책집으로 사서 집에서 책을 받으면 책얘기나 줄거리만 짚을 테고, 품을 들여서 책집마실을 하는 사람은 이웃마을을 돌아본 하루를 녹여서 글로 담아낸다. 책집마실을 기꺼이 하면서 글쓰는 붓잡이가 드문드문 있되, 오늘날 숱한 붓잡이는 으레 그냥받기나 누리책집으로 만난 책을 놓고서 거의 줄거리만 짚곤 한다.
부산과 서울을 기차 아닌 시외버스를 타고서 오가는 사람은 적다. 한가위나 설이라면 기차표가 일찍 동나니까 시외버스를 탈 텐데, 여느날에도 기차는 붐비고 시외버스는 널널하다. 요즈음 시외버스는 무척 깨끗하고 널찍하다. 다만 버스손님 가운데 쓰레기나 커피를 널브러뜨리는 사람이 꽤 있고, 시끄러이 전화하는 사람이 곧잘 있을 뿐이다.
버스를 타면 언제나 버스일꾼 얼굴과 몸짓을 보고 느낀다. 버스에 탈 적부터 내릴 때까지 우리는 다같이 한몸이다. 버스일꾼이 느긋하면 손님도 느긋하고, 손님이 왁자지껄하면 버스일꾼도 귀아프다. 부산을 떠나는 버스는 가람을 스치고 잿밭(아파트단지)을 비끼고 멧숲 사이로 달린다. 부산갈매기 여럿이 버스 너머로 날아간다. 인천갈매기랑 고흥갈매기랑 다르면서 나란한 깃빛과 낯빛을 느낀다. 세모김밥을 먹다가 노래를 쓰다가 책을 읽다가 슬쩍 눈을 붙여야지. 등짐에는 책이랑 올리브가 들었다.
올해 제비는 다 날아갔을까? 우리집으로 날마다 찾아오던 꾀꼬리는 오늘도 찾아올까? 가을 앞둔 시골에서 참새떼는 농약바람과 씽씽트럭 틈새에서 잘 살림하기를 빈다. 이 나라가 새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새나라’로 서기를 빈다. 누구나 새를 돌아보 이웃하는 ‘새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빈다.
안 사읽고서 안 쓰는 사람이 많다. 그냥받고서 꿀꺽하는 사람도 많다. 사읽지만 안 쓰는 사람이 많고, 그냥받기를 안 하면서 그냥 안 쓰는 사람도 많다. 말하기는 마음을 소리로 밝히는 길이라면, 글쓰기는 마음을 스스로 새기는 길이다. 살림하는 마음을 가꾸고 싶으니 꾸준히 말결을 가다듬고서 새말을 일군다. 사랑하는 하루를 돌보고 싶으니 언제나 글결을 추스르고서 새글을 여민다. 오늘 하루도 하늘이 맑다. 나는 하늘을 보면서 쓴다. 나는 밤하늘빛을 담고서 쉰다. 나는 땅을 디디면서 읽는다. 나는 이 땅에서 함께 돋아서 자라는 풀꽃나무를 동무하면서 쓴다. 나는 사읽고서 쓴다. 사읽은 오늘 곧장 쓰기도 하고, 닷벌 열벌 스무벌 되읽은 여러 달이나 여러 해 뒤에 쓰기도 한다. 이제 졸리니 그만 읽고 그만 쓰고 눈을 붙여야겠다.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