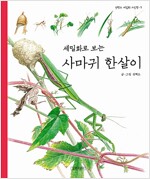숲노래 노래꽃
시를 씁니다 ― 56. 루
아직 우리말 가운데 ‘루’로 첫머리를 여는 낱말은 없지 싶습니다. 우리말은 어쩐지 ㄹ로 첫머리를 그리 안 열려고 해요. 그러나 사이나 끝에 깃드는 ‘루’는 꽤 많습니다. “미루나무 한 그루”를, 그루잠을, “머루를 먹는 마루”를, 그늘나루에 버스나루에 기차나루를, 여러 루를 혀에 얹다가, ‘루루’처럼 내는 소리도 우리말로 삼을 만할 텐데 싶습니다. 굳이 서양말 ‘lu-lu’만 생각하기보다, 새나 풀벌레가 내는 소리로 떠올릴 수 있고, 휘파람을 불며 나오는 소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고루 나누고 두루 펴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루’를 돌려서 ‘로’로 오면, 서로서로 반갑습니다. 이대로도 새롭고 그대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길이 한결 나으리라 느껴요. 하나하나 따진다면, 여는 소리가 있고, 받치는 소리가 있으며, 몸을 이루는 소리가 있다가, 마무르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손이며 발이 따로 있고, 머리카락하고 온갖 털에 손발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처음이거나 복판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여는 소리로는 드문 ‘루’라 하더라도, 갖가지 소리로 어우러지는 ‘루’이기에, 우리는 하루를 더욱 즐겁게 누리고, 오늘을 새로 가다듬는 마음을 슬기로이 가꿀 만하지 싶습니다. 한 마디에 두 마디를 엮으며 말이 태어나고, 두 마디에 석 마디를 맺으면서 생각이 자랍니다. 무럭무럭 크는 마음이 모루처럼 듬직하고 단단한 길을 이루어 갑니다.
ㅍㄹㄴ
루
한 그루를 심었더니
꽃피고 씨맺고 퍼져서
석 그루 서른 그루 퍼져
두루두루 푸른 고을
마루에선 뛰지 말라지만
고갯마루는 뛰어넘고
물결마루는 넘실 타고
하늘마루는 깡총 날아
미루기보다는 제꺽 하지
후루룩 먹어도 맛있어
도루묵 아니라 힘껏 하고
호로록 빨고서 방울 뿜어
오늘 하루는 어떤 날?
어제 하루는 무슨 빛?
앞골 들마루에 가면
새까만 머루 한창이야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