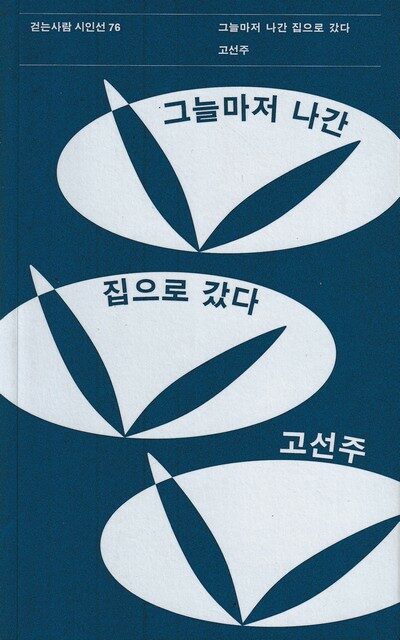-

-
그늘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 ㅣ 걷는사람 시인선 76
고선주 지음 / 걷는사람 / 2023년 1월
평점 :



숲노래 노래꽃 / 문학비평 . 시읽기 2024.10.25.
노래책시렁 377
《그늘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
고선주
걷는사람
2023.1.9.
예전에는 혼자 밥을 지었고, 요사이는 곁님이나 아이들하고 함께 밥을 짓거나, 곁님하고 아이가 짓는 밥을 느긋이 지켜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무엇이든 아이들한테 시킬 까닭이 없는 줄 날마다 새롭게 배웁니다. 우리가 어른이라면 ‘시키지’ 않으면 되어요. ‘맡기’면 됩니다. 심부름(시키기)으로는 스스로 생각해서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심부름을 맡아도 즐겁게 해내면서 살림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되, 으레 ‘시키는 대로만 하고 끝’입니다. 이와 달리 ‘맡길’ 적에는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서 해야 하니까, 아이들은 요모조모 찾고 헤아리고 부딪히면서 살림길을 천천히 익힙니다. 《그늘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를 읽었습니다. ‘시쓰기’란 나쁜 글쓰기가 아닙니다만, 시쓰기나 소설쓰기나 수필쓰기나 동화쓰기에 앞서, 먼저 삶쓰기를 하고 살림쓰기를 하며 사랑쓰기를 할 노릇이라고 느껴요. 이러면서 우리말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아이 곁에서 새롭게 배울 일이라고 느낍니다. 글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수북수북 있습니다. 꾸며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문학적 수사’란 얼마나 덧없는가요. 밥을 짓건 빨래를 하건 ‘생활적 표현’을 왜 해야 할까요? 그저 살림을 하는 이 삶을 누리면서, 이 하루를 옮기면 노래일 뿐입니다.
ㅅㄴㄹ
그것이 깨졌다 / 누군가는 산산이 깨져야 했다 // 하필 / 접시 위 묵 같은 일상 올려놓았다 / 그래도 자존심은 있지 / 흐물흐물했을 뿐 부서지지 않은, / 사각의 링 위에 오른 복서처럼 / 싸워 이겨야 했던 지난 시간들. / 눈뜬 채 누인다 (잠의 접시/22쪽)
사춘기가 온 자매가 날마다 혈투를 벌인다 하루도 조용한 날 없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한 집으로 출근한다. 밤이면 휴식이 있는 삶을 꿈꾸었지만 맹탕이다. 공부 스트레스 심하다며 언니가 피아노를 친다. 그러자 동생이 시끄럽다며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너나 잘해, 고성이 오간다. 피아노가 네 것이냐부터 언어를 진열한다. (이런 전쟁 또 있을까/73쪽)
+
《그늘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고선주, 걷는사람, 2023)
불면의 시간들 포말처럼 흩어져 가는 기억들
→ 잠 못 드는 하루 거품처럼 흩어져 가는 빛
5쪽
노트북 자판 앞 언어들이 심란하다
→ 무릎셈틀 글판 앞 말이 어지럽다
5쪽
꼿꼿한 사각의 기억에 갇힌 채
→ 꼿꼿하고 네모난 날에 갇힌 채
→ 꼿꼿한 틀과 길에 갇힌 채
11쪽
구상이었다가 추상이었다가 반구상이었다가 오묘한 붓질의 시간들
→ 눈으로 보다가 비었다가 조금 보이다가 야릇이 붓질하는 때
→ 또렷하다가 겉돌다가 조금 흐리다가 아리송히 붓질하는 나날
15쪽
길을 잃었다 미로에서 내게 칭찬해 주었다
→ 길을 잃었다 난달에서 나를 추켜 주었다
→ 길을 잃었다 몰길에서 나를 달래 주었다
20쪽
편도선이 또 말썽이다
→ 목망울이 또 말썽이다
→ 혀망울이 또 말썽이다
25쪽
공평하지 않던 세상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 고르지 않던 나라처럼 한쪽으로 기운다
→ 반듯하지 않은 터전처럼 한쪽으로 기운다
39쪽
집의 크기나 위치는 따지지 않았죠
→ 집크기나 집자리는 따지지 않았죠
→ 집은 크기나 터를 따지지 않았죠
46쪽
도심지로 학교 나온
→ 복판에 배우러 나온
46쪽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곱씹었던
→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곱씹던
→ 삶이 얼마나 힘든 줄 곱씹던
47쪽
집으로 가는 중
→ 집으로 가는 길
→ 집으로 간다
55쪽
끝내 폐기처분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했지만
→ 끝내 버리며 수고해야 했지만
→ 끝내 치우며 수고해야 했지만
67쪽
사춘기가 온 자매가 날마다 혈투를 벌인다
→ 봄나이가 온 둘이 날마다 피를 튀긴다
→ 꽃나이가 온 또래가 날마다 다툰다
73쪽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너나 잘해, 고성이 오간다
→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너나 잘해, 시끄럽다
→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너나 잘해
73쪽
지난날의 전투 이력까지 다 끄집어내 융단 폭격이다
→ 지난날 싸운 자국까지 다 끄집어내 퍼붓는다
→ 지난날 다툰 일까지 다 끄집어내 쏟아붓는다
73쪽
바람은 둥근 형질을 버려 둔 채
→ 바람은 둥근결을 버려둔 채
→ 바람은 둥근길을 버려둔 채
75쪽
분단된 땅에 살던 그는
→ 나뉜 땅에 살던 그는
→ 그는 갈린 땅에 살다가
81쪽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 동그라미를 그리는 줄 알지 못한 채
83쪽
일상 속 잘못 태엽이 감겨진 시간 풀어
→ 살며 잘못 감은 오늘 풀어
→ 잘못 감은 하루 풀어
→ 잘못 돌린 삶을 풀어
88쪽
꽃들이 내 우울의 샘을 파 놓고 그 안에서 노닐다 가면 한낮의, 한낮의 온갖 상념들이 출렁거려
→ 꽃이 눈물샘을 파놓고서 노닐다 가면 한낮, 한낮에 뒤숭숭하여
→ 꽃이 슬픔샘을 파놓고서 노닐다 가면 한낮, 한낮에 멍이 들어
120쪽
태초부터 근무했으니 장기근속 맞지만 바람의 근무태만 아니겠는가
→ 처음부터 일했으니 오래지기 맞지만 바람이 빈둥대지 않았는가
→ 태어나서 일했으니 오래살림 맞지만 바람이 노닥대지 않았는가
122쪽
남겨진 유일한 바람, 통풍痛風
→ 남은 바람 하나, 바람앓이
→ 남은 바람은, 앓바람
→ 남은 바람은, 마디앓이
128쪽
예민하게 동공이 커진다
→ 눈망울이 날서고 크다
→ 눈알이 날카롭고 크다
130쪽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숲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