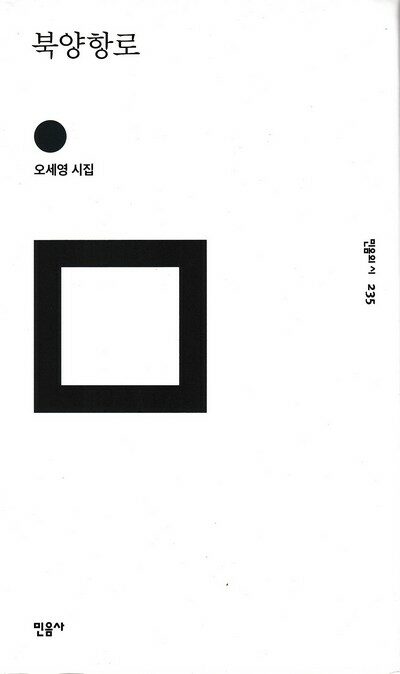-

-
북양항로 ㅣ 민음의 시 235
오세영 지음 / 민음사 / 2017년 5월
평점 :



숲노래 노래꽃 / 문학비평 . 시읽기 2024.8.3.
노래책시렁 438
《북양항로》
오세영
민음사
2017.5.23.
첫머리부터 “나는 문단의 시류에 휩쓸린 적이 없다. 그 거셌던 민중시에 편승한 적도, 중구난방으로 몰아치던 소위 포스트모던의 물결도 타 본 적이 없다. 나는 또한 자타가 한국문단의 권력이라고 공언하는 소위 《창작과 비평》이나 《문학과 사회》로부터 단 한 번의 원고 청탁을 받아 본 적도, 단 한 편의 시를 실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 정부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타 내어 그들만의 잔치로 벌였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주빈국 행사용으로, 끼리끼리 그들만이 모여 만든 대외 홍보물 《한국문인인명사전》에서는 아예 내 이름이 삭제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5쪽)”처럼 나오는 《북양항로》입니다. 글을 쓴 오세영 씨는 서울대를 다녔고, 서울대에서 글을 가르쳤다는데, ‘서울대 사람’이라서 다 알아주어야 하지 않습니다. 창비가 글담(문단권력)이기는 하되, 이곳뿐 아니라 숱한 글담을 나무라면서 ‘글들·글밭·글누리’를 이루는 새글을 펴면 됩니다. 곰곰이 보자면, 들물결이 일어날 적에 등졌고, 새물결이 일 적에 딴청만 했다는 뜻인데, 글도 노래도 이야기도, 울타리(기득권·상아탑)에 머물 적에는 빛이 안 나게 마련입니다. ‘창비 청탁’은 그만 기다리고, 그저 숲빛 노래를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ㅅㄴㄹ
그래 그렇지, 이런 땐 하늘에서도 누군가 / 몰래 / 키스를 나누는지 몰라. (월식 2/17쪽)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서던 / 초등학교 운동장도, / 선뜻 가 버리지 못하고 울먹이며 돌아서던 / 그녀의 뒷모습도, / 강의실의 그 초롱초롱 빛나던 학생들의 눈빛도 (그 도요새는 어디 갔을까/30쪽)
+
《북양항로》(오세영, 민음사, 2017)
인가(人家)를 넘보는 까치보다 설원(雪原)의 마른 가지 끝에
→ 살림집 넘보는 까치보다 눈밭 마른가지 끝에
6쪽
그 파아란 수면 위를 나는 요트 몇 척
→ 파아란 물살을 나는 배 몇
→ 파아란 물낯을 나는 배 몇 자락
13
병실들을 드나드는 그 흰 가운, 가운들
→ 돌봄칸 드나드는 옷, 흰옷
14
동면에서 막 잠을 깬 개구리
→ 겨울잠에서 막 깬 개구리
→ 잠에서 막 깬 개구리
15
섬섬옥수 깨끗하게 빤 직녀의 그 눈부신 색동저고리
→ 고운손 깨끗하게 빤 베순이 눈부신 빛동저고리
16쪽
미끄러지듯 만(灣)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밤바다의 유람선
→ 미끄러지듯 물굽이 가로지르는 밤바다 놀이배
→ 미끄러지듯 바다굽이 건너가는 나들배
17쪽
그 거창한 청사(廳舍)를 받들고 선
→ 대단한 집을 받들고 선
→ 커다란 집채를 받들고 선
18
내의를 갈아입다가
→ 속옷을 갈아입다가
19
그 현란한 한순간의 광휘
→ 눈부신 한빛
→ 한때 빛나는 숨결
26
매운 겨울바람의 일격에 그만 자지러지고 만다. 삼일천하
→ 매운 겨울바람 한칼에 그만 자지러지고 만다. 사흘나라
→ 매운 겨울바람 한주먹에 그만 자지러지고 만다. 하루꿈
→ 매운 겨울바람 댓바람에 그만 자지러지고 만다. 덧없다
29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서던 초등학교 운동장도, 선뜻 가 버리지 못하고 울먹이며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도
→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서던 어린배움터 마당도, 선뜻 가 버리지 못하고 울먹이며 돌아서던 어머니 뒷모습도
30
당신께 용서 빌러 돌아가는 길
→ 그대한테 빌러 돌아가는 길
35
어긋난 해도(海圖) 한 장을 손에 들고
→ 어긋난 바닷길 한 자락 손에 들고
→ 어긋난 바닷금 한 쪽 손에 들고
36
과수원의 일개 과목으로 살아온 한생이 아니었더냐
→ 과일밭 과일나무로 살아온 나날이 아니더냐
41
모래밭에 그어 희미하게 흔적만 남은 그 금선(禁線) 한 줄
→ 모래밭에 그어 자국만 흐린 가림줄 하나
45
순간의 살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질없이 찍어 보는 낙관(落款)
→ 문득 살았다고 알아보려고 부질없이 찍어 보는 덧무늬
47
나는 그것을 비상(飛翔)이라 생각했다. 황홀했다. 막 사정된 정충(精蟲)이었을까
→ 나는 난다고 생각했다. 간드러졌다. 막 나온 아빠씨였을까
→ 나는 나래짓이라 생각했다. 녹았다. 막 나온 벗씨였을까
51
석양빛에 은빛 몸체를 반짝 뒤집던 비행기 하나
→ 노을빛에 반짝이는 몸을 뒤집던 날개 하나
59
모닝콜 소리에 문득 눈을 뜬
→ 아침소리에 문득 눈을 뜬
→ 아침알림에 문득 눈을 뜬
63
정식 명칭으로는 곤포 사일리지라 하던가
→ 동글말이라 하던가
→ 볏가리라 하던가
70
송홧가루 날리는 어느 봄날
→ 솔꽃가루 날리는 어느 봄날
75
뜨거운 혈류가 도는 심장의 그 맥박 소리
→ 뜨겁게 핏길이 도는 가슴소리
→ 뜨겁게 핏줄기 도는 속소리
76
한 생애가 누린 행(幸)·불행(不幸)의 총량은 크기가 다른 술잔의 동일한 알코올양처럼 똑같다
→ 한삶이 누린 기쁨과 슬픔은 크기가 다른 술그릇처럼 똑같다
88
플랫폼을 착각해서 탄
→ 다릿못 잘못 보고 탄
97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