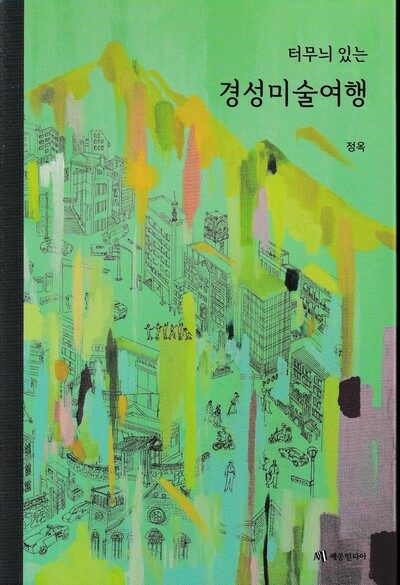-

-
터무늬 있는 경성미술여행
정옥 지음 / 메종인디아 / 2022년 10월
평점 :



숲노래 책읽기 2023.1.30.
인문책시렁 264
《터무늬있는 경성미술여행》
정옥
메종인디아
2022.10.27.
《터무늬있는 경성미술여행》(정옥, 메종인디아, 2022)을 읽었습니다. 72쪽에 나오는 ‘하얀빛’을 ‘한겨레빛’으로 덮어씌우는 보기를 들자면 ‘구본창’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구본창을 깍듯이 높이고, 일본에서 깍듯이 높이는 구본창은 이 나라에서도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얀빛 = 한겨레빛’이기는 합니다. 다만, ‘하양·흼’이 왜 ‘한겨레’하고 맞물리는가를 제대로 읽고 살펴서 그리는 사람이 드물 뿐이고, ‘하얌 = 한겨레’라는 얼거리를 나라(정부)가 앞장서서 숨기려 할 뿐 아니라, 숱한 바치(전문가)는 이 대목을 모르거나 엉뚱한 길로 빠질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룬 옛사람을 아울러 ‘한겨레’라 합니다.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부여 옥저 발해 같은 나라이름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한겨레’입니다. 피붙이로 여기는 이름이 아닌 ‘한겨레’입니다. 왜 한겨레가 ‘한겨레’이냐 하면 ‘한 = 하늘·해’이거든요. “하늘에서 온 겨레”이기에 ‘한겨레’입니다.
하늘은 ‘하나이면서 큰 우리(울타리·너와 나)’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한(하·하나) = 해’이기도 한데, 해는 하나이면서 크고 밝고 하얀빛으로 여깁니다. 해가 뜨고 질 적에는 다른 빛살로 바라보되, 바탕은 “하나 + 큼 + 밝음 + 하양 = 해”인 얼개입니다. 그래서 ‘한겨레·한나라·한누리·한사람’으로 맞물려서 헤아려야 알맞습니다. 우리 이름은 ‘한국’이 아닌 ‘한누리·한뉘’입니다.
또는 ‘해누리·햇뉘’요 ‘해사람·해님’이라 할 만하지요. 이 땅에서 하얗게(밝고 크며 하나로 아우를 줄 아는 너른 마음이자 사랑인) 사람이기에, 누구나 ‘해님’입니다. 《터무늬있는 경성미술여행》을 읽으면 “야나기 무네요시도 조선의 미를 ‘비애(悲哀)의 미’로 정의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나약한 관점을 추가했다고 할 수 있다(71쪽)”고 적는데, 야나기 무네요시 님이 모든 한빛(한겨레 빛)을 낱낱이 읽어내지는 못 했을는지 모르나, 적잖은 한빛을 밝혔고 들려주었고 첫머리를 열었습니다. 비록 야나기 무네요시 님이 더 나아가지 못 하기는 했되, 우리가 스스로 한빛인 해님인 줄 느끼고 살림살이를 사랑하는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는 ‘이야기씨앗’을 심어 주었어요. 이 이야기씨앗을 북돋우고 가꾸면서 숲을 이룰 몫까지 야나기 무네요시 님한테 바라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가꿀 일이요, 이분이 사납고 매몰찬 총칼나라(군국주의 식민지)에서 씩씩하게 내놓은 목소리는 귀여겨들을 일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전남 고흥이란 고장에서 살아가는데, 이 고흥을 돌아보면 ‘나혜석 발자취’도 ‘천경자 삶자취’도 깡그리 없습니다. 벼슬꾼(군수·공무원·지역예술가) 입맛에 안 맞거나 바른소리를 내면 몽땅 짓밟는 나리(양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고흥 한 곳만 이러지 않아요. 다른 고장도 서울도 매한가지입니다. 밟히고 찢기고 얻어터지면서 고단하거나 지칠 만한데, 나혜석 님이든 천경자 님이든 밟히고 찢기고 얻어터지면서도 으레 붓을 들었어요.
글붓이든 그림붓이든, 붓잡이는 벼슬이나 감투나 돈이나 이름이나 힘을 안 쳐다봅니다. 스스로 붓꾼으로 서는 길에는 온누리를 포근하게 감싸려는 마음을 일으켜 샘물빛으로 솟아나는 사랑으로 흐릅니다. ‘서울그림마실’을 하듯 나라 곳곳에서 저마다 푸른그림마실을 헤아리는 이웃이 하나둘 늘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이 되는 글이나 그림을 움켜쥐려 하는 모든 허울이나 껍데기를 걷어치우거나 녹여낼 어진 글님하고 그림님을 기다립니다.
ㅅㄴㄹ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술작품 감상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지만, 그것은 문인 취미를 지닌 사람들이나 서화를 소장한 사람들에 국한되었다. (66쪽)
1970년대 중반에 부상하여 현재까지 한국 미술계에서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단색화의 권위도 일제가 한국의 미로 설정한 “백색”에 초점을 두고 일본에서 개최한 전시의 성공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72쪽)
‘동양화’는 조선총독부가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하면서 사용한 용어로서, 우리 미술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96쪽)
그러고 보면 미술계는 참 우스운 곳이다. 작가가 스스로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구입한 미술관은 끝까지 진작(眞作)이라고 우기니 말이다. (111쪽)
하지만 가장 확실한 차별화 방법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114쪽)
일제강점기에만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다. 군부독재 시절에 예술의 피안으로 도피하여 관념적 정신성만을 추구한 일군의 작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민주화가 쟁취된 이후에 “침묵도 일종의 저항”이었다며 자신들을 변호한다. (198쪽)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리는 사람.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