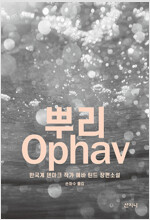숲노래 책숲마실
곳 자리 데 터 (2022.3.20.)
― 서울 〈무아레서점〉
해날(일요일)에 모처럼 서울마실을 합니다. 예전에는 흙날이나 해날에 쉬는 책집이 없었습니다. “다들 쉬는데 책집도 쉴 만하지 않나요?” “다들 쉬니까 책집에라도 오도록 책집은 열어야지요.” “그러면 여느날(평일)에는 쉬나요?” “여느날에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오도록, 또 살림하는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낮이나 아침에 오도록 열지요.” “그러면 언제 쉬셔요?” “설이나 한가위에도 안 쉬어요. 설이나 한가위에는 이 마을을 떠난 분들이 모처럼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책 좋아하는 분들은 설이나 한가위에 갈 데가 없다면서 책집으로 와요.” “한 해 내내 안 쉰다고요?” “책집사람은 책집에 나오는 일이 쉬는 셈이지요.”
요즈음에는 흙날이나 해날에 쉬는 책집이 제법 있습니다. 달날이나 불날이나 물날에 쉬는 책집도 퍽 있어요. 한 해 내내 안 쉬는 책집이 아직 몇 곳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책집도 쉼날을 누릴 노릇이라고 생각해요. 책집에서는 책이 되어 준 나무빛을 누리고, 쉼날에는 집살림을 돌보다가 푸른나무를 마주하는 숲빛을 누릴 적에 이 나라 책밭이 무럭무럭 자랄 만하리라 봅니다.
봄비가 막 그친 새벽에 고흥에서 길을 나섭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산은?” “비가 오면 언제나 즐겁게 맞으며 놀잖니. 그리고 오늘길에는 하늘에 대고 ‘비야 그쳐 주렴’ 하고 속삭였어.” 시외버스가 서울로 가까울수록 하늘빛이 파랗게 열립니다. 한낮에 전철을 갈아타서 〈무아레서점〉으로 걸어갑니다. 볕살이 부드럽게 스미는 이곳은 ‘물결무늬’를 느긋하게 담는다고 느낍니다. 미닫이를 열어도 부릉거리는 소리가 책집으로 그리 안 들어옵니다.
곁님한테 문득 “물결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고 물은 적 있는데, “글.”이라 짤막히 말하더군요. 물무늬가 어떻게 글일까 하고 한참 헤아려 보는데, 글이란 “말을 그려낸 무늬”입니다. ‘물’이란 “몸을 짓는 무늬”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말·물’은 뿌리가 같습니다. 〈무아레〉란 글밭이요 글바다입니다.
모든 곳은 저마다 살아가는 자리이면서 살림하는 데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랑으로 만나는 터이면서 삶을 가꾸는 집이 됩니다. 서울은 돈벌이·일거리·이름날개가 많아서 사람이 너울거린다고 하지만, 이 서울도 백 해나 이백 해 앞서를 돌아보면, 또 즈믄 해쯤 앞서를 되새기면, 나라 어느 곳하고도 똑같이 시골이었어요.
빛나는 곳은 남이 빛나게 해주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빛냅니다. 눈부신 자리는 남이 눈부시게 해놓지 않고, 우리가 손수 눈부시게 일굽니다. 남이 쓰고 엮었기에 읽는 책이라지만, 우리가 손으로 쥐어야 비로소 스스로 읽으며 누립니다.
ㅅㄴㄹ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가게에 갈까?》(박현선 글, 헤이북스, 2019.11.25.)
《뿌리 Ophav》(에바 틴드 글/손화수 옮김, 산지니, 2021.7.10.)
《결국 마음이 전부인거야》(민소윤 글, 민소윤, 2022.3.8.)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쓰고 “말꽃 짓는 책숲(사전 짓는 서재도서관)”을 꾸린다. 1992년부터 이 길을 걸었고, 쓴 책으로 《곁책》, 《쉬운 말이 평화》,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우리말 동시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시골에서 도서관 하는 즐거움》,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시골에서 책 읽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