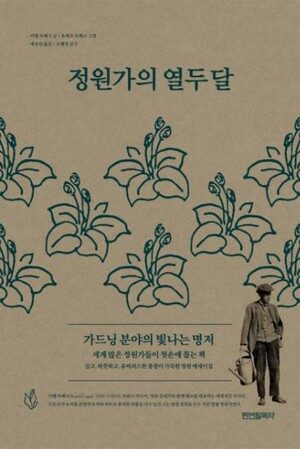-

-
정원가의 열두 달
카렐 차페크 지음, 요제프 차페크 그림, 배경린 옮김, 조혜령 감수 / 펜연필독약 / 2019년 6월
평점 :

품절

숲노래 숲책
숲책 읽기 165
《정원가의 열두 달》
카렐 차페크 글
요셉 차페크 그림
배경린 옮김
펜연필독약
2019.6.20.
《정원가의 열두 달》(카렐 차페크·요셉 차페크/배경린 옮김, 펜연필독약, 2019)이 새옷을 입고 나오며 사랑받습니다. 2002년에 《원예가의 열두 달》이란 이름으로 처음 나왔으나 그무렵에는 거의 못 읽히고 자취를 감추었어요. 지난날 이 책을 펴낸 분은 밝은눈이었을 텐데, 읽는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셈입니다.
글님이며 그림님은 꽃뜰을 즐겁게 가꾸는 손길을 글길로 고스란히 옮깁니다. 꽃길을 바라보던 눈길이 차곡차곡 그림길로 피어나고 마음길로 퍼집니다.
아이하고 눈과 마음을 맞추지 않는 모든 말은 ‘주먹질(폭력)’이지 싶습니다. 풀꽃나무하고 눈과 마음을 맞추지 않는 모든 말도 주먹질이지 싶어요. 하늘·바람·냇물·흙·구름·눈비·뭇목숨하고 눈과 마음을 맞추지 않는 모든 말도 주먹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 돌보는 어버이는 아이를 ‘인문학적’이나 ‘인문지식’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이는 싱그러이 꿈꾸고 춤추고 뛰노는 사람인걸요. 씨앗을 묻어 가꾸는 일꾼은 풀꽃나무를 ‘생물학적’이나 ‘생태지식’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사람이 억지로 바꾸거나 뒤틀 수 없는 목숨인걸요.
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아이요 풀꽃나무입니다. 달마다 새록새록 크는 아이요 풀꽃나무예요. 날마다 새삼스레 피어나는 아이요 풀꽃나무입니다. 아이를 보듯 풀꽃나무를 보면 좋겠습니다. 풀꽃나무를 보듯 아이를 보는 숨결이기를 바라요.
잔가지라 해도 함부로 꺾으면 나무는 아프기 마련입니다. 잔소리라 해도 함부로 쏟아내면 아이가 아픕니다. 작은 들풀이라 해서 마구 밟거나 삽차로 밀어내면 들내숲은 모두 시름시름 앓습니다. 아이를 배움수렁(입시지옥)으로 내모는 자그마한 몸짓조차 아이가 시름시름 앓도록 괴롭히는 셈입니다.
달종이에 적힌 셈값이 아닌 하루입니다. 모든 하루는 다른 날이요 삶입니다. 오늘 이곳을 빛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에 꽃씨를 심고 글씨를 가다듬습니다. 《정원가의 열두 달》을 곁에 둘 적에는 두 손에 꽃씨랑 붓을 나란히 놓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풀꽃나무를 돌보고, 하루는 글길을 보살핍니다. 어제는 풀꽃나무를 쓰다듬고, 오늘은 글자락을 어루만집니다.
ㅅㄴㄹ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변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당신은 정원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햇살이 비치면 그건 정원을 밝게 비추는 햇살이다. (30쪽)
이름이 없는 꽃은 곧 잡초요, 라틴어 학명이 있는 꽃은 어떤 식으로든 존엄성을 인정받는다. 만약 당신의 화단에 쐐기풀이 자란다면 우르티카 디오이카라는 팻말을 한번 꽂아 보라.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뀔 것이다. (83쪽)
보통 사무실의 식생은 사장이나 직원의 마음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어떤 전통도 작용하는 듯하다. 가령 철도 관련 지역에서는 식물이 매우 번창하는 반면, 우체국이나 전신국은 식물의 불모지다. 또 관공서보단 개인 사무실이 식물학적으로 훨씬 비옥한 편이며, 관공서 중에서도 특히 세무서는 완벽한 사막이다. (129쪽)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비밀스럽게 싹을 틔우는지, 얼마나 많은 힘을 끌어모아 새로운 싹눈을 품는지, 생명을 한껏 꽃피울 순간을 그네들이 얼마나 고대하는지, 우리 내면에 자리한 미래의 비밀스럽고도 분주한 몸짓을 볼 수만 있다면 …… (186쪽)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들은 늘 한 발짝 앞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시간은 무언가를 자라게 하고 해마다 아름다움을 조금씩 더한다. (2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