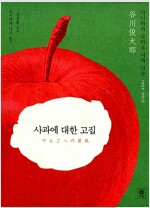숲노래 책숲마실
저녁이라는 길 (2020.12.16.)
― 전주 〈카프카〉
해가 떨어진 시골에서는 하나둘 돋아서 어느새 하늘에 하얗게 냇물처럼 흐르는 별빛을 바라봅니다. 해가 떨어진 큰고장에서는 가게마다 밝히는 불빛이 넘실거리고, 높다란 집 사이에 휭휭 이는 골바람이 매섭습니다. 흔히들 시골이 밤이나 새벽에 더 춥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시골은 높다란 집이 아닌 우람한 나무가 집을 둘러싸면서 외려 포근하지 싶어요. 큰고장에는 겨울바람을 그을 나무가 없다시피 하기에, 더구나 높다란 집은 바람골을 일으켜 겨울이 더욱 시리구나 싶어요.
저녁에 전주에 닿았습니다. 전주에서 푸름이를 이끄는 이웃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신다기에 〈카프카〉에 깃들려고 골목을 걷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걷다가 꽤 헤맵니다. 길그림을 켜고 걸으나 살짝 아리송합니다. 찬바람이 더 매서운 저녁나절인데, 책집을 품은 골목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헤매는 동안 전주 저녁골목을 헤아렸어요. 아무래도 큰고장 한복판에서 별을 찾는 일은 어리석은 듯하지만, 전주라는 고장에서 한밤에 불빛이 아닌 별빛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나고 멋질까요? 다른 고장도 그래요. 밤에 불빛을 밝히는 큰고장이 아닌, 밤에 한결 고요히 별빛을 그리는 큰고장으로 거듭나면 참으로 좋겠어요.
언손을 비빕니다. 디딤칸을 찬찬히 밟고 올라섭니다. 책집지기님은 살짝 마실을 간 듯합니다. 책집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조금 있자니 책집지기님이 올라와서 미닫이를 열어 줍니다.
알맞게 어두운 〈카프카〉는 둘레 저녁빛을 새롭게 보듬는 기운이 흐르는구나 싶습니다. ‘카프카를 알리는 불빛’은 길가에 따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틀림없이 카프카가 있고’ 책집 너른마루에 가볍게 편 책시렁이며 책꽂이에는 우리가 아늑히 생각을 일깨울 이야기꾸러미가 다소곳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건사하자 싶어 글꾸러미를 꺼내어 “골목을 걷다가 / 문득 한 칸 두 칸 / 디디며 들어서면 / 노래물결로 퍼지는 숲”처럼 넉줄글을 적습니다. 어느 숲이건 노래가 흐릅니다. 새가 노래하고 풀벌레가 노래하고 들짐승이 노래해요. 그리고 숲으로 찾아간 사람이 상냥히 노래를 곁들여요.
책집에 들어서면 책집에서 흐르는 노래가 있고, 책마다 우리를 기다리며 흥얼대는 노래가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 책 하나를 손에 쥐며 저절로 터져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모든 말은 우리가 살림을 짓는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밥은 우리 보금자리를 둘러싼 숲에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살림자리랑 숲터에서 고요하게 깨어났습니다. 모든 마을은 사이좋게 어우러지는 이웃이 모여 일어났습니다.
《사과에 대한 고집》(다니카와 슌타로/요시카와 나기 옮김, 비채, 2015.4.24.)
《다자이 오사무 서한집》(다자이 오사무/정수윤 옮김, 읻다, 2020.10.19.)
ㅅ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