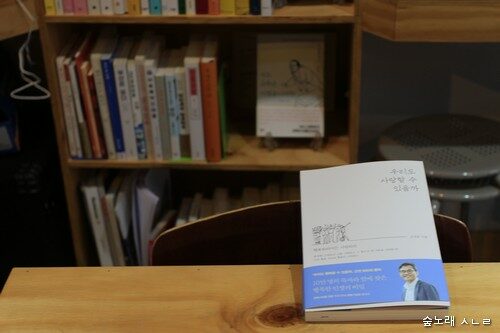숲노래 책숲마실
곁에서 돌보는 손길로 (2018.3.15.)
― 부산 〈산복도로 북살롱〉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197
070.7842.1809.
blog.naver.com/booksalonbusan
전북 완주에 있는 책마을에서 일하는 분이 책마을을 새롭고 알뜰히 가꾸는 길이 없을까 걱정이라면서 말씀을 여쭈길래, “그러면 부산 보수동 책골목을 누려 보셔요. 이러다 보면 저절로 길을 찾을 만하리라 생각해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보수동 여러 헌책집을 알려주고, 또 이만 한 책골목이 그동안 어떻게 책잔치를 스스로 일으키고 마을을 바꾸어 내면서 가꾸는가 하고 보탬말을 들려주려고 오랜만에 부산마실을 합니다.
2015년으로 넘어설 즈음 쓸쓸한 일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부산마실을 끊었는데, 네 해 만에 보수동을 찾아가니 여러모로 달라졌습니다. 문을 닫은 책집이 제법 있고, 책집지기가 바뀐 곳도 있으며, 책골목에 찻집이 꽤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흐르는 빛도 포근하게 흐릅니다. 사람에 늘 치이는 고장이라지만, 사람한테 치이면서도 사람한테서 숨결을 받아들여 얼크러지는 고장이기도 하네 싶어요. 미운 일이 있어도 그 미운 일마저 품는 고장이랄까요.
2016년 5월에 문을 열었다는 〈산복도로 북살롱〉입니다(2019년 2월에 보수동을 떠나 동래로 옮겼습니다). 가파란 디딤돌을 오르내리면 어느새 보수동 책골목에 닿는, 그렇지만 한갓지면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골목에 깃든 책집이에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책집을 꾸며서 이처럼 돌보니 멋스럽습니다. 언제나 우리 손길로 터를 일구고, 우리 마음으로 터를 품으며, 우리 사랑으로 터를 빛내네 싶어요.
북적판인 헌책골목하고는 사뭇 다른 결이 있는 〈산복도로 북살롱〉에 깃들어 아직 차가운 봄비를 느낍니다. 보수동 곁에 사는 분들은 여러 빛깔 책맛을 누리겠네요. 너른 저잣거리까지 가깝고 여러모로 아기자기하지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책을 만날 만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동네 고양이》(황부농, 이후진프레스, 2018)를 넘깁니다. 우리 마을에서 샘솟는 이야기를 찬찬히 담았을 테지요. 먼먼 다른 마을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곁에 있는 반가운 동무를 만납니다.
책집지기님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하는 《책의 소리를 들어라》(다카세 쓰요시/백원근 옮김, 책의학교, 2017)를 고르기로 합니다. 두툼한 책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일본에서 ‘책소리’를 널리 펴려고 하던 분은 책집에만 책을 두는 길이 아닌 온갖 곳에 책을 두려고 했다지요. 그런데 책사랑이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책사랑이인 의사는 병원에 여러 책을 둡니다. 치과에 가면 만화책이 많은 곳이 있는데, 이를 고치려는 어린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도록 도우려고 부러 만화책을 두기도 한다지요. 그렇다고 모든 치과에 만화책이 있지는 않아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만화책을 알고, 어린이 마음을 헤아리는 치과라면 만화책을 한켠에 놓아요.
꽃집에 책을 놓아도 좋아요. 꽃을 다룬 책뿐 아니라, 시골살이나 시골살림을 다룬 책이라든지 사전도 좋지요. 꽃을 바라보듯 말을 바라보도록 북돋울 만하거든요. 꽃을 아끼듯 마을을 아끼자는 뜻으로 마을살림을 다룬 책을 놓아도 어울립니다. 아니, 어떤 책을 놓든 책사랑이 마음길이며 손길에 따라 이웃이 책 하나를 새롭게 바라보며 다가서도록 이끄는 징검다리가 되어요.
책이 있으면 책을 둘 자리가 있어야겠지요. 이러한 얼거리로 엮었구나 싶은 《아무튼, 서재》(김윤관, 제철소, 2017)를 집습니다. 그런데 좀 허전합니다. ‘아무튼’이란 이름을 붙여서 여러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지 싶은데, 어느 하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책을 쓰기는 하겠지만, 아직 얕구나 싶어요.
책시렁이나 책칸을 서른 해나 쉰 해쯤 누려 보고서야 서재 이야기를 써야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이야기이든 더 오래 누려야 더 잘 쓰지 않아요. 다만, 깊이뿐 아니라 너비도 꽤 허술해요. 한두 해를 지켜본 이야기를 쓰더라도 열두 달이나 스물넉 달을 날마다 다르게 마주하면서 사랑한 숨결이 아니라면 어설프더군요. 마음으로 느끼고 읽어서 다루지 않는다면 껍데기를 그럴듯하게 매만진다든지 겉치레에 치우치고 말아요.
술하고 책이 어울린다고 여기는 책집지기님 눈빛대로 놓인 《언니는 맥주를 마신다》(윤동교, 레드우드, 2016)까지 장만하기로 합니다. 부산마실을 마치고 고흥으로 돌아가는 너덧 시간 남짓 걸리는 버스길에서 읽는데, ‘글쓴이가 좋아하는 보리술’ 이야기라기보다는 ‘난 이런 보리술도 저런 큰가게에 가서 찾아내어 맛을 봤지롱’으로 기울어지느라 아쉽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아서 책으로 묶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스스로 혀끝뿐 아니라 눈빛으로도 술맛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적잖은 ‘수입 맥주’는 ‘그 나라 것을 그대로 사들인’ 보리술이기보다는, ‘이름만 붙이고 한국에서 가루를 섞은’ 것이곤 합니다. 술맛인지 가루맛인지, 또 어떤 물맛인지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보리술뿐 아니라 막걸리이든 포도술이든 제대로 밝히지는 못하리라 느낍니다.
부산은 골목이 매우 좁습니다. 집하고 집 사이가 아주 좁아요. 이 좁은 틈에 찻길을 내고, 자동차가 넘치니 골목 한켠에 아슬아슬하게 붙입니다. 이 틈으로 버스에 택시에 짐차에 숱한 자가용이 섞입니다. 집도 사람도 차도 많다 보니, 다리를 느긋이 쉰다거나 한갓진 자리를 찾기란 만만찮은 부산이에요. 이러한 부산에서 책집은 어떤 몫을 맡으면서 나아갈 만할까요. 서울보다 더욱 복닥거리는 마당이여 터전일 부산에서 태어나고 흐르는 책집은 부산사람한테 어떠한 삶길을 밝히고 어떠한 노래를 들려주는 쉼터로 퍼질 만할까요.
자동차는 며칠쯤 세우면 좋겠어요. 바쁜 일은 하루를 쉬든 하루조차 안 쉬든 언제나 바쁜 일이니 며칠쯤 내려놓아도 좋겠어요. 느긋하기에 읽는 책이 아니라, 바쁘기에 이때에 틈을 내어 읽는 책이라고 느껴요. 살림돈이 많아야 사서 읽는 책이 아닌, 팍팍한 살림이기에 쪼개고 덜어서 아름책 하나를 만나려고 책집마실을 한다고 여겨요.
부산이 부산스러운 터로 이어가도 나쁘지 않을 테지만, 냇가나 못가에서 부드럽게 꽃피며 어우러지는 부들처럼 부들부들 상냥하게 바람이 일렁이는 터로 달라지면 어떠할까 하고 생각하며, 이제 시외버스에서 책을 다 읽고 살짝 눈을 붙입니다.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한국말사전을 쓰고 “사전 짓는 책숲(사전 짓는 서재도서관)”을 꾸리는 숲노래(최종규). 1992년부터 이 길을 걸었고, 2019년까지 쓴 책으로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우리말 동시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시골에서 도서관 하는 즐거움》,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시골에서 책 읽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