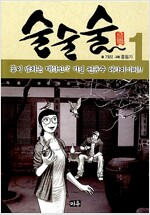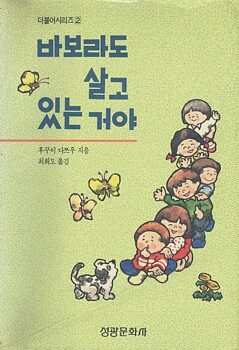내 삶에 한 줄, 반갑게 읽는 책
두 아이 새근새근 자는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습니다. 희뿌옇게 트는 동에 기대어 책을 펼칩니다. 헌책방에서 고맙게 만난 《바보라도 살고 있는 거야》(성광문화사,1992)를 몇 쪽 읽습니다. 이 책을 쓴 일본사람 후꾸이 다쯔우(福井達雨) 님은 1962년에 ‘지양학원’이라 하는 장애 어린이 보육원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직 장애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던 무렵이라 사회와 정부와 마을과 여느 어버이조차 장애 어린이를 바라보는 눈길을 차갑기만 했다는데, 바로 이 차갑기만 하던 눈길이 슬프고 안타까운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꿈꾸었다고 해요. “진짜 법률은 어떠한 작은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입니다(67쪽).” 하고 말하며 공무원과 의사하고 싸웁니다. 무엇보다 후꾸이 다쯔우 님을 비롯해 지양학원 교사들은 “이 아이들은 육체가 아니고, 한 생명입니다(51쪽).” 하고 말할 줄 압니다.
날마다 몇 쪽씩 읽으며 새 기운을 북돋웁니다. 책에 나오는 일본 장애 어린이도, 우리 집에서 이른새벽부터 씩씩하게 일어나 개구지게 노는 아이들도, 모두 아름다운 목숨이에요. 맑은 사람이고 밝은 눈빛이며 고운 몸뚱이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시계를 바라보며 더 자거나 덜 자려 하지 않아요. 몸이 개운하게 잠을 깼으면 놉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나무토막을 쌓고 무너뜨리며, 책을 읽기도 하고, 연필로 곳곳에 그림을 그립니다. 넘치는 기운을 마음껏 온 사랑으로 누립니다.
홍동기 님이 그리고 가리 님이 글을 넣은 《술술술》(미우,2012)이라는 만화책 첫째 권을 읽다가, 238쪽에서 “단맛에 길든 사람들 미각이 원래의 막걸리를 독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게 만드느라 이것저것 섞고. 하지만, 내가 마신다고 생각하면 나는 못 섞어. 쌀도 수입쌀을 쓰면 수지타산이 맞지만, 내가 농사지은 쌀에는 쥐가 들어도 수입쌀 더미엔 쥐가 안 들더라구. 그걸 보고는 수입쌀이 무서워서 내가 지은 쌀로만 만들어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말여.” 하는 대목을 봅니다. 좋은 기운으로 밥을 짓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밥이 될 쌀이 되는 벼’를 흙(논)에 심어 거둡니다. 볍씨를 갈무리해서 모판을 만들 때부터 언제나 좋은 꿈을 꿉니다. 나쁜 꿈이나 나쁜 생각이 깃들면, 좋은 밥을 짓지 못해요. 맨 처음 씨앗일 때부터 좋은 손길로 좋은 흙에 심으려고 마음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누구나 흙을 일구는 사람이었던 지난날 시골마을에서 ‘손수 지은 곡식’으로 술 한 동이를 빚을 때에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기운이 서린 사랑으로 술을 빚었으리라 느껴요. 내가 먹을 곡식을 내가 살아가는 땅에서 일구어요. 내가 먹을 곡식을 갈무리해서 내가 마실 술을 내 보금자리에서 빚어요. 내가 사는 마을 들판과 멧골을 함부러 더럽히는 사람이란 없어요. 내가 사는 보금자리를 예쁘고 정갈히 건사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먹고, 내 어버이가 먹어요. 내가 마시고, 내 아이들이 마셔요. 내가 먹고, 내 동무하고 나누어요. 내가 마시고, 내 이웃하고 함께 즐겨요.
어니스트 톰슨 시튼 님이 쓴 《뒷골목 고양이》(지호,2003) 36쪽을 살피면, “우리에 갇힌 어미 고양이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먹을 것과 물은 충분했지만, 자유가 몹시도 그리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고양이들은 우리 집 마당도 우리 옆집 마당도 홀가분하게 드나듭니다. 어느 때에는 돌로 쌓은 울타리를 새끼들 이끌고 천천히 밟으며 지나갑니다. 때로는 돌울타리를 잘못 디뎌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마을에 들고양이가 여럿이지만, 가을에 나락을 베어 푸대에 담으면 으레 쥐들이 쏠아 쌀알을 파먹는답니다.
빗소리를 듣습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 따라 세차게 지붕과 마당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를 듣습니다. 한창 이삭이 팰 무렵 이렇게 거센 비바람이 찾아들면 어쩌나 싶지만, 들판에서 흙에 뿌리내리고 햇살을 바라보는 볏포기는 씩씩하게 비바람을 맞아들입니다. 작은아이는 가슴에 안고 큰아이는 걸리며 논밭 사잇길을 걷습니다. 구름을 올려다봅니다. 바람이 부는 결을 헤아립니다. 이 빗속에서도 노랫소리 나누어 주는 풀벌레를 생각합니다. 빗속 풀벌레 노랫소리는 어느 살림집 처마 밑에서 들려올까요. 아니면 마루 밑에서 들려올까요. 아니면 감나무 밑이나 석류나무 밑에서 들려올까요. 한여름에 깨어나 나무를 타고 오르던 매미들은 세찬 비바람을 어디에서 그을까요. 나뭇가지 한쪽에 조그맣게 웅크리면서 날이 개기를 기다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