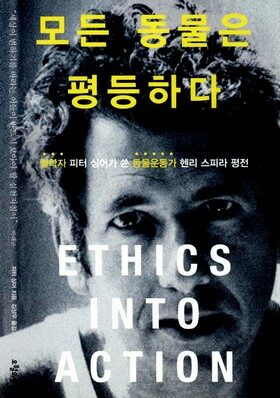-

-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 철학자 피터 싱어가 쓴 동물운동가 헨리 스피라 평전 ㅣ 불온한 책 2
피터 싱어 지음, 김상우 옮김 / 오월의봄 / 2013년 7월
평점 :



숲책 읽기 96
평등한 사이일 적에 평화롭습니다
―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피터 싱어 글
김상우 옮김
오월의봄 펴냄, 2013.7.22. 16000원
“군대는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했다 … 검열은 무수히 많았다. 모든 물건이 균일해야 했고 정확한 장소에 있어야 했다. 심지어 군화 밑창까지 닦아야 했다. 병사는 좀비처럼 생각하는 것도 자발적인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다.” (45∼46쪽)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오월의봄, 2013)는 ‘헨리 스피라(1927∼1998)’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적바림한 책입니다. 헨리 스피라 님은 사람한테뿐 아니라 짐승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지요. 이른바 ‘동물권’을 외치면서, 실험실에서 숱한 짐승이 소리 없이 죽어야 할 까닭이 없다는 뜻을 널리 폈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좀처럼 뜨이지 않으나 엄청나게 시달리거나 들볶이다가 죽는 짐승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거의 알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벌이는 ‘동물실험’은 좀처럼 실험실 밖으로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흰쥐 몸에 무엇을 하는지, 토끼 눈에 무엇을 하는지, 고양이한테 무엇을 하는지, 실험실 바깥인 여느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보면 독일이나 일본은 숱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끔찍하게 생체실험을 했습니다. ‘과학 연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요.
그들의 연구가 인간 아닌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그들은 그 같은 자유를 누려도 좋은 것일까? 헨리는 결심했다. 고양이 실험 반대운동은 동물실험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얼마나 보겠다고 동물을 이토록 심하게 괴롭히는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130∼131쪽)
고양이 성행동 실험 반대운동이 성공을 거두었던 이무렵 헨리는 더 큰 목표를 찾아 나섰다. 그 같은 작업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과학문화를 바꾸는 것이었다. (156쪽)
우리는 모르는 것투성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르는 것투성이는 아니었다고 느껴요. 우리가 저마다 자그마한 마을에서 아기자기하게 살림을 손수 지으며 살아가던 무렵에는 모르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사회가 첨단으로 흐르면서 모르는 것이 늘어납니다. 학교가 숱하게 생기고, 전문기관이나 연구소나 갖은 정치기구가 생기는 사이에도 모르는 것이 늘어나요.
왜 그러할까요?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전문 자료를 어떻게 건사하는가를 잘 안 밝힙니다. 어쩌면 굳이 안 밝힐 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손전화라는 기계를 쓰는데, 이 손전화라는 기계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탕으로 삼는지를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손전화를 만드는 어느 광물을 얻느라 우거진 숲을 파헤치거나 무너뜨립니다. 더구나 몇 해쯤 쓰고서 낡고 말아 버리는 손전화 기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는 핵발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얼마나 알까요? 청와대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시장실이나 군수실에서, 군부대에서, 고위 공직자라는 이들이 어울리는 곳에서, 경제를 거머쥔다는 이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참말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알 수 없어요.
반수치사량은 동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별다른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계속 확대됐다. 정확성의 의미가 완벽하게 없는데도 관료주의와 수학적 정확성이 합심한 사례로 보는 게 맞겠다. (243쪽)
화장품 기업들이 동물검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안이 개발됐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283쪽)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도 사람들이 쓰기 앞서 생체실험을 으레 하는데, 이 생체실험은 사람한테 하지 않고 온갖 짐승들한테 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숱한 짐승이 목숨을 잃을 뿐 아니라, 목숨을 안 잃어도 눈이나 팔다리를 잃거나 매우 괴로워 한답니다.
헨리 스피라 님은 처음부터 동물권이라는 대목에 눈을 뜨지는 않았다고 해요. 폭력이 얼마나 그악스러운가를 몸으로 느꼈고, 폭력으로는 평화도 평등도 민주도 이룰 수 없다고 느꼈다지요. 이러던 어느 날 사람들 눈밖에서 너무나 많은 짐승들이 아주 하찮게 죽어 나가는 이야기를 들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하나하나 찾아나섰으며, 이때부터 온삶을 바쳐서 ‘우리 이웃인 작은 짐승한테 권리를 도로 찾아 주는 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폭력은 학대행위를 옹호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희생자로 자처할 빌미를 마련해 준다.” (321쪽)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원하는 일을, 가장 원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뿐이죠.” (399쪽)
어느 분은 동물권이라는 말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권이라는 말이 거북한 분이라면 사람권(인권)이라는 말도 거북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삶이 평등하면서 평화롭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기에 짐승도 하찮게 보고 이웃도 따돌리지 않을까요?
서로 아낄 수 있는 마음이기에 손을 맞잡거나 어깨동무를 합니다. 서로 돌볼 줄 아는 마음이기에 이 지구라는 별에서 즐거우면서 곱게 어우러지는 길을 생각하거나 찾습니다.
작은 짐승이라서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고 여기는 마음이라면, 이웃인 사람한테도 따뜻하거나 너그럽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모든 짐승이 평등하다고 느끼며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라면, 작거나 여린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줄 알아차릴 테고요.
틀을 가르지 않고, 위아래를 나누지 않으며, 나한테 돈이 되는 쪽에 끌리지 않는 고른 마음이 퍼질 수 있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동물권도 사람권도, 고른 평등과 평화도 모두, 넉넉하고 따사롭게 온누리에 드리우기를 빌어요. 평등한 사이일 적에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사이일 적에 평등합니다. 2017.12.3.해.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