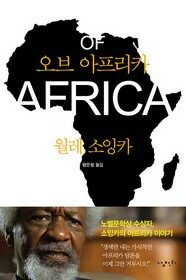-

-
오브 아프리카
월레 소잉카 지음, 왕은철 옮김 / 삼천리 / 2017년 2월
평점 :

품절

책읽기 삶읽기 319
책만 읽어서는 아프리카를 알 수 없다
― 오브 아프리카
월레 소잉카 글
왕은철 옮김
삼천리 펴냄, 2017.2.3. 16000원
우리는 우리가 살지 않는 고장을 놓고서 잘못 알거나 엉성하게 알거나 엉뚱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전남 고흥이나 경북 봉화 같은 고장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짚거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인천이나 광주 같은 고장이 어떠한가를 낱낱이 살피거나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국에 살면서 막상 한국이 크게 보아 어떠한 고장이 모인 나라인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사회나 역사 과목으로만 한국을 알 수 있고,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여러 고장을 그저 책이나 교과서나 방송이나 인터넷 지식으로만 어렴풋하게 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하고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알까요? 일본이나 중국에 몇 차례 여행을 다녀왔다면 일본이나 중국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해를 살아 보았다면, 스무 해쯤 살아 보았다면, 그 나라를 제법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살인적인 갈등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원이 고갈되어 갔다. 소년병으로서 온갖 잔혹 행위를 저지르며 성장한 젊은 세대의 윤리적 파멸은 말할 것도 없었다. (25∼26쪽)
아프리카에는 배타주의와 맞물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국경 문제다. 국경은 배타성을 의미한다. 대륙에서 미래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 갈등의 오염된 씨앗이 1884년의 악명 높은 베를린회의에서 뿌려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7쪽)
《오브 아프리카》(삼천리,2017)를 읽는 내내 아프리카라는 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프리카라는 곳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가를 종잡기 어렵더군요. 저는 아프리카라는 곳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 본 적이 없으니 아프리카라는 데에서 산 적조차 없어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무척 넓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만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쓰는 말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란, 《오브 아프리카》 같은 책처럼, 참말로 책으로 읽어서 아는 아프리카입니다. 때로는 영화로 보아서 알고, 때로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보아서 아는 아프리카예요. 두 다리로 밟아 보지 않은 지식이고,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은 그야말로 겉훑는 정보만 제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프리카를 ‘안다’거나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책 몇 권 읽은 지식으로 아프리카를 섣불리 말해도 될까요?
설상가상으로, 외국 열강과 초국적 기업들은 독재정권과 상대하기를 좋아한다. 기관을 통한 감독이 느슨해서 계약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 아프리카 대륙을 근대 세계의 주된 흐름에 합류시키려면 ‘강력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통상 사절이 떠받드는 복음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이단자이자 변절자로 매도되고 만다. (32, 33쪽)
선구적인 진보 인사들이 인종적인 경험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서조차 수단 정부의 인종 정책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변명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37쪽)
《오브 아프리카》를 읽는 내내, 또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란 그저 한 줌짜리입니다. 게다가 손수 밟거나 다니거나 살펴본 지식마저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월레 소잉카 님은 1934년에 태어났고, 198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무렵에야 이 대목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월레 소잉카 님 문학이나 책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읽은 적도 없습니다.
월레 소잉카 님은 ‘아프리카 바깥에서 아프리카를 가리키며 읊는 말’이 얼마나 아프리카 삶이나 터전이나 사람하고 동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프리카가 떠안은 짐이나 굴레를 아프리카에서 스스로 풀거나 짊어질 수 있어야 할 텐데, 아프리카 바깥에서 너무 ‘섣부른 말’이 넘친다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아프리카라는 곳에서도 나라 우두머리(정치 지도자) 사이에 말썽거리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아주 쉽게 독재정치가 불거지고, 이 독재정치는 끔찍한 싸움으로 번지며, 이 끔찍한 싸움은 이른바 ‘인종청소·소년병’ 따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당시 흑인들에게 매독 균이 주입되었고, 일부에게는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북반구에서 행해진 의학적 연구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였다.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노예의 자손들이었다. (107쪽)
잔자위드 습격자들이 저지른 인종청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거듭 증언했듯이, 그들이 즐겨 외치던 소리가 역사적인 혐오의 소리인 “노예들을 죽이자!”였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겠다. 미국의 깊숙한 남부에서 KKK 단원들도 밤에 돌아다니며 비슷한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검둥이들을 매달아 죽이자!” “노예들을 모조리 죽이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은 …… (119쪽)
우리는 《오브 아프리카》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아프리카를 알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을 살짝 맛보거나 엿본다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아프리카를 아주 조금 훑는다고 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우리 이웃 고장이 어떠한가를 놓고도 아주 조그맣게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을 테지요.
평택을, 강정을, 밀양을, 성주를, 우리는 얼마나 살갗으로 느끼면서 생각할 만할까요? 핵발전소나 핵폐기물처리장 예정지로 뽑혔다가 그 고장 사람들 손사래질로 겨우 물리친 일을 놓고서, 그 고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분들은 이러한 삶과 살림을 어느 만큼 살갗으로 느끼면서 생각할 만할까요?
제가 사는 전남 고흥에서는 요즈막에 ‘경비행기 실험장 유치 강행’이라는 행정 때문에 힘겹습니다. 다른 고장에서는 드넓은 갯벌을 메워 땅으로 바꾼 데에 다시 바닷물이 흐르도록 해서 예전 같은 갯벌로 되돌리는 정책을 꾀합니다. 갯벌을 메워 논으로 쓰는 보람보다는, 갯벌 그대로 있을 적에 경제가치를 비롯한 모든 대목에서 훨씬 나은 줄 이제서야 깨닫거든요. 그렇지만 전남 고흥에서는 바로 그 ‘갯벌을 메운 땅’을 다시 갯벌로 돌리려는 정책이 아닌, 경비행기 실험장을 유치하려는 행정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런 일을 놓고도 고흥이라는 고장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시달릴 마을사람 삶을 다른 고장에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드넓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갯것을 언제나 잔뜩 얻어서 넉넉한 살림을 이루던 지난날을 되찾지 못하는 아픔을 다른 고장에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책만 읽어서는 아프리카를 알 수 없습니다. 신문만 읽어서는 이웃 고장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몸으로 부대끼기도 하고 어깨동무도 해야 하고, 말을 섞으면서 오래도록 지켜보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대목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싶어요.
여기에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가 있으며, 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시골 군이 있고, 그 군에서도 더 작은 읍과 면이 있으며, 그 읍과 면에서도 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서울이고 시골이고 작은 마을이 작으면서 평화로울 적에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이 바탕이 되어 사이좋은 민주와 평등이 싹틀 수 있으리라 느껴요. 마을을 알려고 할 적에, 마을을 바라보려고 할 적에, 마을에서 사는 이웃하고 손을 맞잡으려고 할 적에, 우리는 사람됨을 되찾는 착한 마음결로 삶을 지으리라 봅니다. 2017.9.3.해.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