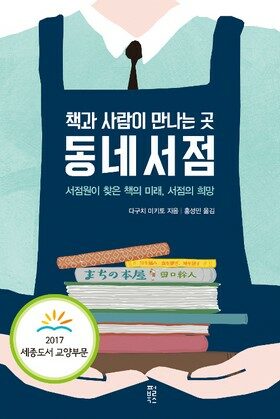-

-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동네서점 - 서점원이 찾은 책의 미래, 서점의 희망
다구치 미키토 지음, 홍성민 옮김 / 펄북스 / 2016년 10월
평점 :

절판

따뜻한 삶읽기, 인문책 185
마을책방에서는 책만 사지 않습니다
―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동네서점
다구치 미키토 글
홍성민 옮김
펄북스 펴냄, 2016.10.20. 13000원
책방이 없는 시골과 도시를 생각해 봅니다. 시골에 책방이 없다면, 시골에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골에서는 일철이 있고 일철이 아닌 때가 있어요. 일철에는 부지깽이도 거들어야 할 만큼 바쁩니다만, 일철이 지나면 여러모로 한갓집니다. 시골에 책방이 없다고 한다면, 일철이 아닌 쉬는 한갓진 철에 책을 곁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책방이 없다면 시골하고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시골에서는 심고 가꾸고 거두고 갈무리하는 일철이 날씨 흐름하고 맞물리면서 흐릅니다. 도시에서는 봄부터 겨울까지 따로 날씨나 철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요. 비가 오거나 볕이 내리쬐거나 출퇴근 시간은 같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출퇴근 시간은 같지요. 도시에 책방이 없다면 날마다 똑같이 일하러 다니느라 바쁘거나 벅차거나 고단한 터라 책을 곁에 둘 만큼 느긋하거나 넉넉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책 한 권을 살 돈이 없다기보다도 책이 있어도, 이를테면 도서관이 있어도 빌려서 볼 만한 겨를이나 말미를 못 낸다는 뜻이에요.
서점은 단순한 기호품을 다루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재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도호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 모두에게 책은 필수품이었다. (9쪽)
내가 초등학생 때는 서점 장사가 잘되었다. 동네도 시끌벅적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모든 교류의 장이 서점이었다. 계산대 옆에는 응접세트가 있었고 그곳에 늘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눴다. (22쪽)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동네서점》(펄북스,2016)을 읽습니다. 이 책에는 일본에서 작은 마을책방을 꾸리는 분이 이녁 책살림을 풀어놓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커다란 도시가 아닌 작은 시골 언저리에서 마을책방을 하는 마음과 삶과 생각을 들려줍니다.
그렇다고 아주 깊은 시골까지는 아닙니다만, 한국으로 치자면 보성읍이나 봉화읍 같은 곳에 마을책방을 열어서 꾸린다고 볼 만해요. 책을 사서 읽을 만한 사람이 적다고 할 만한 곳에서 마을책방을 꾸린다고 할까요.
이토 씨는 과일에 제철이 있듯이 책에도 ‘철(때)’이 있다고 했다. 무조건 신간이라고 제철이 아니다. 오래된 책도 제철이 찾아온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손님에게 제안할까. (31쪽)
동네서점에는 ‘철수’라는 선택지가 없다 … 반면에 전국적으로 뻗어 있는 대형점은 모리오카라는 땅에서 장사가 안된다면 철수해 버리면 된다. (56쪽)
일본하고 한국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온누리에 손꼽히는 ‘책벌레’ 나라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도 책방도 대단히 많고, 책방거리도 곳곳에 있을 뿐 아니라, 책 팔림새도 돋보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숫자나 크기만으로 일본이 ‘책벌레’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느껴요. 한국 사회나 정치나 역사 흐름을 돌아본다면, 양반과 양반 아닌 사람을 가르는 틀에다가, 양반만 한문을 익혀서 책을 볼 수 있던 틀도 깊었습니다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한국도 대단히 드높아요. 비록 오늘날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교’에 목을 매다는 입시교육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지만 말이지요.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우리만의 색깔을 갖고 한 권 한 권을 파는’ 열정이다. (61쪽)
손님이 어떤 책이 필요할지 상상해서 스스로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길을 만드는 것이 서점의 역할이자 즐거움이다. (69쪽)
《동네서점》은 마을에 책방이 있으면 무엇이 좋은가 하는 대목을 차분하게 짚습니다. 마을에 책방이 있으니, 첫째 마을에서 책을 바라는 분들이 즐겁게 나들이를 온다고 해요.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을 찾기도 할 테지만, 책이 무엇인가를 더 살갗으로 느끼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우리가 책을 인터넷서점에 주문을 넣어서 사더라도 ‘손에 책을 쥐어서 우리 스스로 눈으로 글씨를 좇아 마음에 이야기를 담아’야 비로소 ‘읽는다’는 일을 이루거든요. 사람들이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구태여 인터넷으로 주문을 넣기보다는 스스로 짬을 내어 가볍게 바람을 쐬듯이 책방마실을 다닌다고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한국 곳곳에 독립책방이 잇달아 문을 여는 모습을 이런 얼거리로 바라볼 수 있어요. 책을 꾸준히 찾아서 읽는 분은 때때로 ‘베스트셀러’도 장만해서 읽지만, 베스트셀러만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에는 ‘베스트셀러 중심 진열과 홍보’를 하기 마련입니다. 책을 꾸준히 즐겁게 읽는 분들은 여러 갈래 책을 고루 살필 뿐 아니라, 미처 몰랐던 아름다운 책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손에 쥐어서 읽을 책이니, 책방마실을 하면서 ‘낯선 여러 가지 책’을 죽 돌아보면서 그동안 알지 못한 책을 스스럼없이 새롭게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기 마련이에요.
“이 책을 읽었는데 다음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 서점이 될 수 있을까. (122쪽)
인터넷서점과 지역자본이 아닌 대형서점의 체인점 때문에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각오가 부족했을 뿐이다. (134쪽)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장만할 적에는 ‘다음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허물없이 물어볼 만한 책방지기를 만날 수 없습니다. 대형서점에서 책을 장만할 적에도 계산원이나 관리자를 붙잡고 책수다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책을 꾸준히 즐겁게 읽는 분들은 어느 한 마을에 살면서 스무 해나 마흔 해나 예순 해까지도 걸쳐서 단골로 책방마실을 할 텐데,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에서는 이 오랜 단골이 오랜 삶길에 걸쳐서 책을 마주하는 마음을 읽거나 헤아리기 어렵지요.
이 대목에서 마을책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울 만한 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을책방은 대형서점처럼 책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울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마을책방은 마을책방다운 살림을 알맞게 가꾸면서 도란도란 어우러질 수 있는 우물가나 샘가나 물가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에서는 매출과 유통과 홍보 흐름에 맞추어 책을 놓을 테지만, 마을책방에서는 마을사람 마음을 이끌 만한 책을 저마다 다르면서 재미있게 가꾸어 볼 수 있어요.
이른바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은 ‘베스트셀러 목록’을 뽑는다면, 마을책방에서는 ‘마을에서 사랑하는 책’을 그때그때 다르면서 새롭게 선봉일 만해요.
서점에서 단지 책을 사는 것뿐이라면 대형서점이 있으면 충분하다. (55쪽)
전부 베스트셀러만 진열하면 오히려 책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서점원은 잘 알고 있다.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78쪽)
마을책방에서는 책만 사지 않습니다. 마을책방에서는 책방지기하고 책손이 마을사람으로서 만납니다. 마을책방에서는 책을 징검돌로 삼아서 마을을 한껏 아름답게 가꾸거나 살찌우는 길을 즐겁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마을책방에서는 책방지기하고 책손이 이웃으로서 사귑니다. 마을책방에서는 책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마을이 늘 새롭게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활짝 웃고 어른들이 신나게 노래하는 살림을 짓는 길을 찾아보려는 마음을 나눕니다.
물건을 그저 사기만 하면 될 뿐이라면 큰 가게, 이른바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있으면 돼요. 마을가게가 있는 까닭, 마을찻집이 있는 까닭, 마을떡집이나 마을빵집이 있는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마을책방은 수많은 마을살림 가운데 하나이면서, 마을사람이 오순도순 생각을 지피는 씨앗을 얻는 책을 소담스레 갖춘 너른마당이자 열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8.24.쇠.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책을 말하는 책/책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