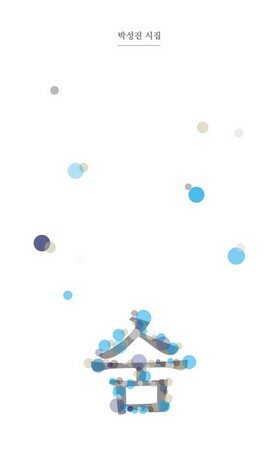-

-
숨 - 박성진 시집
박성진 지음 / 소소책방(소소문고) / 2016년 5월
평점 :

절판

시를 노래하는 말 277
직행과 완행 사이에 애닳은 숨소리
― 숨
박성진 글
소소문고 펴냄, 2016.5.1. 8000원
우리는 누구나 ‘숨’을 쉬고 삽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곧장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도 숨을 쉬지만 푸나무도 숨을 쉬어요. 푸나무도 숨을 쉬지 않으면 곧바로 ‘숨결’을 잃어요.
때때로 크게 짓는 숨인 ‘한숨’을 쉽니다. 걱정이 되어 한숨이요, 마음을 놓으며 한숨이에요. 마음이 무거운 나머지 한숨을 푹푹 쉬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한숨을 폭폭 쉬기도 해요.
그러니 ‘숨통’을 죄면 괴롭습니다. 숨통이 트이면 시원합니다. 숨통이 막혀서 고달픕니다. 숨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면서 삶을 이으려고 해요.
다른 교생은 복사하러 가고 / 담임 선생도 자리 비운 사이 / 얼른 가방 열어 아이들이 남긴 / 우유 쑤셔 넣고 / 달아오른 얼굴 식히려 / 바라본 창밖 / 때마침 흘러가는 우윳빛 구름 (농협 우유)
엄마 눈 속에 내가 있네 / 세 살 아이가 / 완성한 첫 문장 // 엄마 뺨 양손으로 잡고 / 눈을 바라보다, 한참 (첫 문장)
속초에서 교사로 일하는 박성진 님이 선보인 시집 《숨》(소소문고,2016)에 흐르는 숨소리를 헤아립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며 느낀 숨소리를 헤아리고, 어버이나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깨달은 숨소리를 헤아려 봅니다.
세 살 아이 눈에 어머니가 살아서 숨을 쉬듯이, 서른 살 마흔 살 쉰 살 예순 살 어머니 눈에서도 아이가 살아서 숨을 쉽니다. 두 사람 눈에는 서로 아름다운 숨결이 살아서 빛나요. 따사로운 사랑으로 만나는 두 사람은 싱그러운 숨을 나누면서 하루를 지어요.
급식소로 가는 길 / 종원이나 성경이 실내화를 / 비 오는 운동장에 내던졌다 / 눈 깜짝할 사이였다 // 밥 남긴 적 없는 성경이 / 씩씩거리며 몇 숟갈 뜨더니 / 못 먹겠다며 일어선다 (눈 깜짝할 사이)
숨 한 줄기는 바람이 되어 퍼집니다. 내가 오늘 마시는 숨은 네가 어제 마신 숨일 수 있습니다. 네가 어제 마신 숨은 그제 내가 마신 숨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숨 한 줄기로 작은 풀꽃이 자랄 수 있고, 작은 풀꽃이 자라며 마시는 숨 한 줄기로 내가 오늘 기쁘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숨을 미처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가는 목숨이 있습니다. 난 곳이 무덤이 되는 목숨은 두 어버이한테 뼛속까지 사무치는 아픈 숨을 남깁니다. 저도 이렇게 여린 숨결을 두 차례 나무 곁에 묻은 적 있어요. 비록 열 달을 채우지 못했어도 우리한테 찾아온 고운 숨결이라고 여겨, 우리 집 나무 곁에 고이 묻어 주면서 앞으로 새로운 목숨을 받아 태어나기를 빌었지요.
새벽 욕실 앞 / 선 채로 아이처럼 우는 / 아내를 자리에 뉘였다 // 아내의 안 / 숨이 멎은 아이는 / 난 곳이 무덤 되었다 (숨)
어머니는 감 깎으러 이장 댁에 간 시간 / 티비 보려다 할머니가 깰까 봐 멈칫한다 / 하릴없이 시집을 뒤적이다 잠바 입고 / 뒤뜰에 쭈그려 앉아 담배 피운다 (하루)
숨소리는 바람소리를 닮습니다. 바람소리는 숨소리를 닮습니다. 낮에 구름을 보면서 숨을 쉬다가, 밤에 별을 보면서 숨을 쉬다가, 우리 숨 한 줄기란 바람 한 줄기하고 똑같을 수 있겠다고 느끼곤 해요. 우리가 마시는 숨이란 ‘공기’인데, 이 공기란 ‘하늘’을 이루면서 흐르는 ‘바람’이기도 해요.
어쩌면 숨쉬기란 바람쉬기요 하늘쉬기일 수 있어요. 숨을 쉬는 동안 바람을 쉬고 하늘을 쉴는지 모릅니다. 숨을 마시는 삶이란 바람을 마시면서 바람처럼 되고, 하늘을 마시면서 하늘처럼 되는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교사 시인은 “하늘숨을 쉬는 아이들”이라는 말을 읊은 적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여느 숨이 아니라 ‘하늘숨’을 쉰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낳거나 맡거나 가르치거나 보살피는 어버이나 어른이나 교사는 모두 아이들 곁에서 ‘하늘숨’을 함께 쉰다고 했어요.
원지에서 산청 가는 직행버스 / 할아버지, 다리가 아프니 댁 가차이 / 완행으로 내려달라 하신다 / 검표인이 올라와 완행 타시라 일렀지만 / 내릴 생각 않으시고 // 옛 길 위로 난 4차선 국도 / 시원스럽게 내달릴 즈음 / 입을 연 할아버지 다시 / 아픈 다리와 옛 길 이야기 / 젊은 버스기사 결국 핏대 세운다 (직행과 완행 사이)
내가 사는 이 시집 / 가물이 든 시인의 주머니에 / 백동전 몇 잎 피어나 / 주렁주렁 열매 맺으면 (내가 사는 이 시집)
강원도 속초 시골자락에서 넌지시 깨어난 작은 시집 《숨》을 읽으면서, 전남 고흥 시골자락에서 읍내를 다녀오며 으레 타는 군내버스를 떠올립니다. 속초에서 시를 쓰는 교사인 박성진 님은 ‘직행과 완행 사이’ 이야기를 시로 그리면서 이녁이 깃든 시골자락에 놓인 길하고 얽힌 옛살림을 보여줍니다. 구불구불 작은 길이 사라지면서 뻣뻣하게 뻗은 너른 길로 바뀌는 사이, 시골 할매나 할배는 버스 한 번 타기 어렵습니다. 시골 할매나 할배한테는 직행도 완행도 그저 버스일 수 있어요. 더구나 ‘완행’이라 하더라도, 요새는 ‘한두 집만 남고 만 작은 마을’ 앞에서는 버스가 안 섭니다. 원지에서 산청 가는 버스를 탄 시골 할배는 완행을 타더라도 이녁 보금자리가 있는 마을에 서는 버스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시 한 줄에 가늘게 숨소리가 흐릅니다. 시 두 줄에 가볍게 바람소리가 흐릅니다. 시 석 줄에 곱다라니 하늘소리가 흐릅니다. 겨울비가 지나간 하늘에는 한결 싱그럽게 열린 새파란 하늘빛을 닮은 숨소리가 흐릅니다. 고흥에서는 겨울비라면 속초에서는 겨울눈이었을 테지요. 같은 하늘 밑이지만, 어느 고장에서는 더 추운 바람을 타고 눈발이 날리고, 어느 고장에서는 더 따순 바람을 타며 빗발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숨을 쉬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을 열고, 시집을 읽고, 아이들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밥을 짓고, 호미를 손에 쥡니다. 2016.12.20.불.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