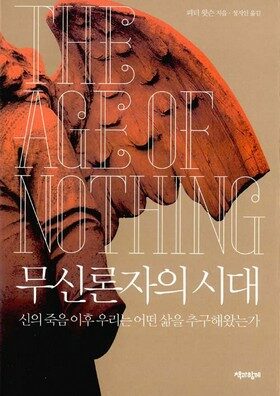-

-
무신론자의 시대 - 신의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왔는가
피터 왓슨 지음, 정지인 옮김 / 책과함께 / 2016년 5월
평점 :

절판

따뜻한 삶읽기, 인문책 169
832쪽으로 ‘간추린’ 서양 문화사 이야기
― 무신론자의 시대
피터 왓슨 글
정지인 옮김
책과함께 펴냄, 2016.5.20. 38000원
832쪽에 이르는 《무신론자의 시대》(책과함께,2016)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일이란 대단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800쪽이 넘는 두께를 헤아린다면 참으로 아득한 책읽기일 수 있는데, 막상 이 책을 손에 쥐고 보면, 서양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책을 ‘고작 832쪽’으로 간추렸구나 하고 헤아릴 만합니다.
니체의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통찰은, 어떠한 관점도 삶 자체의 외부나 삶 자체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바깥에는 그 어떤 특권적인 관점도 없고, 추상적 개념이나 힘도 없다. (43쪽)
무어는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이 그 자체만으로 가질 가치가 있는지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었다. (118쪽)
《무신론자의 시대》는 “신의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 왔는가”라는 작은이름이 달립니다. 이러한 말대로, 이 책은 서양 문명 사회에서 ‘신화 시대’가 저문 뒤 ‘문명 시대’로 접어든 뒤에,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길을 걸으려 했는가를 밝히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글이나 책으로 써서 밝힌 사상하고 철학을 차근차근 짚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사상이나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짚습니다. 전쟁 미치광이가 되는 권력자는 전쟁과 군국주의를 감추려 하면서도 자꾸자꾸 전쟁을 새롭게 벌이면서 사회를 억누르려고 하는 사상이나 철학을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대목을 짚습니다. 종교에 기대는 사상이나 철학을 다루고, 종교를 떨치려고 하는 사상이나 철학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종교는 아니라지만 피가 튀기는 세계대전 같은 싸움판에서 태어난 사상이나 철학은 무엇이요, 이러한 사상이나 철학은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는 대목을 건드립니다. 문학이 사람들 삶과 살림을 어떻게 바꾸어 주었는가를 건드리고, 문학 가운데 시는 얼마나 대단하거나 놀라운 이야기밭이 되는가를 건드려요.
지드는 개별적인 것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진실’은 예술적이든 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어떤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식과 감각이 직접적으로 가닿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0쪽)
게으르게는 상징주의자들과 생각이 잘 통한다고 느꼈다. 특히 과학이 세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하고 초월적 의미의 가능성조차 제거해버림으로써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공통된 확신이 그랬다. (212쪽)
여러모로 따진다면 《무신론자의 시대》라는 책은 ‘책으로 읽는 서양 사상·철학사’라고 할 만합니다. 책으로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 목소리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가다듬거나 키울 만한 사상이나 철학은 무엇이 될 만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만한가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상과 철학을 빚거나 펼치는가를 생각해 볼 만해요. 지난 천 년이나 이천 년에 걸쳐서 한국 사회를 가로지른 사상과 철학을 헤아릴 만하고, 2000년대인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사회를 이루거나 삶을 짓는가를 되새길 만해요.
스티븐스는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 나는 시를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리고, 논의를 위하여 시를 신이나 인간과 동등하게 보려고 합니다 …… 신들은 가장 끝까지 나아간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신들을 창조할 때 쓰는 것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343쪽)
생텍쥐페리의 이상향과 모범은 위대한 문필가나 철학자가 아니라, 전쟁 기간에 동료 조종사였던 오셰데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477쪽)
빼어난 사상가나 철학가가 남긴 책이기에 더 훌륭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시골마을 여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흙을 일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상이나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를테면 감나무나 유자나무에 열매가 더 잘 맺도록 하는 슬기도 훌륭한 사상이나 철학이 돼요. 낫질을 어떻게 해야 더 부드럽고 쉽게 잘하는가 하는 손놀림도 뛰어난 사상이나 철학이 돼요. 낫이나 부엌칼을 숫돌에 어떻게 갈아야 날이 잘 서는가 하는 살림살이도 멋진 사상이나 철학이 되겠지요.
여느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돌보는 사랑도 아름다운 사상이나 철학이 되겠지요. 서로 아끼면서 뛰노는 아이들이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마디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새롭게 배울 만한 사상이나 철학이 흐를 수 있으리라 느껴요. 왜냐하면 시 한 줄로도 사회를 바꾸거나 온누리를 흔들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시 한 줄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에 젖거나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세계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디테일들을 점점 더 정확하게 묘사함으로써 세계를 묘사한다는 의미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계에 대해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알고 내일은 그보다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기대하게 만든다. (643쪽)
우주의 상상하기도 힘든 광대함과 소립자들의 경이로운 복잡성을 마주할 때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외경심과 ‘전율에 가까운 감정적 반응’을 경험한다. (723쪽)
높다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름다운 우주’를 헤아려 봅니다. 별빛이 가득한 시골 밤하늘을 누리면서 ‘눈부신 우주’를 생각해 봅니다. 《무신론자의 시대》에서 말하듯이 “세계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몸짓도 찬찬히 돌아보고 싶어요. 돌에 ‘돌’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있고, 나무에 ‘나무’라고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있어요. 바람에 ‘바람’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있고, 하늘에 ‘하늘’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 스스로인 사람한테 ‘사람’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있지요.
참말로 이런 이름은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름에, ‘살다’라는 이름에, ‘생각’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멋진 말마디를 지은 사람들 숨결은 무엇이라고 할 만할까요?
어려운 학문이나 인문학이 아닌, 저마다 스스로 삶을 짓는 바탕이 되는 슬기로운 생각이라는 테두리에서 사상이나 철학을 마음에 담아 봅니다. 우리가 예부터 걸어온 길을 되짚고,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걸어갈 길을 꿈꾸어 봅니다. 이 문명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거듭날 아름다운 넋을 책 한 권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2016.11.7.달.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