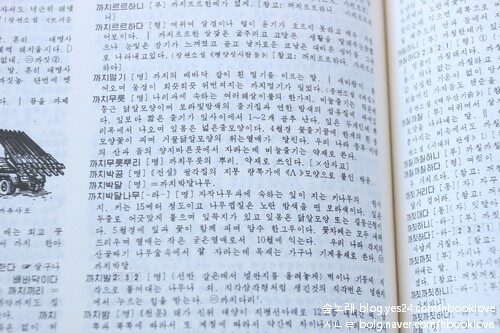말물옺 까치무릇 산자고
아이들하고 골짝마실을 하며 고즈넉한 숲을 사그락사그락 밟다가 아주 작고 하얀 꽃을 만납니다. 겨우내 떨어진 잎은 가랑잎이 되고, 이 가랑잎은 숲에 그득 떨어져서 한 걸음 내디딜 적마다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새삼스럽습니다. 꼬리잡기를 하듯이 아이들하고 천천히 거닐다가 ‘쓰러진 나무 밑’에 돋은 하얀 꽃을 오래도록 지켜보는데, 이 흰꽃을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이 언저리에서 보았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고즈넉하게 있을 수 있다면 이 흰꽃은 차츰 퍼질 만하겠지요. 삽차가 함부로 골짜기로 들어와서 냇물 바닥을 까뒤집어 시멘트로 들이붓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숲꽃은 제 보금자리를 지킬 만하겠지요.
아이들이 함께 꽃 앞에 쪼그려앉아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 꽃 뭐야? 예쁘다.” “예쁘지. 예쁘면 네가 이름을 지어 줘.” “음, 흰꽃? 아니면 별꽃?” 아이들한테 ‘예부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을 알려주기 앞서 ‘아이 나름대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대목을 생각하도록 북돋우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장이나 마을에서 우리 나름대로 새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요. 모든 꽃이름이나 풀이름은 그 고장이나 마을에서 누군가 새롭게 붙인 이름이었으니까요.
옛날에는 ‘말물옺’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고, ‘까치무릇’이라는 이름도 함께 있었다 합니다. 오늘날 남녘에서는 ‘산자고(山茨菰)’라는 이름을 ‘나라이름’으로 삼는다 하는데, 동의보감에서 ‘가채무릇’이라고도 나온다는 이 풀을 놓고, 북녘에서는 ‘까치무릇’을 ‘나라이름’으로 삼아서 쓴다고 합니다. 남녘하고 북녘이 풀이름 하나를 굳이 똑같이 써야 하지 않을 테지만, 부러 다르게 써야 하지도 않겠지요. 무엇보다 예부터 널리 쓰던 이름이 있으면 이 이름을 알뜰히 살리고 아낄 만하리라 생각합니다. 2016.4.19.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꽃과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