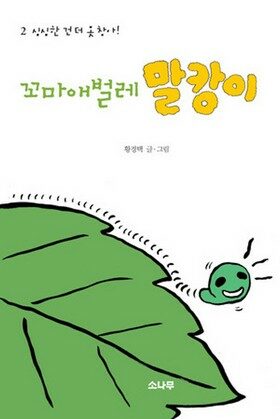-

-
꼬마애벌레 말캉이 2 - 심심한 건 더 못참아!
황경택 글.그림 / 소나무 / 2010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만화책 즐겨읽기 616
내 모습은 바로 ‘나를 낳은 엄마 모습’
― 꼬마 애벌레 말캉이 2
황경택 글·그림
소나무 펴냄, 2010.12.12. 9500원
노랑나비도 흰나비도 깨어나서 날아다니는 봄입니다. 노랑나비하고 흰나비는 고흥에서 삼월 첫머리에도 반가이 보았고, 사월에도 기쁘게 봅니다. 삼월 첫머리에 깨어난 노랑나비라면 이월부터 번데기를 틀었다는 뜻이고, 한겨울에도 애벌레로 살았다는 뜻이로구나 하고 느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겨울에도 갓이나 유채는 씩씩하게 돋습니다. 네 철 푸른 나무는 한겨울에도 짙푸른 잎을 매답니다. 이른봄에 나비로 깨어나려고 하는 애벌레로서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먹을거리가 있는 셈입니다. 모든 풀이 다 시들어서 죽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월부터 돋은 쑥에도 온갖 애벌레가 꼬물꼬물 붙어서 기어다녔어요. 어느 아이는 나비로 깨어날 애벌레일 테고, 어느 아이는 나방으로 깨어날 애벌레예요.
“똥이 더러운 거라면, 똥을 만드는 동물도 더러운 게 아닐까? 난 똥을 치워 주잖아.” “넌 먹잖아!” “내가 없다면, 이 세상엔 똥이 가득할 거야.” “설마. 그 많은 똥들을 혼자 다 먹냐?” (17쪽)
“난 밤에 짝을 찾으려고 불빛을 만들어내지.” “짝은 찾아서 뭐 하게?” “알 낳지.” “왜 다들 알을 낳으려는 걸까?” “내가 죽으면 내 대신 살아가야지.” “안 죽으면 되잖아?” “안 죽는 건 없어.” “난 안 죽어. 천재니까!” ‘저거 바보 맞네.’ (33쪽)
엊저녁에 집에서 나방 한 마리를 봅니다. 집안에서 나방을 보기는 올들어 처음입니다. 나비뿐 아니라 나방도 깨어날 때로구나 하고 느낍니다. 바깥에서는 파리도 몇 마리 날아다닙니다. 벌도 부산하고 파리도 부산해요. 저마다 새로운 숨결로 새봄을 맞이하느라 부산해요.
황경태 님이 빚은 만화책 《꼬마 애벌레 말캉이》(소나무,2010) 두 권을 읽으면서 나비하고 나방을 가만히 헤아립니다. 이 만화책에 나오는 꼬마 애벌레는 ‘뽕나무 애벌레’입니다. 마침 우리 집 뒤꼍에는 제법 큰 뽕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뽕나무 둘레에는 뽕잎을 먹는 애벌레가 꽤 많습니다. 만화책 《꼬마 애벌레 말캉이》에 나오는 주인공 애벌레는 우리 집 둘레에서 흔히 보는 숱한 애벌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해요.
“나도 엄마한테 신호 보낼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넌 안 돼.” “난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37쪽)
“우린 왜 먹어야 할까?” “낸들 아냐.” “왜 그럴까? …… 난 안 먹을래! 생명을 해치는 일, 난 안 해!” “너, 먹지?” “생각해 봤는데, 난 풀밖에 안 먹어.” “풀도 생명이야. 생명은 다 같아. 너도 나도 풀도 다 같은 생명이야.” (85∼86쪽)
두 권에 이르는 만화책 《꼬마 애벌레 말캉이》에 나오는 말캉이는 처음에는 뽕나무하고 이야기를 섞습니다. 뽕나무한테서 ‘말캉이’라는 이름을 얻은 애벌레는 나무 곁에서 나뭇잎만 먹으며 살기보다는 ‘너른 바깥누리’를 겪고 싶습니다. 씩씩하게 나무를 타고 땅바닥으로 내려서요. 다만, 하루 사이에 내려서지 못하고, 이틀에 걸쳐서 힘겹게 내려섭니다.
문득 우리 집 애벌레를 떠올립니다. 애벌레는 하루 만에 나무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하고.
애벌레는 ‘작은 벌레’라고 하는 뜻처럼 작습니다. 뽕나무 곁에서 자라는 애벌레도 참으로 작습니다. 십 미터쯤 되는 나무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오자면 한참 걸린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달팽이보다는 빨라요. 꼬물꼬물 기는 몸짓이지만 이틀까지 걸려서 땅바닥으로 내려오리라고는 느끼지 않아요. 다만, 한곳에서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때로는 ‘수많은 발’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하늘을 가르며 바닥에 톡 떨어지기도 해요. 지난해 봄에는 바람이 퍽 가볍게 불던 날씨인데에도 애벌레가 그만 땅바닥에 톡톡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네 엄마가 누군지 아는 방법!” “그, 그게 뭔데?” “네가 엄마가 되어 보면 알지!” (90쪽)
“그럼 이상한 걸 먹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스러운 걸 먹는 거야. 먹는 건 사랑스러운 거야!” (107쪽)
누군가는 이 애벌레를 징그러이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똥을 핥는 파리’를 더럽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벌레는 나뭇잎을 알맞게 갉아서 먹을 뿐 아니라, 나무꽃이나 풀꽃이 꽃가루받이를 하도록 해 줍니다. 파리가 똥을 핥기에 사람이나 짐승이 누는 똥이 흙으로 돌아가서 풀하고 나무가 새롭게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없어서 나비나 나방이 깨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매화나무도 능금나무도 배나무도 귤나무도 오얏나무도 살구나무도 복숭아나무도 …… 모두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꽃가루받이를 해야 합니다. 밤나무도 잣나무도 은행나무도 참나무도 벚나무도 사람이 하나하나 손을 써서 꽃가루받이를 해야 할 테고요. 바람도 꽃가루받이를 시켜 준다고 하지만, 크고작은 날벌레하고 풀벌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와 날벌레가 너무 늘지 않도록 새가 함께 있어야지요.
함께 사는 지구별이자 숲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보금자리이자 마을이라고 할 만해요. 그래서 작은 애벌레는 나무한테서도 삶을 배우고, 이웃 여러 벌레랑 짐승한테서도 삶을 배웁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만 스승으로 삼지 않아요. 사람도 풀이나 꽃이나 나무한테서도 배우고, 작은 벌레한테서도 배웁니다.
“아, 졸려. 근데, 뭔가 막 하고 싶다. 실 뽑기! 위로 갈 거야.” “왜 갑자기?” “나도 몰라. 그냥 뭐가 하고 싶어졌어. 본격적으로 실 뽑기를 하고 싶다.” (136∼137쪽)
“난, 암컷이었어. 엄마가 될 거야. 엄마가 나를 낳았듯 멋진. 아, 지금 내 모습은 엄마의 모습?” (165쪽)
만화책 《꼬마 애벌레 말캉이》에 나오는 애벌레는 너른 바깥누리를 돌아다닌 끝에 뽕나무한테 돌아갑니다. 바깥누리를 돌아다니면서 사귄 여러 동무한테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길을 배웠고, 다시 돌아온 뽕나무한테서 ‘꿈꾸면서 잠드는 하루’를 새삼스레 배웁니다.
이윽고 이 애벌레 말캉이는 스스로 번데기를 틀어서 깊이 잠들어요. 오랫동안 꿈나라를 헤맨 끝에 가만히 깨어나요. 날개를 단 눈부신 몸으로 일어나지요. 그러고는 어느 때에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나를 낳은 엄마처럼 엄마가 되었구나!’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우리는 저마다 즐겁고 씩씩하게 살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된 우리는 다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새로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됩니다. 작은 애벌레는 작은 애벌레답고 수많은 이웃한테서 삶을 배워서 사랑을 키웠고, 사람은 사람대로 숱한 이웃한테서 살림을 배워서 사랑을 키웁니다. 모든 목숨이 싱그러이 깨어나서 무르익는 사월을 맞이하여 힘차게 기지개를 켭니다. 새와 풀벌레가 노래하듯이, 나도 아이들하고 노래하는 살림을 꿈꿉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어린 새하고 번데기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나비와 나방처럼, 나도 날마다 껍데기를 벗고 슬기로운 어른이자 어버이로 힘차게 서자고 다짐합니다. 2016.4.1.쇠.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시골에서 만화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