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 풍경이 되다 - 대한민국 철새도래지
김성현.김진한.최순규 지음 / 자연과생태 / 2013년 12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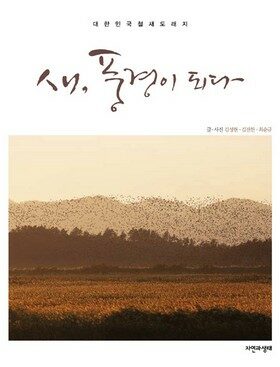
내 삶으로 삭힌 사진책 108
‘철새 쉼터’는 아름다운 우리 보금자리
― 새, 풍경이 되다
김성현·김진한·최순규 글·사진
자연과생태 펴냄, 2013.12.30. 3만 원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세 사람 김성현·김진한·최순규 세 분이 함께 빚은 책 《새, 풍경이 되다》(자연과생태,2013)를 읽으면서 놀랍니다. 새를 몹시 아끼는 마음이 사진마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장비는 나날이 발돋움하고, 요새는 디지털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필름으로만 사진을 찍던 때하고는 사뭇 다르게 오래도록 사진을 많이 찍을 만해요. 그렇다고 필름으로만 사진을 찍던 때에는 ‘새 사진을 못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름사진만 있던 때에는 필름을 다시 감고 넣어야 하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새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담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새, 풍경이 되다》는 사진 장비가 발돋움한 오늘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멋진 ‘새 도감(조류도감)’이자 ‘새 사진책’이며 ‘새 길잡이책’이 될 만하리라 생각합니다.
동검도 주변 갯벌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갯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를 볼 수 있다. (14쪽)
여름철에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번식하는 각시바위를 찾아가 보자. 단, 생명을 키워내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번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쪽)
하천의 버드나무와 갈대 숲은 작고 귀여운 새들로 소란스럽다. (30쪽)


《새, 풍경이 되다》를 보면, 한국에서 손꼽을 만한 ‘철새 쉼터(철새 도래지)’ 서른 군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새를 보기 좋은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할 테지요. 손전화로도 ‘새 모습’을 알아보기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를 사진으로 담아서 엮은 이 책은 인터넷이나 손전화로는 한눈에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이 책에는 정보만 다루지 않습니다. 새를 깊고 넓게 잘 아는 세 분이 새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면서도, 새와 사람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하는 실마리를 조곤조곤 밝힙니다. 정보에 이야기를 실어서 들려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 실은 사진은 ‘새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끕니다. 그동안 나온 여러 ‘새 사진책’을 보면 ‘멋을 부리는 사진’이라든지 ‘예술처럼 보이려는 사진’이 너무 많았는데, 《새, 풍경이 되다》는 새를 사람하고 살가운 이웃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되어 사진으로 담으면서도 새마다 어떤 결이고 무늬이며 모습인가를 똑똑히 알아볼 만하도록 잘 갈무리하고 간추려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부터 한 번 보기조차 어려운 새까지 골고루 보여주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썰미를 보여주고, 한 번 보기조차 어려운 새를 찾아서 먼 나들이를 다니는 기쁨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광릉수목원에서) 왕가의 역사뿐 아니라 나무와 숲, 새들의 역사에도 귀 기울여 보자. (37쪽)
풍요로운 갯벌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새들은 잊지 않고 송도를 찾는다. (55쪽)


철새가 내려앉아서 쉬는 곳은 철새한테 좋은 쉼터라는 뜻입니다. 철새가 내려앉아서 쉬는 곳이라면, 철새한테 아늑한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철새한테 먹이가 넉넉한 곳이요, 철새가 느긋하게 쉬면서 맞잡이한테서 몸을 지킬 만한 데라는 뜻이에요.
이는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살기에도 넉넉하고 좋으며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러할까요? 물이 지저분한 곳에 철새가 내려앉지는 않을 테지요? 먹이가 없는 곳에는 철새가 찾아가지 않을 테지요? 철새한테 먹이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물이 깨끗한 곳에 많이 살아요. 물이 깨끗한 곳이라면 사람 사는 마을도 아늑하면서 아름다울 테고, 이곳에서는 즐겁고 기쁜 살림을 지을 만한 데예요.
그러고 보면, ‘철새 쉼터’는 새한테뿐 아니라 사람한테도 고운 쉼터요 삶터가 될 만합니다. 우리가 철새가 쉴 터전을 보살피거나 지켜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아름답게 보살피거나 지킬 수 있어요.
한 해 1000톤 정도 발생하는 낙곡이 두루미류의 귀한 먹이원이 된다. 한편, 민통선 안의 저수지와 한탄강은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새들을 보호해 주는 귀한 잠자리가 된다. (99쪽)
새들의 날갯짓은 뼈가 시리도록 추운 평야의 냉기를 걷어내고 신비로운 아침을 경험하게 해 준다. (107쪽)


봄에 찾아와서 늦여름이나 첫가을에 떠나는 제비도 철새입니다. 제비 같은 철새는 그리 멀잖은 지난날까지 어디에서나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제비 한 마리가 있기에 날벌레를 무척 많이 잡아 주고, 제비가 새끼를 까면서 날벌레를 더더욱 많이 잡아 주지요. 어느 모로 보면, 암수 제비 짝꿍이 새끼를 낳아서 돌보는 한살림이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흙살림벗(농사짓기 돕는 벗)’입니다.
더군다나 제비가 둥지를 고치거나 새로 틀어서 새끼를 돌보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고운 노랫가락을 베풀어요. 새벽 네 시 언저리부터 어미 제비가 깨어나서 처마 밑에서 부산을 떠니, 시골에서는 시계가 없어도 하루를 여는 때를 잘 살필 만해요. 해가 질 무렵 어미 제비는 바깥마실(먹이 찾아서 물어다 나르는 일)을 마치고 마당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둥지에 깃들려 하지요. 그러니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쉴 때를 제비가 알려주는 셈입니다.
(천수만은) 전 세계 서식 개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가창오리가 쉬었다 가던 곳으로, 동틀 무렵이나 노을이 질 무렵 무리지어 날아오르는 군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189쪽)
한반도와 함께 태어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생명을 낳고 자연을 품은 곳. 하늘에 백두산 천지가 있다면, 땅에는 우포늪이 있다. (262쪽)


한국에서 여름을 나는 여름새인 꾀꼬리는 무척 고운 노랫소리를 들려줍니다. 매미도 메뚜기도 잠자리도 거미도 잡아먹는 꾀꼬리이지요. 따지고 보면 다른 새도 봄이나 여름에는 날벌레하고 풀벌레를 신나게 잡아먹습니다. 참새가 가을에 나락을 훑는다고 하지만, 참새도 여느 때에는 날벌레하고 풀벌레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날벌레하고 풀벌레가 없는 추운 철에는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찾지요.
그래서 새가 좋아할 만한 열매가 맺는 나무를 집 둘레에 울타리로 심거나, 숲에서 이러한 나무가 자라도록 한다면, 때로는 겨울에 모이그릇을 마련해서 집 둘레에 놓을 수 있다면, ‘흙살림벗’이 겨우내 아늑하게 겨울나기를 하면서 봄이랑 여름에 벌레잡이 노릇을 하도록 북돋울 만해요.
수많은 새는 사람 곁에서 이웃으로 지낸다고 할까요. 때로는 마당에까지 내려앉고, 때로는 지붕에도 앉으면서, 고운 노랫가락을 선물할 뿐 아니라, 나뭇잎이나 풀잎을 갉는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다만, 어떤 새이든 애벌레나 날벌레를 몽땅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벌레가 알을 낳아서 알맞게 퍼질 수 있을 만하도록 잡을 뿐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모든 벌레를 몽땅 잡아서 없애면, 새로서는 다음 먹이가 없거든요.
사람 곁에 있는 새를 살필 적에 이 같은 대목도 함께 읽어야지 싶어요. 새는 물고기를 싹 잡아먹지 않습니다. 수만 마리 새떼가 찾아든다면 물고기가 씨가 마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수만 마리 새떼가 해마다 드나들어도 물고기는 바닷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지구별을 이루는 얼거리는 늘 ‘함께 사는 살림’이에요.
197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서 흔히 관찰되던 솔개는 개발로 인해 서식지와 먹이가 감소되며 보기 어려운 새가 되었다. 낙동강 하구는 솔개를 연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287쪽)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희귀 새들이 있어 오늘도 탐조인들은 홍도로 향한다. (381쪽)


나는 전남 고흥에 있는 살림집에서 겨우내 매를 봅니다. 이 매가 어떤 매인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새매인지 개구리매인지, 아니면 조롱이 가운데 하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망원경이 없이 먼발치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들길을 달리다 보면 으레 매 한 마리가 마을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날아요. 겨울이 저물고 봄이 되면 이 매는 자취를 감추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가겠지요.
매 한 마리가 들을 가를 적에는 까치떼도 까마귀떼도 조용합니다. 때로는 까치떼나 까마귀떼가 매를 몰아내기도 한다지만, 서로 섣불리 건드리거나 다투지는 않으리라 느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매를 보면 우뚝 멈춥니다. 들마실을 하며 걷다가 가만히 섭니다. 전봇대에 앉은 매를 한참 지켜보고,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서 보려 합니다. 그러면 매는 언제나 낌새를 알아채고는 옆자리 전봇대로 옮겨 앉아서 똑똑히 살펴보지는 못해요. 딱 어느 만큼까지만 받아들여 주고, 어느 만큼을 넘어서면 가볍게 바람을 타고 저만치 가요.
남쪽에서 겨울을 나고 번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새들에게 섬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79쪽)
자맥질하는 오리들을 보며 오히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 (161쪽)


《새, 풍경이 되다》를 책꽂이에 곱게 꽂아 놓습니다. 나도 아이들도 이 책을 틈틈이 들춥니다. 우리가 이 시골집에서 으레 보는 새를 살피면서 사진을 돌아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새를 꿈꾸면서 이 책에 깃든 온갖 새를 헤아립니다.
이름이나 모습은 몰라도 고운 노랫가락으로 우리 집 둘레를 노니는 새를 떠올립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도 물까치가 뒤꼍에 찾아와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아침저녁으로 검은등뻐꾸기 소리를 들어요. 소쩍새가 우는 소리를 밤에 듣기도 하고, 딱새랑 박새가 들려주는 재미난 소리를 듣습니다.
물총새가 논도랑을 휘휘 가르면서 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전거를 달리면 즐겁습니다. 노랑할미새도 마을에서 늘 만나는데, 《새, 풍경이 되다》에 나오는 온갖 할미새를 사진으로 살피면서, 노랑할미새 말고 다른 할미새도 우리 마을에 찾아올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 봅니다. 다음에 할미새를 만나면 어떤 할미새가 더 있는가를 잘 살피려고 해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은 새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고, 새들은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401쪽)

아름다운 숲은 아름다운 새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새는 아름다운 마을 곁으로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마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루를 짓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노래가 흐르고, 아름다운 살림을 짓는 손길로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태어납니다.
철새가 찾아드는 서른 군데 쉼터뿐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에도 새들이 느긋하게 쉴 수 있기를 빌어 봅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구별 어느 곳이나 새와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빌어 봅니다. 아름다운 새를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에 담고, 때로는 사진기를 들어 ‘우리 이웃’인 새를 찍을 수 있으면 우리 삶은 한결 아름다울 만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2016.2.16.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6 - 사진책 읽는 즐거움/숲책 읽기)
* 아름다운 사진을 넉넉히 보내 주어 이 글을 곱게 빛내 준 자연과생태 출판사에
고맙다는 절을 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