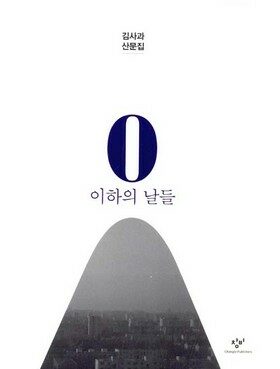-

-
0 이하의 날들
김사과 지음 / 창비 / 2016년 1월
평점 :



책읽기 삶읽기 229
‘더럽혀진 한국말’로 문학을 하는 어려움
― 0 이하의 날들
김사과 글
창비 펴냄, 2016.1.22. 14000원
소설을 쓰는 김사과 님이 선보인 산문책 《0 이하의 날들》(창비,2016)은 소설로는 풀어내기 어렵다고 여긴 이야기를 홀가분하게 풀어낸 이야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하고는 다르게 풀어내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설로는 쓸 수 없다고 여기는 이야기를 적바림하는구나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를 줄곧 따라다니던 그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도시를 불태우고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 (12쪽)
총과 술과 마약과 여자, 화가 나서 돌아버린 미국 남자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삶은 분노로 가득했다. (51쪽)
소설도 문학이고 산문도 문학입니다. 어떤 갈래로 글을 쓰든 모두 문학입니다. 다만, 소설에서는 굳이 ‘나(내 이름)’라는 사람이 민낯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산문에서는 언제나 ‘나’라는 사람이 민낯으로 드러나요. 소설에서는 내 모습이나 내 얼굴이 아닌 이웃 모습이나 이웃 얼굴을 그린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산문에서는 모든 글마다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밝힌다고 할 만합니다.
김사과 님은 산문책 《0 이하의 날들》에서 몇 가지를 자주 다룹니다. 먼저 ‘화(분노)’를 자주 다루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자주 다루며, ‘글과 말’을 자주 다루어요. 김사과 님이 이제껏 빚은 문학은 ‘화(분노)’가 바탕이었다고 이 책에서 곧잘 밝힙니다. 누구보다 글쓴이 스스로한테 성을 내고, 글쓴이를 둘러싼 터전에 성을 내며, 글쓴이가 태어난 이 나라와 사회에 성을 냅니다.
나는 빛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압도된 상태로 끝없이 빛, 한 단어를 반복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아니 나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나누고 싶었다. (72쪽)
사실 난 한 번도 상상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단지 절망 앞에서 화를 냈을 뿐, 거기에 제대로 맞설 의지를 가져 본 적이 없다. (83쪽)
한국에서 태어나 사는 사람이라면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켤 적마다 으레 ‘성을 낼’ 만하지 않으랴 싶습니다. 안타깝거나 안쓰럽거나 딱한 사건하고 사고 이야기가 그득하거든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들추지 않더라도,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한가득 누리는 사람은 그리 안 많아 보이기도 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입시지옥인 얼거리이고, 이 얼거리는 꿈쩍을 안 합니다. 대학교는 취업지옥이 되기 일쑤이고, 대학교를 마친 뒤에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공장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일하기는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영업용 웃음(감정노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웃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한 노릇입니다. 이리하여, 김사과 님이 선보이는 산문책 《0 이하의 날들》은 바로 이 같은 대목을 ‘소설가 눈높이’로서 가볍게 바라보고 글로 갈무리해서 들려줍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이어지는 외국어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실질적 권한과 힘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 한국어는 한국에서 공적인 도구로, 즉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언어로 사용된 적이 없다. (105쪽)
소설가가 되는 과정에서 나는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이, 의도적으로 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백지 상태에서부터 쌓아올렸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한국어가 싫었기 때문이다. 내 한국어가 어설픈 번역 어투와 고루한 일본식 한자들, 그리고 논술식 글쓰기에 의해 더럽혀져 있다고 느꼈다. (148쪽)
문학을 하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김사과 님은 이녁 산문책에서 ‘글쓰기’나 ‘문학하기’를 둘러싸고 ‘한국말’이란 무엇인가 하는 대목을 찬찬히 돌아봅니다.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말은 여태 한 번도 ‘공적인 도구’, 그러니까 ‘공공 언어’로 쓰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없이 옳습니다. 한국은 ‘한국말’을 쓰는 나라입니다만, 한국 정치나 사회를 살피면 지난날에는 중국말을 썼고, 개화기를 지나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일본말을 썼어요. 해방 뒤에는 ‘일본 한자말’하고 ‘중국 한자말’이 뒤섞인 ‘국한문혼용’ 말투였는데, 토씨만 한글인 말투였어요. 겨우 ‘한글 쓰기’가 자리를 잡을 즈음 영어가 무시무시한 바람을 타고 찾아왔지요. 게다가 수없이 바뀌는 입시제도에 맞추어 ‘논술 글쓰기’가 태어나기까지 하니 ‘말다운 말’은 자리를 못 잡습니다. 한국사람 스스로 ‘한국말다운 한국말’을 쓰기란, 오히려 더 어려운 모습이 돼요.
그러니, 김사과 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마따나, ‘더럽혀진 한국말’로 문학을 하는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만합니다. 참말로 한국말이란 무엇일까요? 일본 한자말도, 번역 말투도, 일본 번역 말투도, 영어도, 대놓고 쓰는 일본말도, 중국 한자말도, 한문 번역 말투도, …… 이런 자질구레한 모든 것을 신나게 버무리는 말이 바로 ‘한국말’일까요?
10대 후반의 고등학교 중퇴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뻔했다. 뻔한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다. 시간당 천오백 원을 받고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하며 돈까스집에서 일하기도 했다. (197쪽)
까페로 들어선 순간 문 밖의 변두리 동네적 요소들과 완벽하게 격리된다. 이제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쾌적한 온도의 실내, 향긋한 커피 냄새와, 여유롭게 배치된 의자와 탁자들, 깔끔한 옷차림의 사람들, 적절한 음량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이다. (237쪽)
고등학교를 그만두며 지냈다는 김사과 님은 이제 ‘시급 천오백 원’을 받으면서 ‘돈까스집에서 성희롱까지 받는’ 일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변두리 동네’에 나들이를 가더라도 스타벅스를 마음 놓고 드나들 만한 살림이 됩니다. 산문책 《0 이하의 날들》은 첫머리로 미국 어느 도시에서 지낸 이야기를 쓰고, 곳곳에 여러 나라를 여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교 중퇴 알바생’에서 ‘세계여행을 하는 소설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탈바꿈한 삶에서 김사과 님은 ‘성내는 삶’이 사라졌다고 할 만할까요? 산문책 《0 이하의 날들》을 읽는 내내 헤아리니, 김사과 님은 아직 ‘성내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김사과 님은 “한 번도 상상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83쪽)” 하고 밝힙니다. “절망 앞에서 화를 냈을 뿐(83쪽)”이라고 덧붙여요. 산문책 마지막 줄까지 ‘상상’을 펼치는 삶이나 이야기는 흐르지 않고 ‘절망에 화를 내는’ 삶이나 이야기만 흐릅니다.
소설가 한 사람 힘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기에 ‘상상’이 아닌 ‘성·화·분노’만 마음에 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이든 화이든 분노이든, 이러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문학을 빚을 수 있습니다. 성을 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나 얼거리인 한국 사회이기에 성을 내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나 사회에 성을 낸다면, 아직까지 아름다움도 사랑스러움도 기쁨도 이 나라나 사회에 깃들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참다운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기쁨이 싹이 터서 자랄 수 있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비록 ‘더럽혀진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이 한국말을 갈고닦으면서 바로 이곳 이 삶자리에 아름다운 노래와 사랑스러운 웃음과 기쁜 꿈이 자랄 수 있기를 빕니다. 4349.2.2.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6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