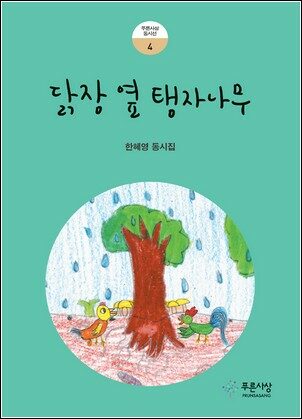-

-
닭장 옆 탱자나무 - 한혜영 동시집 ㅣ 푸른사상 동시선 4
한혜영 지음 / 푸른사상 / 2012년 3월
평점 :



시를 사랑하는 시 77
할머니가 아이한테 들려주는 조촐한 노래
― 닭장 옆 탱자나무
한혜영 글
푸른사상 펴냄, 2012.3.25. 9000원
할머니 한혜영 님은 동시도 쓰고 동화도 씁니다. 이러한 글은 어린이문학을 하려는 글이기 앞서 이녁 손주한테 들려주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이녁 손주가 스스로 손에 쥘 첫째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서 들려주려는 이야기예요.
동시를 쓰는 할머니는 이녁 손주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동시를 쓰는 할머니는 이녁 손주를 낳아서 돌보는 이녁 딸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한테 어떤 이야기를 물려주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사랑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싶을 테지요? 무엇보다 사랑을 차근차근 물려주고 싶을 테지요?
옛날부터 내려오고 옛적부터 흘러온 이야기는 모두 어버이가 아이한테 들려주려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녁 손주한테 물려주고픈 가장 슬기롭고 따사로운 사랑이리라 생각합니다.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름값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짓는 사랑을 물려주고 싶으리라 생각해요.
바람 한 차례 옥상으로 불어오자 / 블라우스와 와이셔츠 / 큰 빨래들은 / 어미 두루미처럼 날개를 활짝 펼쳤다. (빨래)
늦잠 자는 / 씨앗은 일어나라고 // 은지팡이로 / 토독! / 톡! / 톡톡! // 두들기며 비 옵니다 (봄비)
아침에 잠을 깨는 아이들은 언제나 빙긋빙긋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옵니다. 저녁에 잠들기까지 이 아이들은 언제나 내 둘레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한테 달라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놀자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움직이자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몸짓을 지켜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말씨를 헤아립니다.
빙긋빙긋 웃는 아이한테 나도 웃음을 짓습니다. 방긋방긋 웃으며 놀자 하는 아이들한테 나도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한 가지는 언제나 놀이입니다. 다만 억지스럽거나 고단한 놀이는 아닙니다. 학습 놀이나 체험 놀이를 바라지 않습니다. 교육 놀이라든지 사회 놀이를 바라지 않아요.
아이들은 늘 따사로운 사랑으로 놀자고 웃음으로 말을 겁니다. 아이들은 늘 즐거운 사랑으로 놀자면서 노래하듯이 말을 해요. 이때에 어버이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저 그대로 놀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바쁘거나 다른 할 일이 있다면서 같이 안 놀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이는 / 이제 막 한글을 배우는 / 꼬맹이의 삐뚤빼뚤한 / 이름을 받아 적는 종이다. (종이)
곰이랑 사자가 사람을 만났을 때 / 발톱부터 세우는 건 말이 안 통해서 그럴 거다 // 영어, 일어, 불어, 한문 학원 같은 / 간판 사이에 동물의 말을 가르쳐준다는 / 간판도 하나쯤 끼어 있으면 (이런 학원 어디에 없나요?)
동시집 《닭장 옆 탱자나무》에 흐르는 이야기는 두 갈래로 살필 만합니다. 첫째는 할머니가 아이한테 들려주는 포근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아이가 집이나 마을이나 학교 안팎에서 겪거나 부대끼는 삶을 놓고 사랑으로 마주하자고 손짓하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불어 빨래를 날리고, 비가 내리며 새싹이 자라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새하얀 종이에 글씨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해님이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져요. 벌이나 나비가 집이나 교실로 들어왔다가 나가지요. 이를 모두 포근한 사랑이라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아이한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으면, 아이는 제 이웃하고 동무를 따사로우면서 너그러운 몸짓으로 맞아들이는 슬기를 배워요.
학원으로 바쁘거나 공부로 힘들다면, 바쁘거나 힘든 아이들을 북돋울 만한 이야기를 짓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너른 지구별을, 가없는 우주를 고이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생각을 여는 이야기를 짓습니다.
강이 아프단다. / 암처럼 딱딱한 / 시멘트 덩어리가 / 가슴께서 만져진단다. (아픈 강)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는 거야 / 안 그러면 제가 찾아온 걸 아무도 모르잖아 (바람은 소리를 좋아해)
찬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아이들을 이끌고 들길을 걸어 봅니다. 한겨울이기에 찬바람을 함께 맞으면서 겨울이란 어떤 철인가 하는 대목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바람이 차니 아이들이 봄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볕이 포근한 한겨울에 아이들하고 마당에서 달리면서 함께 땀을 흘립니다. 바람이 안 불어 포근한 날씨이니 아이들은 겨울이 왜 이리 덥냐고 묻습니다.
별빛으로 가득한 한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에 서서 별바라기를 하다가 서로 손을 맞잡고 삼십 분 남짓 밤마실을 합니다. 아버지 손을 꼬옥 잡고 별바라기 밤마실을 하는 동안 풀섶에서 마른 잎을 헤치는 들쥐 소리를 듣고, 족제비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멧비둘기가 자다가 우리 발자국을 듣고 깜짝 놀라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손을 꼬옥 잡고 걷는 아버지가 있어서 밤소리를 들으면서도 재미나게 놀 수 있습니다.
손가락 까딱하는 것까지도 따라하는 / 그림자 때문에 / 청년은 결국 도둑질을 포기했대요 // 제 그림자가 빤히 지켜보는데 /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서운 그림자)
할머니는 조촐하게 이야기를 엮어서 동시집 《닭장 옆 탱자나무》에 담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다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집에 담습니다. 그림자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대목을 넌지시 알려주려고 동시를 살그마니 씁니다. 벌레 한 마리도 무척 아름다운 목숨일 뿐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는 우리랑 똑같은 이웃이라는 대목을 동시로 가만히 보여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그림자는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대목을 일깨우면서 아이들 스스로 씩씩하고 의젓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속삭여요.
곰곰이 돌아보면 먼먼 옛날부터 온누리 모든 어버이는 저마다 시인이 되어 아이들한테 사랑을 노래해 주었으리라 봅니다. 문단에 오르거나 시집을 내놓았기에 시인이 아니라, 어버이 자리는 언제나 삶을 노래하는 자리이지 싶어요.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도록 북돋우는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시인입니다.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사랑을 가슴으로 가다듬어 속삭이기에 시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놀도록 북돋우고, 언제나 아이들하고 손을 맞잡으며 함박웃음으로 놀 수 있기에 시인입니다.
“그 벌 죽이지 말고 살려서 보내줘라 / 누구의 아버지일지도 모르지 않니?” // 공책을 말아들고, 불끈! 솟구쳤던 팔뚝이 스르르 떨어졌다 (‘아버지’라는 말)
오늘도 새 하루를 맞이하기 앞서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어 봅니다. 어제하고는 다른 새로운 아침에 아이들하고 무엇을 하며 놀는지,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를 보여줄는지, 이 아이들하고 누리는 살림은 어떤 사랑으로 새롭게 피어날 만한지를 새벽녘에 고요히 헤아립니다. 나도 늘 노래(동시) 한 가락을 마음자리에 두면서 조촐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침을 맞이해야겠습니다. 4349.1.13.물.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6 - 시골에서 시읽기/동시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