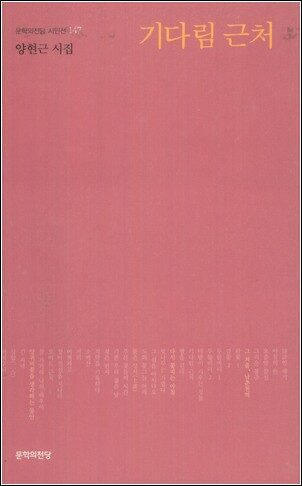-

-
기다림 근처
양현근 지음 / 문학의전당 / 2013년 1월
평점 :



시를 말하는 시 110
시와 밤낮
― 기다림 근처
양현근 글
문학의전당 펴냄, 2013.1.15. 8000원
밤에 잠자리에서 아이가 ‘밤이 무서워서 싫다’고 말합니다. ‘밝고 환한 곳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본 만화나 영화에서는 밤을 으레 무섭거나 무시무시하게 그리곤 합니다. 만화나 책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어른들은 밤을 무섭거나 무시무시하다는 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나도 어릴 적에 우리 아이하고 거의 똑같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릴 적에 나한테 밤이 안 무섭거나 안 무시무시한 까닭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어린 나한테 밤이란 무엇인가를 슬기롭고 똑똑히 알려준 어른이 있을는지 모르나, 그무렵 내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을 수 있습니다.
붉은 줄무늬넥타이가 목을 휘감는다 오늘도 나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사막의 낙타, 암소의 눈망울처럼 순한 色의 아침은 없다 혼자 아무렇게나 붉어져도 좋을 버찌의 하루는 없나 (아침의 色)
내게 그리움이란 고작 담배를 꼬나물고 / 입안에 고인 말을 허공에 잠시 적어두는 일 / 봄볕에 젖은 오후를 끌어와 펼쳐보는 일 (감꽃 2)
양현근 님이 빚은 시집 《기다림 근처》(문학의전당,2013)를 읽습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읍내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군내버스에서 읽습니다. 두 아이는 한 주에 한 번쯤, 또는 열흘에 한 번쯤 군내버스를 탑니다. 읍내에 자주 드나들 일이 없으니 드물게 버스를 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탈거리를 한 달에 대여섯 번쯤 타는 셈입니다.
모처럼 타는 버스이기에 작은아이는 몹시 신납니다. 큰아이도 버스 타기를 좋아합니다. 다만, 큰아이는 버스를 타기 무섭게 코를 감싸쥡니다. 버스에서 나는 냄새가 고약하다고 말해요. 참말 모든 버스이며 자동차이며 택시이며 짐차이며 다들 냄새가 있어요. 플라스틱이랑 쇠붙이로 만들고 기름(석유)을 태우면서 달리니까, 또 아스팔트 찻길을 달리면서 고무바퀴가 닳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섞인 냄새가 있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니 나도 이 아이를 맞이하기 앞서 ‘버스 냄새’를 느꼈어요. 나도 어릴 적에 버스만 탔다 하면 속이 메스껍거나 울렁거렸어요. 우리 아이라고 해서 다를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어릴 적에 ‘버스 울렁거림’을 제대로 밝히거나 알려준 어른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조차 버스 울렁거림 때문에 버스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이마를 한손으로 짚으면서 끙끙거리셨어요.
뒤엉킨 바람을 끊어내며 달리는 국도 / 삐-삐 과속하지 말라는 경고음이 울리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었다 / 굽은 길에서는 점점 더 바깥으로 밀린다 (오이도 근처)
폭탄주 몇 잔에 밤길을 오락가락하다가 / 새로 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캄캄하다 /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좀 받아라 (잘 가거라 나의 배후여)
시집 《기다림 근처》는 회사원으로 무척 오랜 나날을 보내야 하면서도 이 회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날을 기다리는 어느 한 삶 삶을 차분히 들려줍니다. 스스로 굴레라고 여기면서도 이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이야기가 조용히 흐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면서 빠르기를 줄이지 않는 모습을 그냥 스스럼없이 시 한 줄로 적습니다. 늘 건물 안쪽에만 머물다가 모처럼 마주한 봄꽃하고 봄볕 이야기를 가만히 시 두 줄로 적습니다. 집에서 신문을 읽으며 투덜거릴 적에 이녁 곁님이 집일을 좀 거들라며 메추리알을 까라고 내민 그릇을 마주한 이야기를 넌지시 시 석 줄로 적습니다.
참말 시는 여느 삶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대단한 생각을 머릿속으로 굴리고 굴려야 쓰는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마다 여느 삶자리에서 부대끼거나 겪거나 마주한 이야기는 모두 아름다운 시 하나로 다시 태어납니다.
뒤죽박죽인 뉴스를 보는데 아내가 신문을 휙 걷어내며 답도 없는 것에 머리 아파하지 말고 메추리알이나 까달라고 놓고 간다 속이 패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슬쩍 힌트를 던진다 (메추리알 쉽게 까는 법)
봉헌성가를 부르면서 모두 한 목소리로 집중하는데 / 한 신도 등에 업힌 어린 양의 칭얼대는 소리 / 잉잉-어-잉 / 후렴 한번 명징하다 (말씀)
잠자리에서 큰아이한테 밤이랑 낮이 무엇인가 하는 대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벼리야, 꽃도 풀도 나무도 모두 밤에 잠을 자. 잠을 자지 않으면 꽃도 풀도 나무도 튼튼하게 살지 못해. 너희도 밤에 잠을 자야, 새롭게 기운을 얻어서 아침에 신나게 뛰놀 수 있어. 환한 낮만 있으면 모든 목숨이 괴로워서 죽고 말아. 해님이 하루 내내 비춘다고 하면 그야말로 모두 타죽거나 말라죽어 버리지. 그렇다고 밤만 있어야 하지 않아. 낮만 있어야 하지도 않아. 밤하고 낮은 사이좋게 어울려야 해. 잠을 잘 적에는 아주 새까맣게 어두워야 해. 그래야 잘 자거든. 잘 적에는 모두 잊고 꿈나라로 가서 새롭게 놀면서 우리 몸에 기운을 되찾도록 해 주고, 아침에 밝은 햇살을 보며 일어날 적에는 기쁘게 웃으면 돼. 밤낮은 늘 함께 있는 동무이고, 낮은 신나는 몸짓이고, 밤은 고요한 숨결이 잔잔히 물결치는 때이고, 씨앗이 캄캄한 흙에서 태어나듯이 밤이 있어야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 그러니까, 밤은 꿈이고 낮은 삶이야.
내 생의 팔 할은 서류 뭉치 속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종일 붙잡힌 책상머리 주변에는 / 슬프도록 끝이 잘 깎인 연필이며 잡다한 서류와 / 층을 이루고 있는 계간지가 겉봉도 뜯지 못한 채 / 한 계절을 넘기고 있습니다 (고백)
읍내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군내버스에서 시집을 살며시 덮고 큰아이를 가만히 안습니다. 이러면서 새롭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벼리야, 네 아버지도 얼마 앞서까지 버스 울렁거림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 그런데 말이야, 버스를 타면서 버스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이 냄새 때문에 못 살아. 냄새가 나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즐겁게 누릴 놀이를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꿀 꿈을 생각하면, 냄새는 어느새 잊히고 우리 꿈과 사랑만 마음속에 남지. 정 냄새를 못 견디겠으면 겨울이니까 창문을 살짝 열면 되지. 그리고 네 마음속에 오늘 무엇을 하며 놀까 하는 생각을 심어 봐. 그러면 돼.
집에 닿아 시집을 마저 읽습니다. 다 읽은 시집을 덮으며 새삼스레 어린 날을 그려 봅니다. 내 어릴 적에 나한테 이야기를 찬찬히 들려준 어른은 없었지만, 어느덧 나는 새로운 어른이 되었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바로 나부터 이곳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주는 삶을 일구자고 생각합니다.
굴레는 남이 만들어서 나한테 씌우지 않습니다. 모든 굴레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 목에 씌웁니다. 시집 《기다림 근처》를 쓴 양현근 님은 머잖아 양현근 님 스스로 마음자리에 심은 꿈씨 같은 싯말에 따라서 새로운 삶길로 나아갈 테지요. 우리 삶과 꿈을 이루는 고운 밤낮을 새삼스레 돌아봅니다. 4349.1.9.흙.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6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