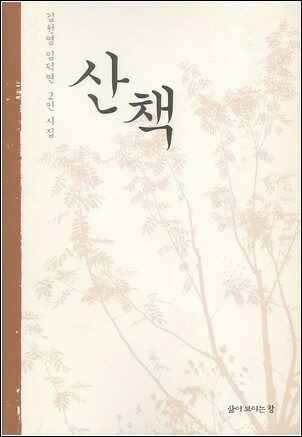-

-
산책 - 김천영 임덕연 2인 시집
김천영.임덕연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7년 7월
평점 :

품절

시를 노래하는 시 105
함께 나들이를 다니는 기쁨 누리기
― 산책
김천영·임덕연 글
삶이보이는창 펴냄, 2007.7.10. 7000원
혼자 살던 때에는 혼자 가볍게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혼자이기에 두 다리로 걷기 마련이었고, 자전거로도 달렸으며, 버스를 가끔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들이를 다니다 보면 애써 버스를 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달리며 무척 시원했고, 웬만하면 찬찬히 둘레를 살피며 걷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들이라면, 또 마실이라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씩씩하게 이 땅을 밟아야 하는구나 싶어요.
곁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는 혼자 나들이를 하는 일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굳이 혼자 나들이를 해야 할 까닭이 없기도 하고, 어쩌다가 혼자 바깥일을 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곁이 허전합니다. 좋은 길이건 궂은 길이건 이 길에 온 식구가 함께 있으면서 삶을 누릴 적에 비로소 즐거운 노릇이네 하고 새삼스레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서울 같은 곳으로 바깥일을 보러 나올 때가 아니라면 으레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나들이를 하거나, 함께 논둑길을 달리면서 나들이를 하거나, 때때로 시골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들은 산책 가잔 말을 했다. 어린 애가 산책이란 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신기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저도 답답한 아파트가 싫은 것이다. (산책 1)
난생 처음 텃밭을 맨발로 밟아 본다. 흙의 기운이 발밑에서 머리로 올라 정신이 다 맑아진다. (텃밭 가꾸기 1)
교사이면서 시를 쓰는 어른인 김천영 님과 임덕연 님이 빚은 시집 《산책》(삶이보이는창,2007)을 찬찬히 읽습니다. 책이름에 붙은 말처럼 가볍게 나들이를 하듯이 시를 읽습니다. 어린 아들하고 홀가분하게 나들이를 다니던 어버이 넋을 돌아보면서 시를 읽습니다.
시집 《산책》을 내놓은 두 어른은 교사이지만 ‘교사가 되는 길’을 걸으면서 ‘텃밭 일구기’라든지 ‘흙 밟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까닭이 교육대학교 같은 곳에서 교육과정 수업진도는 있을 터이나, ‘흙을 만지는 교육과정’은 없을 테니까요. 대학교에 있는 교수 가운데 대학생한테 ‘밭일 좀 해 보렴’이라든지 ‘맨발로 흙 좀 밟아 보렴’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느껴요.
아내는 왜 아파트는 안 되냐고 했다. 나는 꽃을 보고 싶다고 했다. // 아내는 화분에 꽃을 심으면 된다고 했다. 나는 땅에 나무를 심고 싶다고 했다. (나의 소망)
꽃은 꽃그릇에 심어 마루나 방 한쪽에 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집안에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나 꽃이나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적에 비로소 풀답고 꽃다우며 나무답습니다. 하늘을 우러르고 바람을 마시며 빗물하고 눈송이하고 동무할 수 있을 적에 풀도 꽃도 나무도 싱그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할까요? 사람은 어느 때에 사람다운 삶을 누릴까요? 우리는 어떤 터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짓는 사람으로 지낼 때에 비로소 맑거나 밝거나 곱거나 사랑스러운 숨결이 될 만할까요?
아이들이 돌아갔다. / 돌아간 자리마다 돌미나리 냄새가 났다. / 늦은 햇볕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왔다. / 나는 새삼스레 내 나이를 가늠했다. (마흔, 교실에서)
― 아빠 그런데 옛날에는 껌 씹다가 벽에 붙여 놓았다가 씹고 또 씹고 그랬어? / ― 그럼, 그런데 느이 작은아버지가 어느새 그 껌을 몰래 떼어 먹어 싸우기도 했지. (상주 남장사 가는 길 돌장승)
아이들한테서 돌미나리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어른들한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내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요? 그대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한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요?
꽃내음이 나는가요, 풀내음이 나는가요? 숲내음이나 바다내음이나 흙내음이 나는가요? 아니면, 쇳내음이나 돈내음이 나는가요? 플라스틱이나 석유에서 흐르는 내음이 우리 몸에서 나는가요?
사랑스러운 내음이 날까요? 곱거나 푸른 꿈 같은 내음이 날까요? 해님 같은 내음이나 달님 같은 내음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움이나 시샘이나 짜증 같은 내음이 날까요? 윽박지르는 내음이나 바보스러운 내음이나 어리석은 내음이나 그악스러운 내음이 나지는 않나요?
한 세상 / 더도 말고 / 시만 쓰면서 살 수 있을 거라 / 믿었는데 / 시도 못 쓰고 / 시골만 내려와서 / 개울물이랑 이야기가 길어졌다. (시골 밥)
시골로 살러 와 / 솥단지며 농을 풀어 놓은 곳이 / 범실이다, 아랫범실이다. (호랑이굴을 찾아)
숲길을 걷는 사람은 숲을 가슴으로 품습니다. 들길을 걷는 사람은 들을 가슴으로 담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걷는 사람은 바다를 가슴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찻길을 걷는 사람은 자동차에서 퍼지는 숨결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테고, 골목길을 걷는 사람은 골목에서 흐르는 숨결을 가슴으로 안겠지요.
시집 《산책》을 함께 쓴 두 사람은 도시 아닌 시골에서 조용히 삶을 짓고 살림을 가꾸면서 노래를 짓고 싶습니다. 시를 쓰고 삶을 노래하려는 두 사람은 아이들이 싱그러운 눈짓으로 흙을 밟고 이 땅을 누비면서 온누리에 고운 사랑을 퍼뜨리는 튼튼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지 싶습니다.
함께 걸어요. 두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말고 홀가분하게 함께 걸어요. 맨몸으로 가볍게 걸어요. 풀을 느끼고 흙과 나무를 느끼면서 걸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을 살피면서 걸어요.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걸어요. 바람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바람이 우리더러 기쁘게 이 길에 서서 어깨동무하며 놀자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4348.12.10.나무.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5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