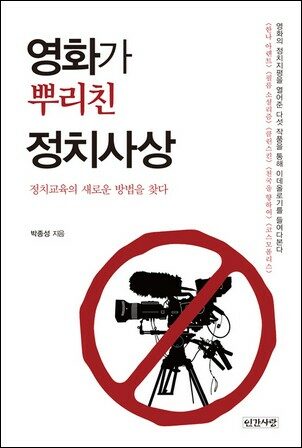-

-
영화가 뿌리친 정치사상 - 정치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찾다
박종성 지음 / 인간사랑 / 2015년 10월
평점 :



책읽기 삶읽기 217
정치사상을 뿌리치는 영화가 가는 길이란
― 영화가 뿌리친 정치사상
박종성 글
인간사랑 펴냄, 2015.10.30. 2만 원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볼 생각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일 때에 비로소 나도 이 영화를 봐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이면서 아름다운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를 보려고 한밤에 잠을 쫓아야 하는데,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비로소 밤에 영화를 보노라면 이튿날 아침에 잠이 모자라서 허덕이기 일쑤입니다.
모든 영화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찍어야 한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영화를 가만히 돌아보면 ‘아이하고 어른이 함께 볼 만한 영화’는 뜻밖에 그리 안 많구나 싶습니다. ‘어른끼리만 볼 만한 영화’가 무척 많으며, ‘아이하고 함께 보도록 하는 영화’는 좀처럼 나오지 못하지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한자리에서 모여 앉아서 함께 마음을 달래거나 적실 만한 영화가 드물다고 할까요.
영화는 사람을 움직인다. 때로는 눈물과 웃음으로 사로잡고 행위의 미래마저 단호히 이끈다. 덕분에 영화는 즐거움의 방편이거나 교육의 도구이며 정치수단까지 되었다. (19쪽)
사람들은 자꾸 잊는다. 생각보다 복잡한 영화의 역할을. 그것이 역사의 전달수단이자 정치의 교화도구이며 대표적인 사회교육 매체이자 국가의 문화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예술지표인 것을. (25쪽)
박종성 님이 쓴 《영화가 뿌리친 정치사상》(인간사랑,2015)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합니다. 박종성 님은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영화에 깃든 정치’가 무엇인가를 찬찬히 짚으려 합니다. 영화는 예술이 되기도 하고 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정치를 사람들한테 입히거나 씌우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그저 재미 삼아서 영화를 볼는지 모르나, 영화마다 사람들을 어느 한쪽으로 넌지시 이끌려고 하는 속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가 ‘정치를 따돌리는 몸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세상의 어느 영화도 마르크스의 삶에 주목했다든지, 적어도 아시아 필름이 모택동이나 전봉준 같은 존재에 깊은 애정을 퍼부었다는 얘길 들어 본 적이 없다. 기껏해야 인물 좋고 대중적 인기를 동원했던 체 게바라 정도였다. (43쪽)
가장 뜨겁던 시절을, 그것도 야유와 조롱으로 유난스레 넘쳐나던 시기에 극단의 사례를 마무리하는 감독의 마음 역시 복잡하였을 것이다. 그것도 하필 확신에 가득 찬 자기변론이나 새로운 이론의 등장을 암시하기보다 작품을 관통한 악의 논리와 그 평범성을 갈무리해야 할 대목에서 무엇을 따로 강조할 수 있었으랴. (89쪽)
가만히 보면, 천만 사람이 보았다느니, 오백만 사람이 보았다느니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영화가 여럿 있습니다.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았다고 하는 영화가 꽤 있습니다. 이와 달리 거의 눈길을 못 받는 영화가 있고,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서 살짝살짝 눈길을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화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꼭 보아야 하지는 않는다고 느낍니다. 아주 훌륭한 영화이기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보고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삶을 짓는 사람들은 다 다른 영화를 즐기면서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사랑할 때에 아름다우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우면서 재미난 영화일 때에는 이 영화를 두고두고 다시 봅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그래요. 본 영화이지만 다시 보고 싶다고 해서 디브이디를 다시 돌리고 또 돌립니다. 여덟 살 큰아이는 어느 영화를 벌써 백 번이 넘게 보기도 합니다. 보고 다시 보고 새로 보아도 언제나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샘솟으니 자꾸자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보고 싶다’고 말하는 영화는 으레 ‘어른인 나도 즐겁게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영화 한 편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북돋우는 밑거름 같다고 느껴요.
고다르의 출구 찾기도 뜬금없는 인종주의나 은근한 반미주의로 기우는 건 영화적 무능의 면피용 핑계일까. 아니면 소외와 무력감에 젖어 있는 집단적 자화상을 가리기 위해서일까. (115쪽)
정치적 이익을 한껏 채우고도 또 다른 반대급부를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고 이를 왜곡·확장하면서 국가 내부의 분노와 증오 혹은 충성심을 자극하는 건 오랜 여론조작을 위해 사용해 온 술책 가운데 하나다. (150쪽)
《영화가 뿌리친 정치사상》은 ‘정치 이야기를 드러내는 영화’ 몇 가지를 놓고서, 우리 사회와 정치를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맞물려 놓습니다. 민주란 무엇인지, 독재란 무엇인지, 평화란 무엇인지, 전쟁이란 무엇인지, 영화 하나를 앞에 놓고서 이 대목을 곰곰이 짚으려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걸어온 길을 짚는 영화에서도 틀림없이 ‘정치란 무엇인가’ 같은 대목을 건드립니다. 셸키를 다루는 만화영화에는 따로 ‘정치란 무엇인가’ 같은 대목을 건드리지 않지만, 이 같은 만화영화는 삶과 사랑과 사람이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가를 밝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로 ‘정치를 새롭게 읽는 슬기’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들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다르 영화에서도 정치를 어떻게 볼 만한가를 헤아릴 수 있고, 메리 포핀스가 나오는 영화에서도 아이들이 어버이와 어우러지는 삶을 살피면서 정치가 여느 살림집에 어떻게 스며드는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면 어른들은 정치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다고 느낄 만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길로 간다면 어려울 일이 없지만 참말 이러한 대목을 헤아리려는 어른이 드물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감독은 끝내 자폭 순간을 스크린으로 끌어내지 않는다. 액션도 딕션도 아닌 단순한 기다림으로 자이드의 결행 의지와 거사의 순간을 대체한다. 그것만으로도 긴장하는 관객과 자이드 자신을 달래는 일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184쪽)
관객에게 길을 물어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그대로 놔둔들 그 다툼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사태의 방임도 따지고 보면 감독의 계략이다. 분명한 건 상상의 남은 몫이 관객들 것이 된다는 점이다. (217쪽)
매트릭스 같은 영화는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할 만할까요? 더 놀라운 액션이 나와야 볼 만한 영화가 될까요? 아무런 액션이 없이도 사람들 가슴을 울리거나 머리를 건드리거나 마음을 바꿀 만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영화에 나오는 여러 액션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화에서 액션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치고 박고 맞물리는 몸짓 사이에 숨은 이야기를 읽을 때에 영화가 즐거울까요? 영화에는 왜 사람들이 치고 박고 다투는 이야기가 자주 나올까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모습이 굳이 영화에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서로 다투어야 밥그릇을 지키거나 챙길 수 있을까요?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고, 전쟁무기가 아닌 살림살이를 북돋우는 길로 가면서 영화를 찍는다면 영화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실어서 보여줄 만할까요? 더 놀라운 액션을 찍으려고 하는 영화는 사람들을 어떻게 길들일까요?
오래도록 머무는 ‘울림’은 반드시 종교적일 필요도 없고 난삽하기만 한 추상의 메시지도 아니란 자각은 아렌트가 영화로 일깨워 준 또 다른 ‘놀라움’이다. 악마도 곁에 두면 한없이 익숙해지고 천사의 자유로움마저 시늉하게 만드는 아둔한 나날들 역시 모두의 ‘부끄러움’이다. (226쪽)
아름다움을 그리려 하기에 영화에 아름다움을 살포시 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아닌 어떤 정치 목적을 담으려 하기에 영화에 아름다움이 아닌 정치 목적이 깃듭니다.
역사 교과서를 정부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사회에서는 영화도 이러한 흐름을 타기 마련이고, 이러한 흐름을 타고 싶지 않아서 정치권력하고 맞서는 영화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권력은 언론도 교과서도 영화도 거머쥐려고 애쓸 뿐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서 언론이나 교과서나 영화를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정치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삶을 누리는 기쁨’을 영화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지요.
어떤 영화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삶하고 등돌린 채 오로지 예술이나 상업으로만 흐르는 영화는 짐짓 ‘정치 목적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영화는 ‘무서운 정치 목적이 숨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나팔수가 되고 마는 영화가 있고, 사람들한테 꿈과 사랑을 새롭게 비추어 보이려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어떤 영화를 즐길 때에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고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영화를 보아야 할는지요, 아니면 ‘내 삶을 기쁘게 가꾸는 밑거름’이 될 만한 영화를 보아야 할는지요?
《영화가 뿌리친 정치사상》을 덮으며 새삼스레 생각합니다. 정치사상을 뿌리쳤다고 하는 영화일수록 오히려 ‘어떤 정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눈감도록 이끄는 영화일수록 도리어 ‘어떤 정치 꿍꿍이’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영화도 책도 교과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도, 아름다우면서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흐를 때에 비로소 빛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영화를 함께 보면서 다 같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까 하고 생각에 잠깁니다. 4348.11.24.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5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