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달몰이
조에 부스케 지음, 류재화 옮김 / 봄날의책 / 2015년 9월
평점 :



책읽기 삶읽기 206
‘전쟁 불구자’가 침대맡에서 길어올린 삶
― 달몰이
조에 부스케 글
류재화 옮김
봄날의책 펴냄, 2015.9.1. 12000원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자 1916년에 스스로 군인이 되었다고 하는 조에 부스케 님은 1918년에 총알에 맞아 아랫몸을 쓸 수 없는 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스무 살이었다고 해요.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도 독일 젊은이도 영국 젊은이도 죽고 다쳤습니다. 미국 젊은이도 죽고 다쳤으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뒤 어렵게 자유를 찾은 사람들 피를 물려받은 젊은이도 죽고 다쳤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수많은 젊은이를 그예 죽음으로 내몹니다.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도 끔찍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을 다치기 마련입니다. 목숨은 잃지 않았어도 몸이 크게 다치고 말아 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아랫몸을 쓸 수 없어 늘 누워서 지내야 했다는 조에 부스케 님은 1950년까지 삶을 잇습니다. 서른두 해라는 삶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스무 살에, 나는 포탄을 맞았다. 내 몸은 삶에서 떨어져 나갔다. 삶에 대한 애착으로 나는 우선은 내 몸을 파괴하려 했다. 그러나 해가 가면서, 내 불구가 현실이 되면서, 나는 나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상처받은 나는 이미 내 상처가 되어 있었다. (11쪽)
산문책 《달몰이》(봄날의책,2015) 첫머리는 ‘포탄에 맞은’ 이야기로 엽니다. 스무 살에 받은 아픔과 슬픔을 첫머리로 꺼냅니다. 삶에서 떨어져 나간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삶에 헤매던 나날을 이야기하고, 아랫몸을 쓸 수 없는 삶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프지 않고서 아픔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픈 나날을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기쁘지 않고서 기쁨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기쁜 나날을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짓눌리거나 짓밟힌 나날을 보낸 적이 없으면 짓눌리거나 짓밟힌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못살게 굴어 보지 않았으면, 남을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들 각자는 자기 개성 속에 감추어져 있다. 각자 삶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정작 없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다. (14쪽)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표명된 모든 시를 지니고 있다 … 시간이 생을 품으면 바로 우리 자신이 감미로운 곳이 되는 것이다. (22, 23쪽)
전에는 한 번도 탐험된 적 없는 어둠이 그 비밀스러운 세계에서 너를 당겼으며, 네 고유의 시선에 둘러싸여 네가 나타난다. (26쪽)
산문책 《달몰이》는 서른 해 남짓 침대살이로 삶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 남긴 이야기 꾸러미입니다. 창밖을 보기 싫어서 창문을 늘 가린 채 살았다는 젊은이가 겪은 삶을 적은 이야기 꾸러미입니다.
걸을 수 없고, 밖에 나갈 수 없는 몸이라면, 창밖을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창밖을 쳐다볼 마음이 조금도 안 들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없고 밖에 나갈 수 없는 몸이기에, 오히려 창문을 크게 내어 창밖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이 창밖으로 나가서 걷든 기든 바깥바람을 온몸으로 쐬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가리든 열든, 삶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랫몸을 쓸 수 없는 삶은 늘 같아요. 이리하여 조에 부스케 님은 생각에 잠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나날이 참말 삶다운가를 생각하고,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끔찍함과 미움과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하루일 수 있는데, 이런 하루라면 이 모든 끔찍함과 미움과 슬픔과 아픔을 더욱 낱낱이 파고들면서 생각합니다.
신이 자기 안에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도 끔찍하다 … 우리 내면은 한계가 없으며, 명명하는 것을 해방시킨다. 우리 언어는 결코 단 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고 내가 말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나’라고 말할 줄 모른다. 우리 의식은 말을 하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30쪽)
그 이튿날 나는 깊이 생각하며 전율했다. 내 몸과 나는 한갓 흙 부스러기이며, 사는 것이야말로 은혜로운 것이라는데, 내 부서진 몸 앞에서 삶은 벽에 불과하다 … 네 말 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을 줄 모르면 신에게 말을 걸지 마라. (80쪽)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하면서 삽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몸이 성해서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곳저곳 마음대로 가지 않’고 쳇바퀴처럼 ‘늘 가는 곳만 가면’서 살기 일쑤입니다. 출퇴근만 하느라 똑같은 길을 똑같은 때에 오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출퇴근을 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몸은 틀림없이 성하지만, 마음은 아주 좁은 데에 갇혀서, 아무런 생각이 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몹시 많아요.
서른 해 남짓 침대에서만 지낸 조에 부스케 님은 생각으로 삶을 꽃피웁니다.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삶을 스스로 가장 높고 깊은 데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별 한쪽에 ‘몸은 홀가분하지만 마음은 막힌’ 사람이 있고, 지구별 다른 한쪽에 ‘몸은 갇혔지만 마음은 활짝 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느 쪽에 서는 삶일까요?
전쟁의 출구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전쟁에 나갈 것을 강요받은 자들이 전쟁의 근원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다. 전쟁의 근원은 전쟁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불행인 전쟁 세대인가? (88쪽)
우스운 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너. 누군가를 생각해라. 삶이라는 게 네 관대함 안에만 있으면, 네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 누군가는 위대하다. (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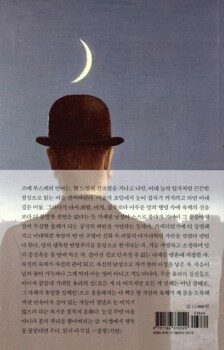
나는 요 스무 날 가까이 거의 못 걸으면서 지냅니다. 구월 첫머리에 논둑길에서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오른무릎을 크게 다쳤고, 오른무릎을 다친 뒤 사흘 동안 몸져누워 끙끙 앓기만 했으며, 그 뒤 닷새 즈음 일어서지도 못하며 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겨우 일어서서 걸음을 뗄 수 있어도 몇 걸음 옮기지 못해 주저앉아야 하고, 무릎을 다친 지 스무 날이 지난 요즈음은 마을을 한 바퀴 걸어서 돌아다닐 수는 있으나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이렇게 걸은 뒤에 한참 드러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달몰이》를 쓴 조에 부스케 님처럼 서른 해 남짓 침대에 드러누워 사는 몸은 아니지만, 요 스무 날 남짓 나한테 찾아온 자전거 사고와 생채기와 몸져눕기와 기어다니기와 새롭게 걸음마 떼기를 겪으며 가만히 돌아봅니다. 무릎에 고인 피고름을 짜며 온몸이 찌릿찌릿 아플 때마다 이 아픔은 뭔가 하고 조용히 되새깁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를 또렷하게 느낍니다. 아파서 드러눕지 않고서야 아픈 채 드러누워 지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을 수 없습니다. 아파서 드러누운 동안 ‘내가 언제 튼튼한 몸으로 씩씩하게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탔는가?’ 하고 까마득하게 생각했습니다. 걸을 수만 있어도 삶이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가를 새롭게 느낍니다. 그저 걸음마를 새롭게 떼려고 용을 쓰는 동안 ‘삶에서 가장 대수롭게 살필 대목은 무엇인가?’ 하고 온몸으로 아로새깁니다.
세계는 세계 속에서보다 내 속에서 더 크다. 그러나 나는 내 가슴속에서 펼쳐지는 현실로부터 몰려나왔다. (164쪽)
널 보지 않는다 해도, 신은 이미 네 안에 들어 있다. (181쪽)
인간은 이미지일 뿐 표현된 게 아니다. (189쪽)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즐겁습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 지은 꿈을 이루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 꿈길로 달릴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쳇바퀴를 돌거나 톱니바퀴가 되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읽고, 내 마음에 깃든 고운 님을 읽으며, 내 마음에 고운 님이 눈부시게 피어나도록 사랑을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달몰이》를 쓴 조에 부스케 님은 “신은 이미 네 안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신’이란 ‘하느님’일 테고, 하느님이란 바로 내 숨결이자 넋일 테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꿈을 품을 수 있고, 이 꿈을 제대로 바라보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두라 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미처 꿈을 못 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꿈을 품지 못했기에 꿈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아니, 꿈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지요.
오늘날 학교에서는 꿈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직 시험공부만 배웁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꿈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로지 직업만 가르칩니다.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시험공부만 하다가 이런 직업이나 저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꿈을 심거나 품는 아이들은 매우 드뭅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요 숨결이며 넋인가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매 순간 성 안으로, 네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관여하는 행위가 허깨비 같은 행위에 불과해도 해라. 네 영혼 안에서 본질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것을 해라. 비밀 속에서 작용하는 것만이 실제이다. 네가 하는 것은 그 이미지에 불과하다. (138쪽)
인간은 모두 나처럼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 상처 덕분이었다. (172쪽)
아랫몸을 쓸 수 없는 채 침대에서만 지내야 했던 젊은이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나날을 끔찍하게 괴로워 합니다. 괴로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생각을 바꿉니다. 침대맡을 떠날 수 없다면 침대맡에서 살기로 합니다. 침대맡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침대맡에서 살고 살다가 죽기로 합니다. 이리하여, 침대맡에서만 지내야 하는 ‘전쟁 불구자 젊은이’는 온 기운을 ‘생각짓기’에 쏟고, 생각으로 지은 삶과 사랑과 꿈을 ‘글’로 옮기기로 합니다. 침대맡에서 쓴 글은 책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고, 때로는 잡지가 되어 새로운 숨결이 됩니다. 침대맡에서 빚은 생각은 날개를 펼쳐 온누리 곳곳으로 훨훨 날아갑니다. 글을 빚는 ‘전쟁 불구자 젊은이’는 이녁 몸을 어디로도 보낼 수 없지만, 이녁 마음을 글이라고 하는 그릇에 생각을 심으면서 어디로든 훨훨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달을 몰고 갑니다. 달을 몰려고 갑니다. 달을 몰면서 스스로 달이 되고, 달을 몰다가 스스로 달님이 됩니다. 달빛이 어리는 이야기가 글 한 줄로 태어나고, 달무리가 지는 이야기가 책 한 권으로 거듭납니다.
삶을 이루는 고운 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불러서 깨워 주기를, 일으켜 세워 주기를, 걸음마를 뗄 수 있게 해 주기를, 어깨에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도록 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4348.9.23.물.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5 - 시골에서 책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