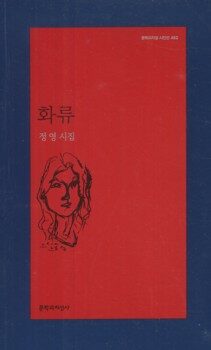-

-
화류 ㅣ 문학과지성 시인선 462
정영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4년 12월
평점 :

품절

시를 말하는 시 102
시와 수수께끼
― 화류
정영 글
문학과지성사 펴냄, 2014.12.31. 8000원
손가락을 뻗어 콕 찌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 배를 손가락으로 콕 찌르면 까르르 웃음이 터집니다. 잘 익은 무화과알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면 몰랑몰랑한 열매가 터지려 합니다. 그저 손가락 놀림 하나이지만, 이 손가락질로 웃음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가 어느 만큼 익었는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잘 놀려서 연필을 쥐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새로운 이야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선 모두가 전등 아래 모여 앉아 /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는 척하느라 고개 끄덕이기 바쁘고 / 우아하게 턱을 괴고 웃다가 집에 돌아와 / 사전을 만드느라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지 (가련한 사전)
정영 님이 선보인 시집 《화류》(문학과지성사,2014)를 가만히 읽습니다. ‘화류’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시집을 읽고, 한국말사전을 더듬다가 다시 시집을 읽습니다.
꽃과 버들이기에 화류일까요. 그러면 ‘꽃버들’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왜 ‘화류’라는 이름이 되어야 했을까요. ‘꽃버들’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확 와닿을 텐데, 왜 화류 같은 이름을 써야 했을까요.
이 도시에서는 모두 서로서로 겉으로만 알아듣는 척하느라 바쁘기에, 겉으로만 알아듣는 척하는 몸짓을 보여주려면 꽃버들 아닌 화류 같은 이름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예쁜 척하려면, 잘난 척하려면, 멋진 척하려면, 그러니까 ‘있는 척’하는 오늘날 이 땅에서는 꽃버들 아닌 ‘화류 같은 낱말’이어야 시가 되고 시로 읽어 주고 시로 비평하는 사회라고 할 만합니다.
나는 보았다 / 거리의 취한 사내들이 죽은 제 다리를 떼어내며 걸어가고 / 여인들은 침실에 앉아 그 다리를 주무르다 잠드는 것을 (집 밖의 삶)
사회는 참으로 수수께끼입니다. 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 같은 시설이 수수께끼입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원자력발전소는 깨끗한 전기라고 홍보하는 사회입니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핵쓰레기를 수십만 해에 걸쳐서 안전하게 건사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주가 없어도 원자력발전소를 그냥 짓고 그냥 돌립니다. 방사능과 핵쓰레기 대책은 하나도 없는 채 원자력발전소부터 짓고 봅니다.
입시지옥 같은 얼거리도 그야말로 수수께끼입니다. 입시지옥이 아이들 삶과 마음과 몸을 얼마나 갉아먹으면서 망가뜨리는가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어른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고 아름다우면서 착한 입시정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까닭이, 한국 사회에 학력차별이 없다면 입시지옥이 불거질 까닭이 없어요. 어느 대학교를 나오든 어떤 자리에서나 평등하게 일할 수 있으면 입시지옥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학교를 다녔든 안 다녔든, 사회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어느 갈래에서도 평등한 사회라면, 참말 입시지옥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비밀이 생긴 건 / 말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것이어서 // 피를 바꾸고 싶은 짐승들은 밤마다 / 사막에서 몸을 앓는다 (피에타)
제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 사십 년을 살고서야 이 게임의 룰을 몇 가지 알게 되었지요 (혈관에 꽂아 넣는 슬픔)
시집 《화류》를 가만히 읽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이 게임의 룰”을 마흔 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몇 가지 알아차렸다고 하는 시인 정영 님 이야기를 가만히 읽습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수수께끼투성이입니다. 부정부패도 수수께끼일 테지만,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공무원도 수수께끼요, 이제 와서 옛 대통령을 나무라는 주류 언론도 수수께끼이며, 4대강사업 못지않은 개발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데 이를 제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 모습도 언제나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더 아리송한 수수께끼라면, 평화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으며 자유롭지도 않은 사회에 아이들을 풀어놓는 어버이입니다. 아이를 낳은 어버이는 아이들을 입시지옥에 그냥 밀어넣습니다. 메마르거나 거친 사회라면 아이들이 메마르거나 거친 사회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회에 등돌릴’ 만도 한데, 오히려 사회에 더 깊숙이 스며들 뿐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짓도록 힘쓰기보다는 메마르거나 거친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그치거나 닦달하는 어버이로 지내기 일쑤입니다.
별을 좋아하는 이유 / 파도가 치는 이유 // 바닷게들은 여전히 새집을 짓고 / 소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열매를 따고 // 집을 옮겨다니는 나는 / 그것이 내가 사라진 것인 줄 알고 / 슬며시 웃고 있다 (여행)
우리는 모두 꽃이요 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늘이며 바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이고 꿈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없듯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비록 바보스러운 짓을 일삼더라도, 그이도 어느 어머니가 사랑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오늘 어느 한때 비록 멍청한 짓을 저질렀더라도, 그이도 어느 어머니가 사랑으로 돌본 아이입니다.
사랑을 받아 태어난 줄 잊었기에 바보짓을 합니다. 사랑을 누리며 자란 줄 잊었으니 엉터리 같은 짓을 합니다.
너도 꽃이고 나도 꽃입니다. 너도 버들이요 나도 버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삶을 짓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을 노릇이고, 함께 어깨동무를 할 일입니다. 꽃내음 흐르는 꽃웃음을 지을 노릇이요, 버들잎처럼 촤르르 바람노래를 널리 흩뿌릴 일입니다.
비가 내렸고 / 비가 내렸고 /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그것이 온전히 / 한 거죽의 골조일 뿐이란 걸 깨닫기까지 / 아픈 잠은 얼마나 계속되는 걸까 (오직 모를 뿐)
까마중꽃이 피고 집니다. 하얀 까마중꽃이 지면 짙푸른 열매가 동글동글 맺습니다. 짙푸른 열매는 햇볕과 빗물과 바람을 먹으면서 차츰 까맣게 물듭니다. 아주 새까맣게 익은 열매는 아이도 어른도 신나게 훑어서 먹습니다.
하얀 꽃이 똑같이 피지만, 고추만 빨간 열매를 답니다. 하얀 꽃이 똑같이 피는데, 매화는 노르스름한 열매를 맺습니다. 딸기와 앵두도 하얀 꽃이 똑같이 피되, 아주 빨간 열매를 매답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떤 꽃일까요? 우리가 피운 꽃은 어떤 열매로 나아갈까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서로서로 어떤 마음밥이 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즐겁고 기쁜 수수께끼로 어우러지는 삶이 되기를 빕니다. 서로 아끼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고운 노래가 되기를 빕니다. 4348.9.15.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5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