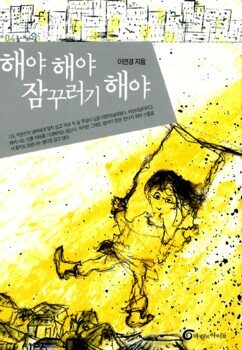-

-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 ㅣ 높새바람 4
이연경 지음, 이소하 그림 / 바람의아이들 / 2004년 5월
평점 :

절판

어린이책 읽는 삶 105
햇볕 한 줌으로 녹이는 가정폭력
―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
이연경 글
바람의아이들 펴냄, 2004.5.20.
나는 어릴 적에 이곳저곳에서 얻어터지거나 두들겨맞으면서 잠을 못 이루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국민학교)에서 문득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 못 이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수업이었는지 떠오르지 않으나, 담임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아리송했습니다. ‘맞은 사람이 잠을 잘 잔다’고 했으나, 막상 ‘맞은 사람’인 나는 잠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늘 생각했어요. ‘맞은 사람인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왜 옛날부터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나를 때린 사람이 또 때릴까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때린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앙갚음을 할까 싶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맞고 또 맞고 자꾸 맞다가 어느 날 내가 더는 못 견디겠다면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을 테니, 때리려는 사람은 자꾸 때려서 아예 못 일어나게 짓밟으려 하겠구나 싶더군요. 이런 생각이 드니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맞지도 말 노릇이면서, 누구를 때리지도 말 노릇이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나는 선생님이 이상했다. 몇 주 전에도 내 얼굴이 이랬다는 걸 몰랐을까.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하긴 선생님은 언제나 바빴다. (38쪽)
이연경 님이 쓴 동화책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바람의아이들,2004)를 읽습니다. 이 동화책에 나오는 ‘상효’라는 아이는 ‘어머니한테 늘 얻어맞’습니다. 무엇 하나만 잘못했다 싶으면 얻어맞고, 그저 어머니가 짜증이 나거나 일이 안 풀려서 때리기를 되풀이합니다.
동화책이 나온 해가 2004년인데, 이무렵에도 집에서 맞고 사는 아이가 많았을까요? 오늘날에는 어떠할까요? 집에서 맞고 사는 아이는 틀림없이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맞는 아이는 틀림없이 있으리라 느끼고, 아이를 때리는 어버이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느낍니다.
“누구한테 맞았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흔들었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눈은 슬퍼 보였다. 마치 아저씨가 맞기라도 한 것처럼. “많이 아프니, 아가야?” … 사람들은 내가 엄마에게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가지 표정을 짓는다. 하나는 불쌍한 표정이고, 또 하나는 나를 아주 몹쓸 아이로 여기는 표정이다. (33, 49쪽)
아이를 때리는 어버이는 마음속에 사랑이 깊거나 짙지 못합니다. 아이한테 모진 말을 퍼붓는 어버이는 이분이 어릴 적에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웃는 낯으로 노래하면서 살림을 가꾸지 못하는 어버이는 참말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못 배우거나 못 겪거나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 무엇을 물려주거나 보여줄 만할까요. 이 땅에 몸을 얻어서 태어날 수 있는 삶만으로도 넉넉히 사랑입니다만, 끼니마다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삶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입니다만, 목숨을 잇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오롯이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는 보람을 누려야 하고, 사는 즐거움을 웃음꽃과 노래로 누려야 합니다.
해님처럼 웃을 때에 사랑스러운 삶입니다. 바람님처럼 싱그러이 날듯이 뛰놀 때에 즐거운 삶입니다. 비님처럼 온누리를 촉촉히 적시는 숨결일 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착하고 참답게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버이라면 아이한테 해님 같고 바람님 같으며 비님 같은 넋을 물려줄 수 있어야지 싶습니다.
“우린 왜 가난한지 모르겠어.” 언니가 계란 노른자를 반으로 뚝 자르며 말했다. “난 가난이 싫은 게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싫은 거지.” “상효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니?” 언니가 나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61쪽)
동화책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에 나오는 상효네 집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반지하집에서 사느라 햇볕 한 줌 쬐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잔치밥을 먹는 일이 드물고, 고기를 구경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에서 지내는 상효는 ‘가난’보다 ‘어머니하고 따스하게 말을 섞지 못하는 나날’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상효네 언니는 문득 동생이 대견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요, 가난하지 않은 살림이라고 해서 꼭 즐거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커다란 집이 있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거나 햇볕 잘 드는 마당이 있는 집이 있으니 기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온갖 물질이 다 있어도 ‘우리 집’에 ‘오순도순 흐르는 이야기’가 ‘사랑스레 어우러지’지 않으면 즐거움도 아름다움도 기쁨도 없습니다.
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았다. 똑똑한 언니는 엄마 가슴을 아프게 만들 말은 하지 않았다. “외할머니 댁으로 갈까 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하듯 방바닥에 펼쳐진 내 책을 정리하며 말을 내뱉었다. “시골이요?” 나는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래, 외할머니가 계시는 시골 말이야.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야.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것들이 자라면 우리가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말이야.” (179쪽)
아이들 어머니는 미장원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아이들 어머니는 한숨만 짓는다고 합니다. 어린 상효가 신문배달을 하면서 푼푼이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이들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집을 옮기자고 말합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늘 외롭다고 생각하던 상효는,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사는 이웃 운전기사 아저씨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랬기에, 어머니가 시골로 가자는 말에 화들짝 놀랍니다. 마음붙이 아저씨를 잃겠구나 싶어서 슬픕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상효네 이야기를 듣고는 상효더러 기운내어 씩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잘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해를 듬뿍 보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도 마음이 있으면 서로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상효는 아저씨가 들려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서로 만나서 사랑과 꿈을 속삭일 수 있다는 생각을 어린 상효가 고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아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하집에서 햇볕 한 줌 없이 지내던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흙을 밟고 만지면서 일하고 놀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을 새롭게 지으면서 어머니가 다시금 기운을 차릴 수 있다면, 어머니는 아이를 때리는 손길을 거두어 남새를 기를 테고, 남새를 기르듯이 포근한 손길로 어린 상효를 어루만지거나 쓰다듬는 삶으로 거듭나리라 봅니다. 어린 상효도 이제는 고개를 야무지게 들면서 두 발로 이 땅을 씩씩하게 디디는 어린이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반지하라는 말보다는 그냥 지하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방은 햇살이 잘 들지 않아 솔직히 언제쯤이 아침인지 언제쯤이 저녁인지 알 수 없다. 우리 집에서만은 해는 잠꾸러기인 셈이다. 그래서 늘 형광등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 (23쪽)
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피해자입니다. 때린 사람을 감싸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늘 맞고 살던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메마르거나 차갑고야 만 사람들(가해자)도 마음을 따사로이 달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먹힘이나 발길질로 괴롭히는 짓으로는 그들 스스로 곱거나 좋거나 너르거나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 사랑받으면서 살 이웃이요 동무이고 숨결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이, 폭력도 따돌림도 괴롭힘도 없이, 서로 어깨를 겯고 함께 웃고 노래할 사람입니다.
해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삶입니다. 바람님을 온몸으로 맞아들이면서 노래할 삶입니다. 비님을 기쁘게 부르면서 사랑을 꿈꿀 삶입니다. 동화책에 나온 아이뿐 아니라 이 땅 모든 아이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히지 않기를 빕니다. 모든 아이들 어깨에 보드랍게 산들바람이 불어서 나비처럼 춤추고 새처럼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4348.6.11.나무.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5 - 어린이문학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