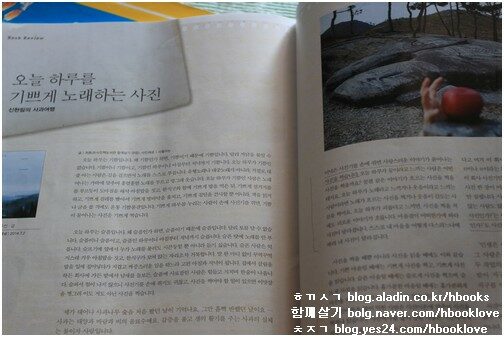-

-
포토닷 Photo닷 2015.3 - Vol.16
포토닷(월간지) 편집부 엮음 / 포토닷(월간지) / 2015년 3월
평점 :

품절



찾아 읽는 사진책 203
저마다 사진에 담는 말
― 사진잡지 《포토닷》 16호
포토닷 펴냄, 2015.3.1.
사진잡지 《포토닷》 16호(2015.3.)를 읽습니다. 《포토닷》 16호는 새로운 해에 새롭게 찾아온 봄날을 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잡지 삼월호는 봄날을 열고, 잡지 유월호는 여름을 열며, 잡지 구월호는 가을을 엽니다. 한 해를 열두 달로 나누면, 석 달마다 새로운 철이 돌아오고, 석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자랍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수상작에 대한 사진 조작과 합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월드프레스포토 재단은 올해도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최종 수상작에 대한 디지털 검증을 공식 선정과정에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는 아예 카메라에 저장된 그대로의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21쪽/이철승).” 같은 이야기를 가만히 읽습니다. 사진공모전에서 필름을 내야 한다면, 사진을 이리저리 만질 수 없었을 테지요. 그러나, 원판 필름이나 원본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찍히는 사람’과 몰래 이야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꾸며서 찍은 사진을 ‘꾸미지 않은 사진’하고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꾸며서 찍은 사진과 꾸미지 않은 사진은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꾸미지 않기에 사진다운 사진이 되고, 꾸미기에 사진답지 않은 사진이 될까요?
“사진을 전공할 때부터 작가로서의 자신을 사진가라기보다는 Visual Storyteller라고 생각했다.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양식을 가지는가보다는 내가 어떤 얘기를 풀어내고자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31쪽/차주용).” 같은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봅니다. 요즈음은 ‘사진가’보다 ‘예술가’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사진기를 손에 쥔 예술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기를 쥔 예술가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면서 사진밭을 기웃거리고, 사진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진밭에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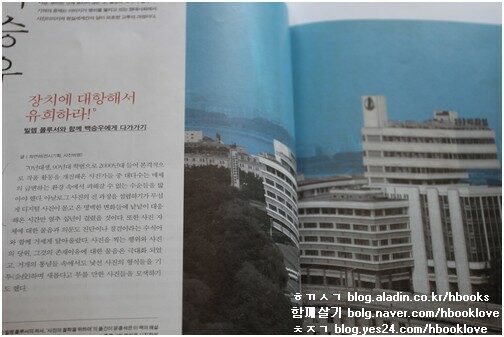

어느 모로 본다면 울타리(경계)를 허무는 모습입니다. 어느 모로 본다면 울타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모로 본다면 제자리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제철을 모르고 제길을 모르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안 꾸며야 하지도 않으나, 사진을 꾸며야 하지도 않습니다. 사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진은 ‘찍어야’ 할 뿐입니다. 사진은 ‘찍’되, 이야기를 찍어야 합니다.
‘만듦사진’은 좋은 사진도 나쁜 사진도 아닙니다. 만듦사진은 그저 만든 사진일 뿐입니다. 만들든 안 만들든,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패션사진이나 상업사진은 거의 모두 ‘만들’거나 ‘꾸며’서 찍지만, 이 사진을 모두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이야기를 담으려 하지 않고 손짓만 하거나 포토샵으로 매만지기만 한다면 사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손짓이나 포토샵질이 되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예술은 그저 예술입니다. 문화는 그저 문화입니다. 삶은 그저 삶입니다. 사진도 언제나 그저 사진이기에, 사진은 예술이 되어야 할 까닭이 없고, 예술도 사진이 되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특별한 모델이 있거나 찾으려 하지 않으며, 내게는 모두가 훌륭한 피사체다 … 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과 꿈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56, 63쪽/니콜라 앙리).” 같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니콜라 앙리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엮으’려고 오랫동안 살피고 생각한 끝에 한 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녁이 찍는 사진은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수없이 만지고 살피며 ‘어떤 모습을 꾸미는 몸짓’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면 이녁이 하는 일은 사진일까요, 아닐까요.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삶일까요, 아닐까요.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작가나 작품의 스타성에 의존하는 대형 사진전시를 보다 보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저 작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것 같아서다(77쪽/이소민).” 같은 이야기를 찬찬히 되읽습니다. 대형 사진전시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부풀리는 사진전시는 으레 ‘스타성’에 기울면서 돈벌이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 어느새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누려는 기쁨’을 소홀히 하기 일쑤입니다. 대형 사진전시를 하더라도 ‘사진으로 이웃과 나누는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대형 사진전시를 나무라는 말은 불거지지 않으리라 느낍니다.
돈을 버는 일이 나쁠 수 없어요. 돈만 생각하니까 쓸쓸할 뿐입니다. 기쁘게 벌어서 즐겁게 나누는 돈이 아니라, 그저 쌓기만 하는 돈이 된다면 씁쓸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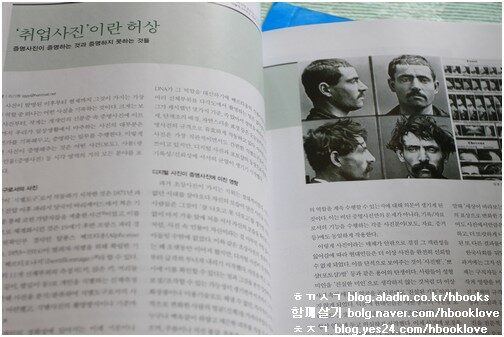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 한 장으로 삶을 노래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진을 읽는 사람은 사진 한 장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즐거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 모녀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해 달라고 했다. 이들을 찍어 준 후 내 카메라를 들어 보였더니 포즈를 취해 준다. 시간이 지나면 한몸이 과거와 미래로 나뉘겠지만, 현재는 둘로 나뉘어 외양의 아름다운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딸의 신체는 분명 어머니의 부분이었으니 말이다(80쪽/남택운).” 같은 이야기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진이 흐릅니다. 네 사진을 내가 찍고, 내 사진을 네가 찍습니다. 낯선 사람이 찍어 달라는 사진을 한 장 찍어 주면서, 낯선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온 나날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이들이 걸어온 길과 오늘 선 자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두 헤아립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증명사진을 통해 한 개인의 성품이나 인상을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각 직업군이나 기업마다 그에 적합한 사진 스타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104쪽/이기원).” 같은 이야기를 읽다가 책을 살짝 덮습니다. 증명사진이 한 사람을 오롯이 보여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사진도 한 사람을 오롯이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진관에서 찍는 증명사진뿐 아니라, 전문 사진가 여러 사람이 찍는 사진도 ‘한 사람 삶을 오롯이 밝히지 못한다’고 할 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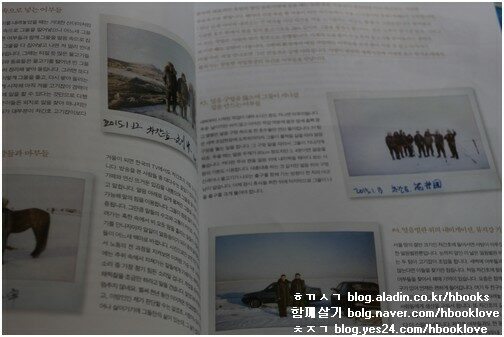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새롭게 한 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을 모두 보여줄 수 없지만,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을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깃든 숨결과 넋과 사랑과 꿈을 사진 한 장으로 찍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진 한 장으로 한 사람을 모두 담아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네마티는 여정 내내 혹여 아이들의 학교에서 모국어(위구르어)를 더 이상 교육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서북공정을 위해 많은 한족들을 신장자치구와 티베트 등으로 이주시켰다.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민족어와 북경어를 함께 가르치지만 머지않아 북경오로만 교육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언제부턴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116쪽/이경택).” 같은 이야기는 먼 나라에서 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도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만 겪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사람들은 고장말을 잊거나 잃습니다. 학교교육이 널리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마을에서 다 같은 교과서만 바라보아야 하니, 서울 표준말이 아니고는 말을 익히지 못해요. 이제 한국에서 부산말이나 광주말을 따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골에서도 시골말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와 책과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이 ‘다 다르던 말’을 ‘다 같은 말’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 다른 말이 다 같은 말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틀에 박힌 말이 될 테지요. 모두 틀에 박힌 말이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흐를까요? 모두 틀에 박힌 삶으로 흐를 테지요. 모두 틀에 박힌 삶으로 바뀌면 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사진기를 손에 쥔 사람은 다를 테지만, 사진기에서 나오는 사진은 모두 틀에 박히고 말 테지요.

“사진이론을 많이 익힌 사람은 사진이론에 맞추어 사진을 찍거나 읽습니다. 사진역사를 많이 살핀 사람은 사진역사에 맞추어 사진을 찍거나 읽습니다. 이론이나 역사를 따로 안 살피거나 거의 모르는 사람은 이론이나 역사에 맞추어 사진을 찍거나 읽는 일이 드뭅니다 … 아주 많은 사람들은 어느 사진 한 장이 어떤 사진기로 찍었는지 거의 모르거나 아예 안 살핍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 사진기로 얻은 사진인가?’는 사진읽기에서 대수롭지 않고 ‘누가 찍은 사진인가?’도 사진읽기에서 대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진을 찍든, 사진에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야기를 담기에 사진찍기요, 이야기를 느껴서 나누기에 사진읽기입니다(125∼126쪽/최종규).” 같은 이야기를 찬찬히 곱씹습니다. 이론이나 역사를 가르치기에 사진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이론이나 역사를 가르치면 이론이나 역사를 더 잘 알 뿐입니다. 실기를 많이 가르치면 실기를 더 잘 알 뿐입니다. 답사를 자주 다니면 답사를 잘 알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면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나누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는 삶을 보여주고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진에 담는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늘 삶입니다. 사진에 담는 삶이라는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늘 사랑입니다. 삶을 알고 사랑을 아낄 때에 비로소 사진을 알고 아낄 수 있습니다. 삶을 느끼고 마주하면서 따사로이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바야흐로 사진을 제대로 느끼고 마주하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똑똑해지지 않듯이, 더 많은 이론과 역사를 익혀야 사진을 잘 찍거나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면서 아름다운 삶과 사랑을 기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읽는 몸짓은 언제나 우리 삶과 사랑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마다 사진에 담는 말이란, 저마다 제 삶에 심는 사랑씨앗 한 톨입니다. 4348.3.16.달.ㅎㄲㅅㄱ
(최종규/함께살기 . 2015 - 사진책 읽는 즐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