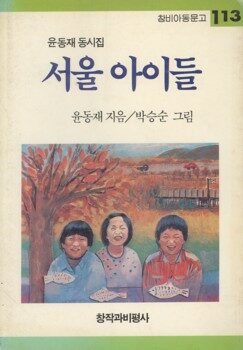-

-
서울 아이들 ㅣ 창비아동문고 113
윤동재 지음 / 창비 / 1989년 11월
평점 :



시를 사랑하는 시 47
서울에서든 시골에서든 똑같다
― 서울 아이들
윤동재 글
박승순 그림
창작과비평사 펴냄, 1989.12.10.
모과알은 모과나무에 달립니다. 모과알이 달리자면 모과꽃이 핍니다. 모과꽃이 피려면 모과나무가 자라야 하고, 모과나무가 자라려면 모과씨가 흙에 깃들어 찬찬히 자라야 합니다.
씨앗은 열매가 되고,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됩니다. 열매와 씨앗은 모두 목숨입니다. 목숨을 먹는 사람은 새로운 목숨을 잇고, 목숨을 받아들이는 숨결은 새로운 기운을 얻어 삶을 짓습니다.
곰곰이 헤아리면, 누구나 무엇이든 먹기에 삽니다. 지구별에 있는 모든 목숨은 반드시 무엇이든 먹습니다. 입으로 먹든 살갗으로 먹든, 풀과 나무뿐 아니라 벌레와 짐승과 물고기 모두 무엇이든 먹습니다.
.. 서울 아이들에게는 / 질경이꽃도 / 이름 모를 꽃이 된다. // 서울 아이들에게는 / 굴뚝새도 / 이름 모를 새가 된다 .. (이름도 모르고)
우리 삶에서 밥은 대단히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고 할 만하니까요.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면 정작 밥을 가르치거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밥 이야기를 거의 안 다룹니다. 이제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인문계 학교는 아이와 어른 모두 손수 밥을 짓는 살림일을 몸소 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란, ‘밥을 돈을 치러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잘 버는 일자리를 얻는 길’을 알려주는 데에서 그칩니다. 어떤 밥을 먹을 적에 몸이 즐거운지 안 가르칩니다. 어떤 밥을 어떻게 지어서 먹을 적에 삶을 아름답게 가꿀 만한지 못 가르칩니다. 어떤 밥을 어떻게 지어서 누구와 먹을 적에 삶을 사랑스레 북돋울 만한지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밥을 지으려면 먹을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조금도 못 가르칩니다.
.. 학교 오갈 때는 걷고 싶은데 / 자가용 꼭꼭 태워 줘요 // 이렇게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이렇게 자라서)
예전에는 ‘서울 아이’만 질경이꽃을 몰랐을 테지만, 요즘에는 ‘시골 아이’도 질경이꽃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나 이제나 학교에서 교사 노릇을 하는 어른 가운데 질경이꽃을 알아보는 사람이 퍽 드물고, 앞으로는 더욱 드물 테며, 대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법원이나 청와대나 국회나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데에서 질경이꽃을 다루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른 자리에 선 사람은 예나 이제나 무엇을 알까요? 학교에 자가용을 몰고 가는 교사는, 일터에 자가용을 끌고 오가는 어른은, 어제와 오늘 무엇을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는가요?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굴뚝새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굴뚝부터 만나기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는 비둘기나 까치나 참새쯤 으레 본다고 하지만, 이러한 새를 보면서 ‘새’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도시에도 온갖 들풀이 돋고 시들지만, 들풀마다 어떤 이름인지 헤아리거나 살피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동시집 《서울 아이들》(창작과비평사,1989)을 쓴 윤동재 님은 〈이렇게 자라서〉라는 동시에서 묻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되었을까요? 현대문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물질문명을 더욱 뽐냅니다.
서울살이를 한숨지으며 바라보는 쓸쓸한 눈길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서울 아이들》인데, 이 동시집이 처음 나올 즈음뿐 아니라 2010년대에도 시골은 일찌감치 시골빛을 잃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탓만이 아니고 경제개발 탓만이 아니며 올림픽 탓만이 아닙니다. 예나 이제나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삶을 안 가르치고 입시지옥만 몰아세웁니다. 도시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삶을 못 배우고 입시지옥만 배우면서 길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사랑을 못 받으면서 입시지옥 무게에 짓눌리기만 합니다.
..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 내 손잡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 모르는 것 있으면 친절히 가르쳐 주고 / 어떤 때는 어머니 대신 / 라면도 끓여 주던 우리 누나 / 고등학교 다니고부터는 도무지 / 우리 누나가 아닌 것 같아요 .. (우리 누나)
아이들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아이한테 사랑을 안 가르칩니다. 입시 지도만 합니다. 아이가 바라는 사랑을 찬찬히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이가 꿈꾸는 사랑을 가만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어른은 누구나 몹시 바쁩니다. 오늘날 어른은 참으로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오랜 나날을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사랑을 안 가르치거나 못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을 안 가르치거나 못 보여주는 학교 얼거리인데, 아이들은 시집이나 동시집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 들길을 걷다 보면 / 도랑 가로 달개비꽃 피어 있지요 / 달개비꽃 볼 때마다 / 달개비란 이름 맨 처음 붙인 사람 / 궁금하지요 .. (누구일까)
뜨거운 물을 단추만 눌러서 뽑은 뒤 부으면 몇 분 뒤에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은 쓰레기를 낳습니다. 다 먹은 뒤에도 쓰레기가 남고, 컵라면을 만드는 동안에 공장에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냄비로 끓이는 봉지라면도 비닐봉지가 쓰레기로 남고, 봉지라면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공장에서 만들어 가게로 나르자면 짐차가 굴러야 하고 짐차가 구를 찻길이 있어야 합니다. 공장을 돌리자면 숲을 밀어야 하고, 나라밖에서 석유를 사들여야 하는데, 석유를 뽑는 나라는 땅뙈기를 더럽힙니다. 석유를 사들이자면 커다란 배를 무어야 할 텐데, 커다란 배를 뭇느라 바다를 더럽히고, 배를 몰자면 석유를 들여야 하니 또 바다를 더럽히며, 배를 무을 때에 쓰는 쇠붙이를 파내자고 다시 숲을 더 망가뜨립니다. 적은 돈으로 사서 먹는 라면 한 봉지 때문에 지구별 곳곳을 파헤치거나 망가뜨리거나 부숩니다.
라면 한 봉지를 사다 먹는 일이 나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나쁠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느끼지 못한다면 삶이 없을 뿐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먹으면서 삶을 지으려고 하는지 깨닫지 않는다면 사랑이 자라지 않을 뿐입니다.
배를 채우려고 밥을 먹는다면, 왜 배를 채워야 할까요? 배를 채워서 무슨 일이나 놀이를 할 생각일까요? 내가 누리는 일과 놀이는 무슨 보람이나 재미나 뜻이 있을까요?
.. 시냇가에 곱다랗게 / 피어 있는 제비꽃 /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 (제비꽃)
서울에서든 시골에서든 똑같습니다. 학교가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이 똑같고, 어른이 학교와 마을과 집에서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든 시골에서든 똑같이 하늘을 등에 입니다. 서울에서는 매캐한 먼지띠를 등에 인다고 할 테지만, 너른 누리에서 헤아리자면 먼지띠는 아주 작습니다. 지구별한테까지 빛을 보내는 다른 이웃 별을 헤아리자면 먼지띠는 아무것이 아닙니다.
먼지띠가 아닌 온누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띠 너머에 있는 수많은 별빛과 미리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야 이웃 별을 사귑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야 내 몸에 깃든 기운을 살핍니다.
눈을 뜨면 어디에 있더라도 마음을 열어 사랑을 키웁니다. 눈을 못 뜨면 어디에 있더라도 눈먼 바보가 되어 사랑도 꿈도 이야기도 못 짓습니다.
겨울에 겨울바람을 실컷 느낍니다. 봄에 봄볕을 실컷 느낍니다. 여름에 들나물을 실컷 느낍니다. 가을에 가을빛을 실컷 느낍니다. 마음에서 자라는 꽃을 느끼면서, 들에서 피고 마당과 길가와 골목에서 함께 피는 고운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서로 이웃이요 동무인 줄 느낄 수 있기를 빕니다. 4347.12.21.해.ㅎㄲㅅㄱ
(최종규 . 2014 - 동시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