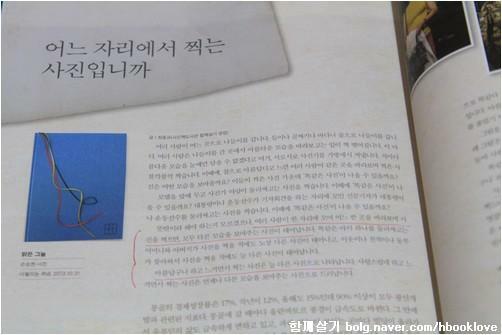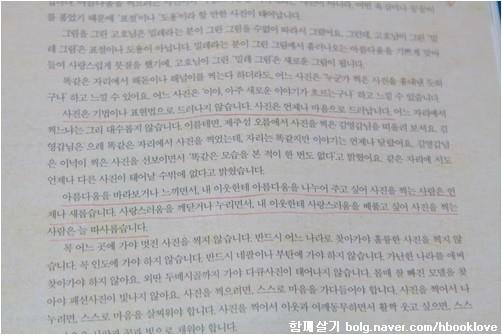-

-
포토닷 Photo닷 2014.3 - Vol.4
포토닷(월간지) 편집부 엮음 / 포토닷(월간지) / 2014년 2월
평점 :

품절




찾아 읽는 사진책 162
사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 사진잡지 《포토닷》 4호
포토닷 펴냄, 2014.3.1.
사진잡지 《포토닷》 4호(2014.3.)가 나왔습니다. 필름사진은 거의 사라지고 디지털사진으로 달라지는 흐름과 맞물려, 종이책으로 나오는 사진잡지는 거의 숨을 거두고 디지털로 나오는 사진잡지가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포토닷》은 종이책 사진잡지입니다. 4호째 나오는 종이책을 찬찬히 넘기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진가들이 디지털사진기로 사진을 찍더라도 전시장을 얻어 사진잔치를 열 적에는 ‘종이에 사진을 앉’힙니다. 디지털파일로 사진을 보도록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디지털파일로 사진을 보도록 벽에 화면을 쏘더라도 종이에 앉힌 사진을 함께 걸기 마련입니다. 사진잔치를 알리는 엽서나 쪽글이나 도록도 종이책으로 만들기 마련이에요.
사진기자 일을 하다가 지리산 언저리로 깃들며 살아가는 분이 사진을 놓고 “막연히 나이 들어서는 시골에 머물며 사진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점차 사진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죠. 삶 자체가 더 중요하고 사진은 놓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25쪽/이창수).” 하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더 크고 사진은 놓아도 된다고 생각했다지만, 어느 쪽이 더 크거나 작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사진을 빼면 삶이 없거든요. 사진과 함께 살아가니, 삶과 사진은 언제나 한몸입니다.
시골에서 흙을 만지는 이한테서 흙을 빼면 삶이 없습니다. 시골내기한테 흙을 빼고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시골내기와 흙은 늘 한몸이요 한마음입니다. 흙을 만지며 풀을 보듬고, 흙을 가꾸며 나무를 아낍니다. 사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사진이 삶을 빛내고 밝히리라 느껴요. 다시 말하자면, 삶을 내려놓고 사진만 할 수 없습니다. 사진만 내려놓고 삶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진길 걷는 사람한테는 삶과 사진이 늘 한덩어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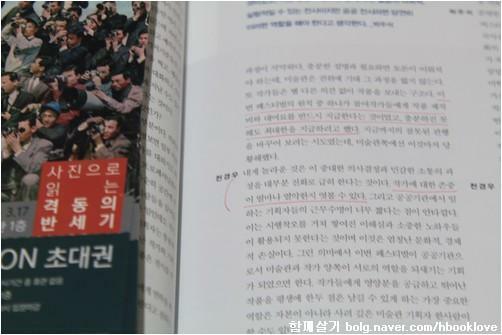

한국땅 아름다운 빛을 담는다는 옥맹곤 님은 사진을 놓고 “풍경사진은 사진을 찍을 당시의 피사체, 주변환경, 사진가의 상태 3가지가 일체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보석 같은 것이에요. 말이 아니라 발과 마음이 좋은 풍경사진을 얻는 비결이죠(27쪽/옥맹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도록 사진을 찍었다는 옥맹곤 님인데, 이녁이 쓰는 사진장비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진장비를 써야 사진을 아름답게 찍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디지털이냐 필름이냐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녁이 말하는 세 가지는 ‘찍히는 님’과 ‘찍는 나’와 ‘찍히는 님과 찍는 나 사이를 이루는 삶자리’입니다. 세 갈래 삶을 함께 읽을 때에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자리 삶을 하나로 엮으며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사진을 찍는다는 소리입니다.
사진잡지 《포토닷》을 더 펼칩니다. “인물을 찍는 행위는 결국 나를 거울에 비춰 보는 행위다(58쪽/천경우).”와 같은 이야기를 읽다가 “나는 보그 이탈리아를 찍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생 패션을 하는 것이 꿈이다 … 패션사진을 학문과 학술로 배워 본 적이 없다(107, 108쪽/홍장현).”와 같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진기를 든 사람은 언제나 ‘남’을 찍지만, 남을 찍는 사진은 언제나 ‘나’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남에 비추어 나를 보여준다고 할 만해요. 사진에는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델에 비추어 내 삶과 넋과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셈입니다.
즐겁게 놀며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운 빛을 사진으로 담겠지요. 아름답게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웃음을 사진으로 보여주겠지요.
슬프고 어둡게 보이는 사람을 찍었다면, 사진에 나오는 저들이 슬프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슬프거나 어둡습니다. 밝고 환하게 보이는 사람을 찍었으면, 사진에 나오는 저들이 밝거나 환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밝거나 환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찍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빙그레 웃는 사람을 찍는 사람도 빙그레 웃습니다. 삶을 담고 삶을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진을 놓고 깊고 너른 이야기를 나누기는 아직 어려운 듯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원칙 중 하나가 참여작가들에게 작품 제작비와 대여료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충분하진 못해도 최대한을 지급하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였는데, 미술관 쪽에선 이것마저 당황해 했다(63쪽/박주석).”와 같은 이야기를 읽어 보셔요. 미술관에서 사진잔치를 열면서 사진가한테 제대로 사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모습은 2014년에도 똑같습니다. 지자체나 미술관에서 사진잔치를 기획한다면, 마땅히 사진가한테 일삯을 치러야겠지요. 사진을 걸었으면 사진을 만드는 데에 드는 돈뿐 아니라, 사진을 찍느라 들인 땀값을 치러야겠지요.
사진 한 장에 치르는 품값과 땀값은 얼마로 매기면 될까 궁금합니다. 사진 한 장을 미술관에서 거저로 받거나 헐값으로 사들여서 걸어도 될까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나부터 예전에 ㅇ미술관에서 했던 사진잔치에 함께하면서 겪은 일이 떠오릅니다. 여섯 달 동안 사진 100장을 찍어 달라 했는데, 여섯 달 동안 사진 100장을 찍는 품값과 땀값으로 육십만 원 남짓 준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젊은 사진가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이녁 경력에 이름이 들어가니까 구시렁거리면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을 해서 찻삯조차 없이 그런 헐값으로는 사진을 못 찍는다 해서 교통비 몫으로 달마다 얼마쯤 받기로 하면서 사진 100장에 130만 원 일삯이 되었으나, 더할 나위 없이 터무니없는 노릇이지요. 사진 1장 찍어서 가져오면 1만 원을 준다는 꼴이니까요.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으니, 나와 여러 사람이 ㅇ미술관에서 함께 일하기 앞서 일했던 다른 이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더 많은 사진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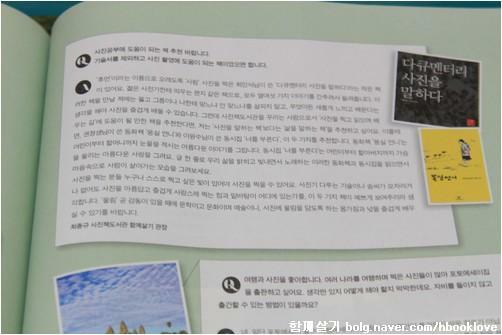
사진책 《밝은 그늘》을 비평하는 글을 읽습니다. “사진은 기법이나 표현법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진은 언제나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 아름다움을 바라보거나 느끼면서, 내 이웃한테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고 싶어 사진을 찍는 사람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사랑스러움을 깨닫거나 누리면서, 내 이웃한테 사랑스러움을 베풀고 싶어 사진을 찍는 사람은 늘 따사롭습니다 … 작고 예쁜 지구별 이웃을 바라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작고 예쁜 지구별 이웃을 사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사진 한 장 찍습니다(145, 146쪽/최종규).”와 같은 이야기를 곰곰이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진가를 헐값으로 부리려 하는 미술관 일꾼은 사진잔치를 왜 하려 하나 헤아려 봅니다. 그야말로 사진에 온삶을 바치는 이들은 어떤 눈빛으로 사진기를 만지는지 되새겨 봅니다. 사진 한 장을 얻고자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웃 사진가들은 어느 때에 보람을 얻으면서 싱긋 웃는지 곱씹어 봅니다.
사진은 무엇일까요. 사진책은 무엇이고, 사진잔치는 무엇일까요. 사진길을 걷고 싶은 이들은 왜 대학교에 들어가려 하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무엇을 배울 생각일까요. 사진을 찍어서 참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돈이란 무엇일까요.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 우리들일까요. 돈을 벌어 어디에 돈을 쓰면 즐거웁다고 여기는 우리들일까요.
사진을 찍는 이들이 봄볕을 쬐면서 봄노래를 부르기를 빕니다. 사진을 읽는 이들이 봄바람을 마시면서 봄빛을 즐기기를 빕니다. 사진을 다루는 이들이 봄들을 거닐면서 봄꽃을 물끄러미 들여다볼 수 있기를 빕니다. 4347.3.3.달.ㅎㄲㅅㄱ
(최종규 . 2014 - 사진책 읽는 즐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