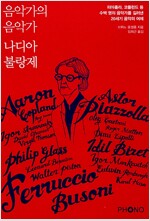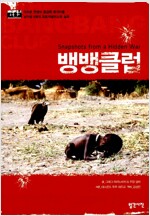책으로 보는 눈 197 : 마음이 읽는 책
사월 육일 아침부터 봄비 내립니다. 봄에 내려 봄비인데 바람이 되게 드셉니다. 웬 봄날에 이리도 드센 봄바람 부는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불 만하니 이런 바람 불겠지요. 그리고, 이 드센 바람이 제아무리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쯤 몰아친다 하더라도 가라앉을밖에 없습니다. 봄이거든요.
갑자기 몰아치는 봄바람 때문에 앵두꽃 모두 떨어질는지 모릅니다. 드세게 몰아치는 봄바람 맞으면서도 꽤 많은 앵두꽃 씩씩하게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떨어진 앵두꽃은 흙으로 돌아갈 테고, 나뭇가지에 남은 앵두꽃은 차츰 꽃잎을 지면서 바알간 앵두말로 거듭날 테지요.
브뤼노 몽생종 님이 쓴 《음악가의 음악가, 나디아 불랑제》(포노,2013)를 읽습니다. 음악가를 가르친 음악가라는 나디아 불랑제 님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나디아 불랑제 님은 당신이 바흐를 참 사랑한다면서, 문득 “바흐가 제게 하도 큰 기쁨을 주었기에 저도 그 기쁨의 어느 정도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112쪽).” 하고 말합니다. 기쁨이로군요. 기쁨을 누렸기에 노랫길 걸었고, 노랫길 걸어가며 이웃과 동무한테 기쁜 노랫가락 나누는 사랑 펼칠 수 있군요.
들에서 자라는 머위꽃 한 줄기 꺾습니다. 들에서 자라니 들머위라 할 만합니다. 머위꽃 여럿 꺾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널리 퍼져 머위밭 되기를 바라며 한 줄기만 꺾습니다. 이 머위꽃은 내가 안 먹고 건사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옆지기한테 건넵니다. 나는 들에서 머위꽃 바라보면서 마음이 넉넉하게 불렀거든요. 입으로 먹어도 배가 부르고, 눈으로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귀로 들어도 온몸이 따스하고, 가슴으로 들어도 온몸이 따스해요. 봄빛이 내 몸을 곱게 안아 줍니다.
책이란 무엇이 될까 하고 헤아려 봅니다. 책은 눈으로 읽는지, 머리로 읽는지, 곰곰이 따져 봅니다. 아마, 눈이 아니라면 숱한 글책 못 읽겠지요. 한국에는 점글로 찍는 책 얼마 없어 내 눈이 안 밝으면 날마다 수없이 쏟아지는 글책 못 읽겠지요. 그런데, 날마다 쏟아지는 ‘눈으로 읽는 글책’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마음밥 될까요. 얼마나 마음밭 일굴 밑거름 될까요.
그레그 마리노비치 님과 주앙 실바 님이 함께 쓴 《뱅뱅클럽》(월간사진,2013)을 읽습니다. 퓰리처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을 온누리에 밝히며 이녁 고향나라에 평화 찾아오기를 바란 발자국을 담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 오랜 사진벗인 케빈 카터 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 지구별 이웃한테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가를 들려줍니다. “주앙은 두려웠고,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가 상상해 오던 종류의 전쟁 사진이 결코 아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사진을 찍어 나갔다(76쪽).”와 같은 외침처럼, 젊은 사진벗 네 사람 마음은 총알 빗발치고 죽음 흐드러지는 싸움터에서 아프게 시듭니다. 죽음과 같은 북새통에서 스스로 빛을 찾고 싶었고, 이웃한테 빛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왜 찍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되새기며, 따순 눈물 한 방울이 무지개 웃음 한 자락으로 태어나기를 빌었습니다. 곧, 봄철 된바람 저물겠지요. 4346.4.7.해.ㅎㄲㅅㄱ
(최종규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