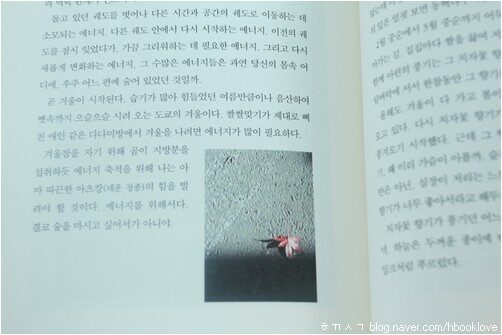-

-
케이타이 도쿄 - 핸드폰으로 담아 낸 도쿄, 그 일상의 세포
안수연 지음 / 대숲바람 / 2007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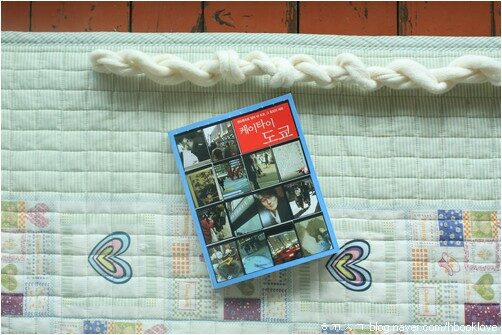
사진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없다
[찾아 읽는 사진책 86] 안수연, 《케이타이 도쿄》(대숲바람,2007)
새봄을 맞이하며 날마다 새로 피어나는 꽃을 봅니다. 봄까지꽃을 보고, 별꽃을 봅니다. 매화꽃을 보고 광대나물을 봅니다. 나는 누가 이 꽃들한테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릅니다. 풀꽃도감을 살펴보면서 이름을 헤아리고, 풀꽃 이름과 사진을 나란히 붙인 책을 읽으며 이름을 살핍니다. 어머니나 둘레 어른들이 가리키는 이름을 들으며 이름을 곱씹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보는 느낌을 떠올리며 이름을 가늠해 봅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식구가 맨 처음 만난 봄꽃은 ‘봄까지꽃’입니다. 나는 이 꽃을 ‘개불알풀꽃’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었고, 나중에 ‘봄까치꽃’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왜 ‘봄까치꽃’이라 일컬을까 궁금해서 말밑을 찾아보는데, ‘-치-’라 적은 대목은 잘못이고 ‘-지-’로 적어야 올바르다 합니다. ‘봄까지꽃’이 올바르게 적는 이름이라 해요. 따뜻한 마을에서는 늦겨울부터 이른봄 사이에 피고 진대서 ‘봄까지꽃’이라 이름을 붙였다더군요.
그렇지만, 잘못 붙었다는 이름 ‘봄까치꽃’이 훨씬 널리 알려진다고 해요. 아마 ‘개불알풀꽃’이라는 이름도 이와 마찬가지일 테지요. 일본 풀꽃학자가 이 이름을 붙여 그만 일제강점기에 이 이름이 들어왔다던데, 이 대목까지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나도 이냥저냥 이런 이름 저런 이름 깊이 살피지 않으며 쓰지 않았겠느냐 생각해요. 나날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풀이름 꽃이름 나무이름 어떻게 알려줄까 하고 생각하며 찾아보는 이즈음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버이인 나부터 옳게 살피고 제대로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갈 때에 아이들한테 옳은 이름 좋은 생각 바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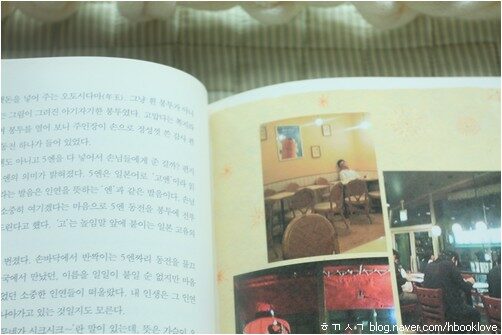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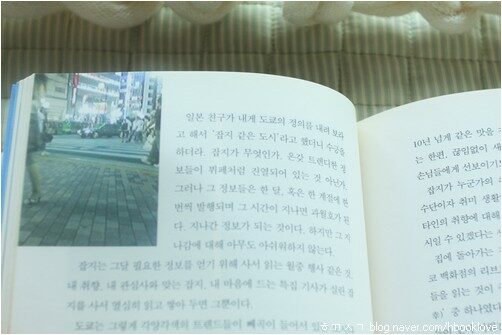
나는 나대로 ‘봄까지꽃’한테 새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대로 붙인 새 이름은 내 아이한테 이어지고, 내 아이한테 이어진 이름은 내 아이가 낳을 아이한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찬히 이어지는 이름이 되면, 이 이름은 우리 식구들 살아가는 마을에서 따로 일컫는 이름으로 뿌리내려요. 별꽃도, 매화꽃도, 광대나물도 그래요. 나는 별꽃을 바라보며 참 작은 별 같구나 생각했는데, 참말 이름이 별꽃이었습니다. 매화꽃은, 글쎄, 매화라 하니 매화라 말하기는 했는데, 이 꽃을 바라보며 무엇을 떠올릴 만할까 하고 더 생각하면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요. 광대나물도 그렇고요.
손전화에 딸린 사진 찍는 기능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안수연 님이 내놓은 《케이타이 도쿄》(대숲바람,2007)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손전화 기계는 손전화 기계이지 사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손전화 기계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화질이나 빛느낌이나 파일크기 모두 여느 사진 기계하고 대면 아무것 아니거나 초라하다 할 테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손전화 기계 또한 ‘사진기 구실’을 하고, 손전화로도 얼마든지 ‘사진 이야기’를 빚을 만해요.
원고지에 써야만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 되지 않아요. 광고종이 뒤켠에 글을 써도 시가 되고 소설이 되며 수필이 돼요.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그려야 그림이 되지 않아요. 모래밭에서 나뭇가지로 그려도 그림이 돼요. 오래 남아야 그림이고, 밀물에 쓸려 사라지면 그림이 아니란 법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늘에 대고 손가락으로 그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눈망울에 그릴 수 있어요.
사진이란 내 삶이 되고, 내 사랑이 되며,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 삶을 빛내는 길을 찾을 때에 사진이고, 내 사랑을 나누는 꿈이 되면 사진이요, 내 이야기를 도란도란 주고받는 자리에서 사진이 태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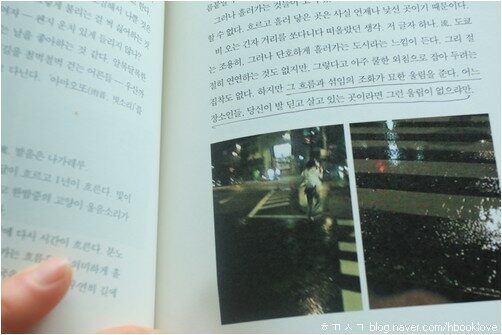
“그렇게 몰래 찍으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순간이 내게 준 울림들이 알 수 없는 온기로 남아 케이타이를 쥔 손이 약간은 따뜻해져 왔다(14쪽).”고 하듯, 스스로 따뜻한 기운을 느끼거나 나눌 때에 사진이 태어납니다. “그 흐름과 섞임의 조화가 묘한 울림을 준다. 어느 장소인들, 당신이 발 딛고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런 울림이 없으랴만(91쪽).” 하고 읊듯, 내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라도 사진을 빚고, 사진을 일구며, 사진을 펼칩니다. 서울에 가야 사진을 배우지 않고, 도쿄에 갔기에 사진을 배우지 않으며, 한국땅 시골마을에서 흙을 만지기에 사진을 못 배우지 않아요.
“도쿄의 저녁 시간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던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니 그건 그들의 생활 풍경이 유난히 푸른빛 저녁 시간과 궁합이 잘 맞았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98쪽).”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좋아하는 삶일 때에 좋아하는 손길로 좋아하는 사진을 빛냅니다. 사랑하는 삶일 때에 사랑하는 눈길로 사랑하는 사진을 읽습니다. 내 매무새가 내 손길이고, 내 몸짓이 내 춤사위입니다.
“방법은 그 다음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왜 나는 사진을 찍고 있는가? 왜 나는 사진을 선택했는가? 그럼 그는 왜 사진을 찍고 있는 걸까(172쪽)?” 하고 늘 물을 수 있으면, 언제나 생각할 수 있으면, 노상 되뇔 수 있으면, 내 가슴속에 사진이라는 씨앗이 살포시 뿌리내리겠지요. 사진이라는 씨앗이 천천히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겠지요. 이윽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겠지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씨앗을 내놓을 테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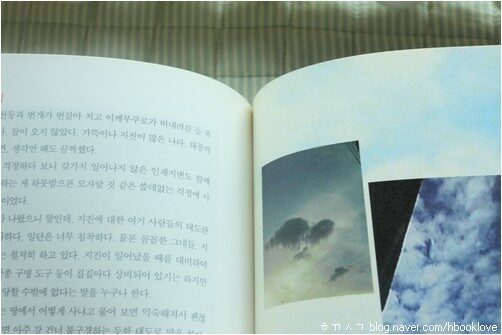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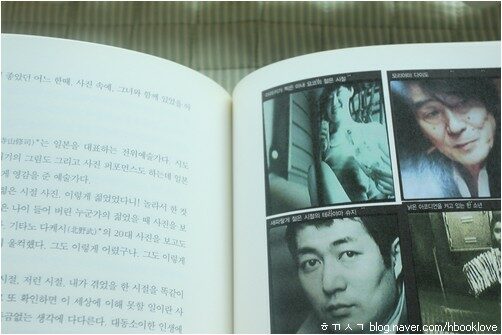
스스로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가르칩니다.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은 스스로 배웁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을 읽습니다. 사진을 읽는 사람은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 사진학과에 들어가야 이름난 사진쟁이가 된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로 배움길을 떠나야 멋진 사진길을 걷는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작은 씨앗이 된다면, 스스로 사진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진을 키우는 나날이란, 곧 내가 살아가는 나날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속엔 영원한 소년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난 여자들의 마음속엔 소중히 물을 주어 정성껏 기르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202쪽).”는 이야기처럼, 내 마음밭에 뿌린 씨앗이 나무 한 그루로 자라도록 돌보는 나날이, 내가 살아가는 나날이요, 내가 이루려는 꿈을 가꾸는 나날입니다.
사진은 저기에 없지만, 저기에 있다고 여기면 저기로 가면 됩니다. 사진은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서 못 본다고 느끼면 여기에서 떠나면 됩니다. 좋은 삶 궂은 삶이 없듯, 좋은 사진 궂은 사진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하는 나날을 즐겁게 빛내면 언제나 아름다이 활짝 웃는 사진이고 이야기가 됩니다. (4345.3.22.나무.ㅎㄲㅅㄱ)
― 케이타이 도쿄 (안수연 사진·글,대숲바람 펴냄,2007.7.30./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