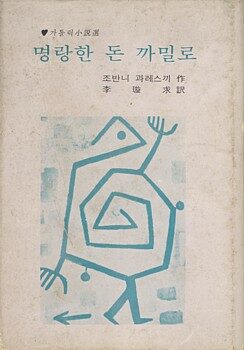-

-
돈 카밀로의 곤경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이선구 옮김 / 새남 / 1994년 12월
평점 :

절판

(돈 까밀로 책을 우리 말로 처음 옮긴 이선구 님 번역이 아직 하나 살았네...)
다시 태어나는 책과 삶과 사람
― 조반니 꽈레스끼, 《명랑한 돈 까밀로》
- 책이름 : 명랑한 돈 까밀로
- 글 : 조반니 꽈레스끼
- 옮긴이 : 이선구(李璇求)
- 펴낸곳 : 가톨릭출판사 (1969.2.20.)
조반니노 과레스키(조반니 꽈레스키·죠반니노 과레스끼) 님 책은 1969년에 처음 우리 말로 옮겨졌으나, 이 책은 그다지 많이 안 읽혔습니다. 천주교 출판사에서 나온 터라 천주교 믿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 읽혔습니다. 1979년에 ‘백제’ 출판사에서 새옷을 입고 나오면서 비로소 널리 읽히고, 나중에 백제출판사가 문을 닫은 뒤 다른 출판사에서 거듭 펴내며 많이 읽힙니다. 조반니노 과레스키 님 문학은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다섯 권이 끝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는 이 다섯 가지 책 테두리에서만 머물고, 좀처럼 다른 문학과 삶을 들여다보는 쪽으로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비밀일기》(막내집게,2010) 같은 책이 어렵게 우리 말로 옮겨지지만, 막상 이러한 문학을 알아보거나 곰삭이거나 맞아들이는 사람은 퍽 적어요.
다시 태어나는 책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읽히는 책만 다시 읽히며, 다시 팔리는 책만 다시 팔립니다.
출판사도 먹고살아야 하는 만큼, 이 나라 출판사들은 (돈이 있건 없건) 안 팔리거나 덜 팔리거나 못 팔릴 책을 좀처럼 내놓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거나 훌륭하거나 아름답다 싶은 책을 내놓아야 하더라도, 먹고살 수 없을 뿐더러 돈이 없다면 좋든 훌륭하든 아름답든 거들떠보기 힘듭니다.
오늘 바로 끼니를 굶는데 무슨 책을 사서 읽는다 하겠습니까. 오늘은 끼니를 때웠어도 이듬날 밥끼니가 걱정스러운데 무슨 영화를 찾아 보겠습니까. 이듬날 밥끼니는 때울 만하더라도 글피에는 잠자리가 마땅하지 않은데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요즈막 우리 삶은 온통 먹기·입기·잠자기에 푹 빠집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먹고 입으며 잠자기 고단하다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먹고 입으며 잠자기 팍팍하다 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보다는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내느라 등허리가 휩니다. 식구들과 살가이 얼크러지기보다는 회사나 공장에 붙들리느라 다른 데에는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느덧 일고여덟 살이 되고, 어느새 열다섯 살을 지나며, 금세 스물일곱을 지나, 서른다섯 마흔다섯 쉰다섯을 휙휙 달립니다. 이윽고 예순 일흔 여든 고개에 접어들자니, 끽 하고 꺾여 스러집니다. 한삶을 너무 바삐 아주 빨리 달리고 맙니다. 어릴 적에는 돈버는 솜씨를 기르자니 바쁘고, 나이들어서는 돈버는 살림에 매여 빠듯합니다. 참말 복닥복닥 어수선하니까 책이고 뭐고 없습니다. 참으로 고단하며 지치니까 문화이고 예술이고 나 몰라라, 아니 냇물 너머 불구경, 아니 먼 나라 다른 사람 일입니다.
..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돈 까밀로 신부가 살고 있는 조그만 세계는 뽀오 강 어느 아늑한 골짜기에 박혀 있다. 그것은 저 허리띠처럼 길게 늘어진 북쪽 이태리 가운데 어느 마을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뽀오 강과 아빼닝 산맥 사이에 있는 그 고장은 기후가 항상 똑같다. 따라서 풍경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강냉이와 삼을 가꾸는 농촌들은 저마다 자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5쪽)
한갓지거나 돈이 넘치는 사람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한갓진 사람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돈이 넘치는 사람 또한 책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한갓지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고, 돈이 적은 사람이 책을 가까이합니다.
이름이 있거나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책을 안 읽습니다. 이름이 없거나 이름을 드날릴 생각을 않는 사람이 책을 읽습니다.
힘세다며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 이른바 권력자는 책을 읽을 까닭이 없습니다. 힘여리기에 주먹은커녕 아무런 무기조차 들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수수한 여느 사람은 종이책이 아닌 사람책을 읽습니다. 종이에 직어야만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 몸과 마음에 아로새긴 이야기 또한 책입니다. 수수한 여느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웃이나 동무가 되어 도란도란 삶책을 나눕니다.
대단할 이야기를 담는 책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잘것없거나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담는 책입니다. 흔하디흔한 이야기가 아닌 수수한 이야기를 담는 책입니다. 하찮다 싶다고들 하는 작디작은 이야기를 담으나, 이 작디작은 이야기란 투박하면서 조촐합니다. 누구나 겪되 누구나 다르게 부대끼는 삶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내 옆지기와 밥상을 마주하며 한 마디 두 마디 나누는 이야기가 사랑스러울 때에, 내 아이와 밥상을 마주하며 한 마디 두 마디 주고받는 이야기가 사랑스럽습니다. 오순도순 나누는 이야기를 애써 글로 갈무리해서 일기로 남기거나 책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로 흐뭇하기에 그저 이야기꽃 피우는 나날을 고이 이으면서 조용히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 허리띠처럼 길게 늘어진 북쪽 이태리 가운데 어느 마을” 어디에서나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태어납니다. 그야말로 서울 아닌 시골자락 어느 마을 누군가한테서나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샘솟습니다.
나날이 돈되는 종이책만 자꾸 다시 태어나지만, 나날이 돈되는 일거리만 붙잡는 사람으로 자꾸 길들여지지만, 사랑을 담은 사랑책과 삶을 담은 삶책과 사람을 담은 사람책은 언제 어디에서나 가만히 피고 지며 바람에 흩날립니다. 햇살을 받으며 방긋 웃습니다. (4343.2.11.쇠.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