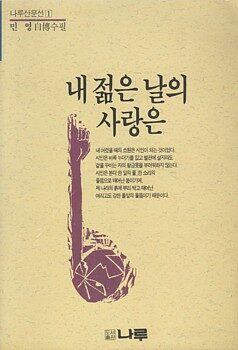고마운 삶을 고마운 말에 실어 고마운 책으로
― 민영, 《내 젊은 날의 사랑은》
- 책이름 : 내 젊은 날의 사랑은
- 글 : 민영
- 펴낸곳 : 나루 (1991.9.30.)
시를 쓰는 분들이 쓰는 산문을 즐겨읽습니다. 소설을 쓰는 분들이 쓰는 산문도 즐겨읽습니다. 그런데 산문을 쓰는 이들이 쓰는 시나 소설은 거의 못 봅니다. 어쩌면, 산문쓰기만을 즐기는 이는 퍽 드물지 않느냐 싶고, 산문쓰기를 하는 이들은 다른 갈래 글은 거의 못 쓰지 않느냐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진 한 장에 말 한 마디를 붙일 때에도 산문입니다. 사진과 글이 어울린다는 거의 모든 책들은 산문으로 적은 글이라 할 만합니다. 자서전이나 일기나 편지를 책으로 묶을 때에는 산문으로 쓴 글이라 여길 만하고, 책을 읽고 적바림하는 글 또한 산문으로 적바림하는 글이라 볼 만합니다.
산문이란 가장 홀가분하게 쓰는 글입니다. 길이를 맞출 까닭이 없으나 길이를 맞추어 써도 됩니다. 줄을 띄어서 적을 까닭이 없지만 줄을 알맞게 띄어서 적을 수 있어요. 산문은 시처럼 써도 되고 소설처럼 써도 됩니다. 산문이라는 테두리에서 산문이라는 알맹이를 건사한다면 모두 산문입니다.
시 가운데에는 산문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문 가운데에는 ‘시산문’이란 없습니다. 산문이란 그예 산문이지만, 산문이면서 시 내음이 나기도 하고 소설 빛깔이 나기도 합니다. 산문은 제 얼굴이나 목소리가 없다 할 만한 글인데, 제 얼굴이 없어도 즐겁고 제 목소리가 나지 않아도 즐겁게 나누는 글이라고 느낍니다.
.. 우리가 세든 집은 긴 것이 특색이었다. 버스간처럼 길다랗게 생긴 일자 집을 반으로 나눠 오른쪽에는 주인집 식구들이 살고, 나머지 왼쪽 단간방에는 우리가 살았다. 집 앞에는 빨랫줄에 널린 빨래들이 늘 만국기처럼 펄럭거리고 있었다. 엄마(아내)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공동수도로 물을 길러 가야만 했다. 물지게를 지고 돌층계 길을 이리 돌고 저리 돌며 한참 동안 내려가야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담긴 물지게를 지고 집까지 돌아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엄마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서울로 시집오지 말 걸 그랬어요. 시골 있을 때도 이처럼 고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팔자인 모양이죠? 하기야 시골에서는 저보고 서울로 시집가 얼마나 좋으냐고 말들을 하지만, 이거 어디 서울 신랑 얻었다고 좋아할 수 있겠어요?” … 아빠는 이때부터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려고 밤잠조차 줄여 가며 노력해도 입에 풀칠을 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동숭동 집에서 평지에 있는 효제동 집으로 이사한 것은 그 이 년 후의 일이었다. 전세값이 해마다 껑충껑충 오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낙산 꼬방동네 인심이 좋았었기 때문이다. 예부터 가난뱅이 사정은 없는 사람만이 안다고, 조선 팔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인 꼬방동네 사람들의 마음에는 훈기가 있었다 .. (22, 24, 31쪽)
글을 쓰는 사람은 어느 글이든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내 모든 넋과 기운을 바쳐야 비로소 글 한 줄을 씁니다. 산문 또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모든 넋과 기운을 바쳐야 비로소 한 꼭지 얻습니다. 그런데 모든 넋과 기운을 바쳐서 이루는 산문 한 꼭지이지만, 시를 쓸 때나 소설을 쓸 때나 사진을 찍을 때처럼 어떠한 틀에 매이지 않습니다. 틀에 매일 때에는 산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사진을 찍든 내 잣대에 따라 내 틀을 마련해야 하기는 하면서도 내 틀에 얽매여서는 열매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틀을 마련하여 지키지만 틀에 매일 때에는 아무런 문학도 문화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산문은 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어느 결에도 매이지 않되, 다른 모든 문학과 문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넋과 기운을 바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문쓰기가 다른 시쓰기나 소설쓰기나 사진찍기보다 한결 힘들는지 모릅니다. 틀이 없는 틀이 산문쓰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일과 살림살이 가운데 ‘틀이 있는 틀’이란 한 가지조차 없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밥을 하면서 쌀알 숫자를 꼭 똑같이 맞추는 일이란 없어요. 그저 쌀자루에 담아 놓은 작은 밥그릇 하나를 푹 박아서 집어올리는 느낌과 무게로 어림합니다. 쌀을 씻을 때에 물을 어느 만큼 부어서 씻은 다음 몇 초에 걸쳐 어떠한 빠르기로 개수대로 버려야 하는가 하는 틀 또한 없습니다. 밥을 안칠 때에 불을 어떠한 불을 넣고 몇 분 몇 초 동안 끓여야 하는가 하는 틀 또한 없어요. 그런데 모두 같은 밥입니다.
김치를 접시에 담을 때에 몇 조각이 되도록 하나하나 세지 않습니다. 김치를 칼로 썰거나 가위로 자를 때에 크기가 어떻게 되도록 꼼꼼히 살피지 않습니다. 밥술을 뜰 때에도 똑같고, 젓가락질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밥을 먹고 젓가락질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님과 입을 맞출 때에 ‘오늘은 몇 초 동안 입을 맞추어야지.’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입을 맞춘다든지 더 살짝 입을 맞춘다든지 해서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아요.
..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처방전에 약이름을 적어 주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왕진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 약을 갖다 먹이면 곧 나을 겁니다.” 의사는 다소 사무적으로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기야 대학에서 교수직까지 맡으신 분이니, 조바심하는 환자 쪽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도 같았다 … 그러나 앓는 아이의 아비로서는, 그때 그분이 좀더 차분하게 증세를 설명하며 다급한 자의 물음에 이해와 동정을 베풀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인술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일까? .. (140∼141쪽)
아이 손을 잡고 멧길을 오를 때면 아이는 혼자 신나게 달리다가, 아빠 손을 잡다가, 힘들다며 안아 달라 합니다. 어찌 되든 우리들은 멧길을 오르내리고, 즐거이 바깥바람을 쐽니다. 아이는 잠자리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기도 하지만, 엄마 무릎이나 아빠 무릎에 누워 곯아떨어지기도 합니다. 오줌을 잘 가려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가 있는 한편, 잘못해서 바지에 쌀 때면 아빠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네 나이가 몇인데 이러니 하고 꾸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꾸중을 듣는 아이가 신나게 뛰놀다가 곯아떨어져 색색대는 곁에서 이불을 덮어 주며 생각합니다. 왜 아빠로서 아이를 조금 더 따스히 돌보지 못하고 꾸중부터 하는가 하고.
아직 많이 어리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더 개구지게 놀고 싶지만 아빠가 온갖 집일과 글쓰기에 얽혀 온 하루를 마음껏 놀아 주지 못하니까 말썽을 부릴 수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런 대목쯤 못 봐주는가 싶어 부끄럽습니다.
.. 현실에 안주하여 잠꼬대 같은 풍월을 읊조리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시는 치열한 자기성찰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짓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체해서도 안 됩니다. 남에게 오래도록 불려지길 바란다면 시는 어머니가 떠 놓고 비는 한 사발의 정한수같이 진실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 솜씨가 늘면 자만하기 쉽고 이제까지 공들여 쓰던 시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 정도의 글쯤이야’ 하고 시쓰는 작업을 무시하게 될 때, 즉 생각을 깊이하고 시어를 갈고 다듬는 일에 소홀해질 때, 이제까지 빈틈없이 긴장을 유지해 오던 시가 갑자기 맥이 풀려서 헤식은 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 (150, 157쪽)
시쓰는 민영 님이 내놓은 산문책 《내 젊은 날의 사랑은》을 읽었습니다. 1991년에 나온 이 산문책은 판이 끊어졌습니다. 헌책방마실을 1992년부터 다녔는데, 이때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이 책 하나를 헌책방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새책으로도 마주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물 긷고 빨래하러 이오덕자유학교로 천천히 멧길을 걸어올라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앞서, 지난날 이오덕 선생님이 보시던 책 가운데 이 책이 눈에 뜨이어 빌려서 읽었습니다.
한 시간 남짓 걸려 스무 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970년대 첫무렵부터 1990년까지 쓴 산문을 성글게 그러모은 《내 젊은 날의 사랑은》이라는 책은 민영 님이 당신 글에 곧잘 쓰는 ‘헤식다’라는 말마디처럼 헤식은 글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이 작은 책에 꽤 길게 담은 ‘민영 님네 아주머님’ 이야기는 더없이 사랑스러우며, 그지없이 애틋합니다. 당신 따님 ‘들레’한테 띄우는 편지도 참으로 좋습니다.
어쩌면, 민영 님 묵은 책을 읽으며 끄적이는 이 느낌글 하나는, 우리 집 첫딸 사름벼리한테 쓰는 어설픈 ‘아빠 편지’가 될는지 모릅니다. 곯아떨어진 딸아이를 잠자리에 곱게 눕혀 이불을 덮은 다음, 아버지도 많이 졸리며 고단하지만, 졸음과 고단함을 꾸욱 참으면서 글 한 꼭지 붙드는 삶을 오늘 하루치 남겨 놓고, 딸아이가 먼 뒷날 무럭무럭 자라나서 제 아비가 쓴 글을 찬찬히 돌아본다 할 때에 2011년 1월 어느 날 이런 글도 이런 살림을 꾸리면서 썼네, 하고 돌아보아 줄 수 있을까 하고 꿈을 꾸면서 쓰는 편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마운 삶이기에 고마운 넋을 껴안고 고마운 말을 고마운 책에 담습니다. (4344.1.7.쇠.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