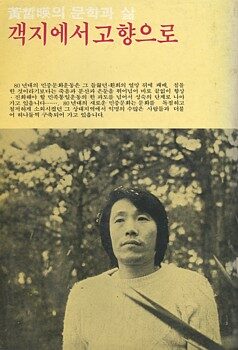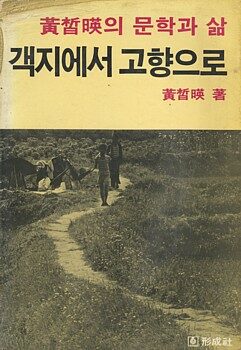
황석영 님 책 가운데 내 책꽂이에 꽂힌 책을 살펴본다. 《장길산》이나 《모랫말 아이들》이나 《무기의 그늘》이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들이 보이지만, 이런 책은 일찌감치 끈으로 묶어 구석진 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지 오래. 내 책꽂이에 아직도 남아 있는 황석영 님 책은 오직 하나, 1985년에 형성사에서 펴낸 《객지에서 고향으로》.
묵은 책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닦아내어 오랜만에 펼쳐든다. 내가 이 책 《객지에서 고향으로》를 만난 때는 1998년이니 열한 해가 지났다. 이 책을 헌책방에서 찾아내어 읽던 그무렵에도 황석영 님을 놓고 여러 말이 많았지만,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과 함께 《객지에서 고향으로》는 우리들한테 이야기 한 자락 살며시 건네는 책이라고 느끼며 곰곰이 새겨 읽었다.
.. 구공탄은 연탄공장의 기계가 찍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깊숙한 땅속에서 캐어져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처럼 단순한 사실을 연탄집게로 집어올릴 적에 단 한 번이라도 되새겨 본 사람들은 드물 것이리라. 마치 하늘을 쳐다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도회지의 바쁜 월급장이의 깨달음처럼, 이 뒤늦은 고마움은 어딘가 슬프기까지 한 것이다 .. (31쪽/1973년)
나로서는 열한 해 만에 펼치는 책. 그러나 열한 해 앞서 이 책은 판이 끊어져 있었다. 1985년에 처음 나온 책이었으니 1990년대가 저물녘에는 판이 끊어질 만도 하지. 그런데 황석영 님 다른 책은 수없이 다시 찍고 거듭 찍고 새로 나오고 하는 가운데, 오직 이 녀석 《객지에서 고향으로》는 되살아나지 못했다. 왜일까? 왜 이 책은 되살리지 않았을까? 너무 옛날 옛적 이야기라서? 이제는 황석영 님 생각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 스스로 내버리는 책이라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는 황석영 님 삶이요 문학이며 생각이요 넋이라서?
.. 확실한 것은 그들이 파괴된 환경 속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인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게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돌려주어야만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자각하고, 그것을 획득하고,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집단적인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야말로 진정한 근대화이며, 사회적 진보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73쪽/1973년)
빛바랜 갱지로 된 책장을 만지작거린다. 빛바랜 옛책에 담긴 이야기는 그야말로 예스런 이야기일는지 모른다. ‘오늘’을 살아가려는 황석영 님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이야기일는지 모른다. ‘지난날’을 살았다는 황석영 님을 내세우는 이야기는 되고, 훈장처럼 가슴에 달아 놓는 이야기는 될 터이나,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이웃하고 소담스레 나눌 이야기는 못 될는지 모른다.
어쩌면, 황석영 님은 지난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당신 둘레 ‘가난한 이웃’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구경하기는 했어도, 당신 몸을 내맡겨 당신 둘레 가난한 이웃하고 ‘함께 살아가기’는 안 하지 않았을까. 낮은자리 이웃하고 손을 마주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뜨겁게 얼싸안거나 뒹굴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어느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면서 글만 쓰고 있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는 금을 긋고 이 너머로는 손뼘 하나만큼도 넘어갈 뜻이 없지 않았을까.
독재에 무너지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나쁜법에 옥죄이며 제도권교육에 목졸리는 가운데 사회 푸대접과 따돌림에 앓고 있던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곳’에서 살아가던 황석영 님은 아니었을까. 돈에 밟히고 이름값에 눌리며 힘에 밀려난 사람들하고는 사뭇 ‘다른 나라’에서 지내던 황석영 님은 아니었을까.
.. 힘센 아이가 그네를 독차지하면 저 혼자 실컷 타도록 버려 두고, 그네에서 벗어나서 다른 놀이를 창조해 내자. 그 아이의 힘을 통해 이익을 보려 하지 말자. 제일 힘없는 꼬마를 잊지 말자. 그와 언제나 같이 있자. 그러는 가운데 구슬과 고리는 보배로 변할 것이다 .. (99쪽/1983년)
말이란,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모음이 아니다. 글이란, 손으로 끄적이는 기호모음이 아니다.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가 말이요, 내 삶에서 샘솟는 외침이 글이다. 돈을 바라면서 할 수 없는 말이요, 이름을 바라면서 쓸 수 없는 글이다. 힘을 얻자고 할 수 없는 말이며, 한자리 차지하자면서 쓸 수 없는 글이다.
사랑이 스미도록 하는 말이다. 믿음이 깃들도록 하는 글이다.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말이다. 믿음으로 껴안는 글이다. 나한테 있는 모든 힘을 바쳐 사랑스러운 손길을 내미는 말이고, 내가 낼 수 있는 젖먹던 힘을 용을 쓰듯 짜내어 나누는 믿음직한 몸짓이다.
.. [황석영] 어떤 형태로든 민중을 신비화하는 것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제가 해남에서 경험한 것이지만, 농민들이 어떤 때는 더 영악하고 현실에 순응적입니다.
[황지우] 우리가 병든 만큼 민중도 병들어 있어요.
[황석영] 그렇지만 민중은 운동의 힘줄입니다.
[황지우] 힘의 저장소로서의 민중에 대한 신뢰를 저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운동에는 지식인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야 합니다. 《장길산》에서의 김기와 같은 예외적 존재도 있지만, 대체로 선생님의 지식인에 대한 태도는 불신이라기보다는 혐오에 가깝더군요.
[황석영] 제가 지식인을 혐오한다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도 지식인의 한 종자인데요. 다만 그들의 기회주의적 포즈가 싫었읍니다 .. (188쪽)
그런데 1985년에서 스물네 해를 훌쩍 지난 2009년에 다다른 황석영 님은 우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시인 황지우 앞에서 “그들의 기회주의적 포즈가 싫었읍니다” 하고 힘주어 말하던 그 황석영 님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글을 쓰고 있는가. 황석영 님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웃으로 있는가. 황석영 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동무로 있는가. 황석영 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웃으로 보이는가. 황석영 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동무로 보이는가.
《객지에서 고향으로》를 다시 펼쳐 읽는 동안, 소설쓰는 황석영 님은 틀림없이 예나 이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어김없이 예나 이제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건네는 말마디와 글줄은 똑같지 않다고 느껴진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탓일까. 내가 책을 제대로 못 읽은 탓일까. 책에 담긴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을까. 책이란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슬어 버리는가. 흘러간 책에 담은 이야기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하는가. 예나 이제나 한결같이 이어오면서 우리한테 ‘참된 목숨 하나 고맙게 받으며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거룩한 사람 길’을 찾고 느낄 책이란 이 세상에 없는가.
한숨 한 번 쉬고 물 한 잔 마시면서 《객지에서 고향으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인다. 둘레에서 적잖이 내다 버리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차마 내다 버리지도 못하겠고 불사르지도 못하겠다. 오히려 더 꽁꽁 붙잡아 두고 간직해야 하지 않느냐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책을 내다 버리거나 불사를 때마다 이런 분들은 더더욱 말바꾸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며 핑계를 둘러댈 테니까. 뜬소리와 뜬생각과 뜬몸짓으로 우리 눈을 홀리고 귀를 어지럽힐 테니까.
나는 《월간 조선》 1980년대치와 조갑제 님 책과 이문열 님 책, 그리고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책 옆에 황석영 님 책을 나란히 꽂아야겠다. (4342.5.16.흙.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