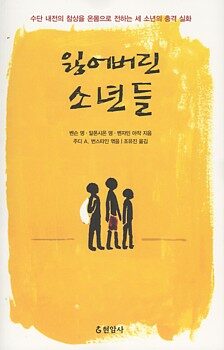내가 좋다고 느끼는 책
― 열 해 뒤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어야지
아침에 ㅎ출판사로 전화를 건다. 얼마 앞서 읽은 책 하나가 퍽 좋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집어낸 잘못과 군데군데 잡아챈 오탈자를 알려주고 싶었다. 인터넷편지로 글을 갈무리해서 띄울 수 있지만, 이 책을 펴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한 군데 두 군데 잘잘못을 짚는 가운데 ‘잘못 쓰셨나요, 제가 잘못 보았나요?’ 하고 여쭙는 일이 좀더 반갑다. 나는, 그분이 몇 군데 잘못 찍힌 채 책이 나오도록 했다고 해서 꾸짖을 마음이 아니다. 이 좋은 책을 애써 엮어 내면서 몇 군데에서 아쉬운 대목이 드러나고 말았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때와, 전화기로 목소리만 주고받으면서 말할 때, 그리고 써 놓은 글을 읽을 때 느낌이 사뭇 다르다. 나로서는 아무런 ‘싫은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없이 수수하게 적어내려간 글을, 엉뚱하게도 ‘내가 아주 싫어하고 못마땅해서 그런 글을 쓰는 줄’ 생각하며 읽기도 한다. 너무 뜻밖이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글을 제대로 못 써서, 읽는 사람도 제대로 못 읽은 셈이 아니겠느냐면서 속을 다스린다. 앞으로는 엉뚱하게 읽어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애쓰고 또 애를 써도, 어느 한 사람을 외곬로 바라보거나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내가 아무리 좋고 반가운 느낌으로 글을 쓴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전화를 건다. 내 돈 들여서 읽은 책을 내 돈 들여서 전화를 걸어 내 시간을 보내면서 알려준다. 그러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값은 하나도 없다. 나중에 2쇄를 찍으면, 고친 대목을 바로잡아서 알려주겠다는 소리도 없다. 이런 뒷손질을 알려주십사 하고 전화를 하지는 않으나, 내 사는 곳을 물으며 도서목록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분은 거의 없다(딱 한 번 있었으나 손사래를 쳤다).
출판사로 전화를 거는 까닭은, 내가 책을 읽으면서 못 헤아린 대목이나 알아채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머니를 기꺼이 털도록 해 준 책이며, 내 시간을 넉넉히 쓰면서 가까이하도록 해 준 책이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넋이 좋은 쪽으로 많이 거듭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한다. 세상을 좀더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도 되고, 우리 둘레를 좀더 깊이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기도 했다. 그래서, 이만큼 얻은 보람과 기쁨이 있어서, 전화삯 얼마쯤 들인다고 해도, 다른 일을 잠깐 미뤄 두고 이곳저곳 잘잘못을 알려준다고 해도, 나로서는 또다른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오늘 아침, ㅎ출판사 편집부로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잘잘못을 알려주고 나서, 문득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다. “다 읽고서 참 좋았는데, 이 책이 2쇄를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2쇄를 못 찍게 되더라도 출판사에는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웬만큼 껍데기를 씌워서 내놓으면 어느 만큼 잘 팔린다고 하는 어린이책이요, 이름난 출판사 딱지를 받고 세상에 나오면 기본 부수가 나간다고 하는 어린이책이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책 가운데에서 눈길 한 번 제대로 못 받으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책이 제법 많다. 우리 세상을 속깊이 들여다보는 책, 우리 삶터를 찬찬히 헤아리는 책, 우리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책, 우리 사회가 푸대접이나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고르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꿈꾸는, 그러니까 평등과 인권을 바라는 책이 좀처럼 안 팔린다. 어렵게 배앓이를 하고 나온 책임에도 언론 눈길조차 못 받기도 하고, 언론 눈길은 제법 받아도 독자 사랑을 못 받기 일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와 평등과 사랑과 믿음을 알알이 담고 있는 책 가운데, 우리와 일본 사이 문제를 다루면 어느 만큼 팔린다. 이 평화와 평등과 사랑과 믿음이 제3세계, 중남미,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그냥 안 팔린다. 유럽 작가가 쓴 책은 곧잘 팔리는데, 제3세계나 중남미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쓴 책은 잘 안 팔린다. 모든 책이 이러하지는 않으나, 우리 흐름이 얼추 이러하다. 몽골과 티벳과 인도로 성지순례와 명상순례나 관광여행으로는 나다니지만, 몽골이 어떤 문화와 역사가 있는지, 티벳이 어떤 아픔과 고달픔으로 시달리면서 식민지보다도 못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인도 계급과 사회가 이 나라를 어떻게 휘어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이러한 흐름과 얼거리를 보려는 사람이었으면, 나라밖 나들이를 나서기 앞서 이 나라 삶과 삶터 이야기를 다룬 책을 알뜰히 챙겨서 읽었을 테며, 이런 이야기 다룬 책이 쉬 판이 끊어지거나 책방 책꽂이에서 사라지는 일이란 없었으리라 본다. 전국 곳곳에 있는 도서관 책시렁에도 차곡차곡 꽂혀 있으면서 두루 읽힐 수 있었으리라 본다.
지난 8월 2일에 처음 손에 쥐었으나, 그달 16일에 아이를 낳으면서 손에서 멀어졌고, 아기 돌보기와 옆지기 챙기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가운데 다시 손에 쥐면서 부지런히 읽던 책, 《잃어버린 소년들》을 지난 10월 9일 밤에 다 넘기고 덮었다. 엿새쯤 속으로 삭이면서 느낌글 하나를 엮어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을 어루만지고 가슴에 안고 살며시 쓰다듬은 다음, 내 책꽂이 한켠 잘 보이는 자리에 꽂아 두려고 한다.
나 혼자만 좋게 느끼고, 나 혼자만 즐겁게 읽고, 나 혼자만 눈물콧물 질질 흘리면서 읽던 책이었어도, 이 책은 나 하나 살가운 읽는이를 만나서 기뻐해 줄 수 있을까. 아무렴. 내가 좀 모자라거나 어수룩하거나 어줍잖은 읽은이였다고 해도, 살포시 집어들고 즐거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얻었으니, 나와 책 하나는 반갑게 만난 셈이다. 그리고, 나는 이 책 하나를 사랑해 주었기에, 먼 뒷날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 살쯤 되는 나이에, “얘야, 네가 엄마 배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던 때 아빠가 너를 품에 안고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 주면서 눈물을 흘렸단다.” 하고 손때 짙게 묻은 책을 건네어 줄 수 있다. (4341.10.15.물.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