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책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적잖이 있습니다만, 헌책방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헌책방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제법 됩니다. 헌책방은 한낱 참고서만 파는 데로만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헌책방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가 낮았을 때나 찾아들던 추억어린 옛날 곳’으로, 그러니까 사라져 가는 곳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헌책방 참맛을 못 보고 참느낌을 못 느끼는 분들이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굳이 안쓰러워할 까닭은 없습니다. 불쌍하다면 불쌍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훨씬 크게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책쉼터이자 문화쉼터이자 동네쉼터 한 군데를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대로 헌책방 나들이를 즐깁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헌책방 나들이를 즐기는 분들은 새책방 나들이도 부지런히 합니다. 모두들 ‘책’을 좋아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책 하나에 담긴 깊은 우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푸고 또 푸어도 마르지 않는 시원한 우물을 느꼈는데, 어찌 이곳을 자주 찾아가면서 새로 물 한 바가지 떠 마시고프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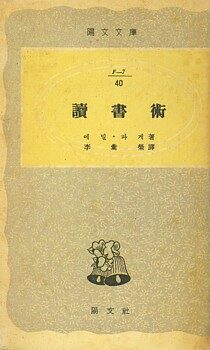
1959년에 우리 말로 옮겨진 《에밀 파게-독서술》(양문사)을 봅니다. 이 책은 1972년에 ‘서문당’ 출판사에서 다시 나옵니다. 1959년판과 1972년판은 옮긴이가 같습니다. 둘 모두 이휘영 님.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판이 끊어졌습니다. 일본사람 야마무라 오사무 씨가 펴낸 《천천히 읽기를 권함》(샨티,2003)은 에밀 파게 님이 쓴 《독서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건만, 《천천히 읽기를 권함》은 우리 말로 옮겨져도, 《독서술》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1900년대 첫머리(양문사 판은 1923년에 나온 판을 옮겼다고 합니다)에 나온 책이라서, 요즘 세상과 견주면 너무 낡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낡았을까요.
― 잘된 소설은 우리들에게 잡히지 않던 인생, 우리들 손에서 반쯤 빠져 달아나던 인생 그 자체를 우리들이 잡도록 거들어 주는 것이다. (33쪽)
집 앞에 있는 할아버지 헌책방에서 1980년대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요즘은 어느 누구도 안 사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책입니다. 누군가 이 책을 팔려고 헌책방에 찾아오면, 헌책방 일꾼들은 ‘요새는 이런 책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살 수 없어요.’ 하고 손사래를 칠 만한 작은 책입니다. 책이름은 《경기남부 노동조합 임금인상 대책위원회 엮음-노동자는 왜 싸워야 하는가》(사계절,1988)입니다.
― 그러면 왜 기업주는 물건을 만들어 팔면 돈을 벌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았을 때 비로소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되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남을 부려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돈을 버는 원천이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비결입니다. (47쪽)
2004년에 우리 말로 옮겨진 책 하나를 책상맡에 두고 가끔 들춰보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책상맡에 두었는데. 아직도 다 안 읽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책상맡에서 떠나보내기 싫어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어서 읽어치우고 새로운 책을 읽어도 나쁘지 않지만,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 책을 생각하고 싶어서 빨리 읽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알아보는 이가 많지 않아서 누군가라도 소개하는 글 하나 끄적여 주지 않으면 그예 잊혀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늘 보고 있으니 날마다 기쁨과 고마움을 얻어 가집니다만.
하이타니 겐지로 님이 일본에서 1981년에 펴냈던 《내가 만난 아이들》(양철북)이라는 책입니다.
― 인간의 상냥함이나 낙천성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분명 어딘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다른 사람의 상냥함이나 낙천성을 흙발로 짓밟는 일일 것이다. (69쪽)
일본에서도 《내가 만난 아이들》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쉽게도 판이 끊어져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우리 나라에는 스물세 해 만에 알려지며 읽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살아남으며 읽힐 수 있을까요.
책상맡 오른쪽에는 《내가 만난 아이들》이 있고, 왼쪽에는 《구스따보 구띠에레즈/김명덕 옮김-우리네 목마름은 우리 샘물로》(한마당,1986)가 있습니다. 종교에 크게 눈길을 안 두던 때에도 해방신학 책을 곧잘 사다 읽었고, 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요즈음도 해방신학 책이 보이는 대로 마련해서 조금씩 읽어 보고 있습니다. 앞에 ‘해방’이 붙었든 안 붙었든 ‘신학’입니다. 뒤에 ‘신학’이 붙었든 안 붙었든 ‘해방’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 착취와 가난에 희생 제물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려는 자는 누구나 그같은 문제의식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31쪽)
곰곰이 돌이켜보니, 예나 이제나 대통령으로 뽑힌 이들이나 국회의원이 된 이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을 외쳤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지키려는 정책을 외친 적은 없다고 느낍니다.
사람에 따라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골목길 허름하다고는 해도 조용하며 오붓한 터전에서 옆집 사람하고 이웃하면서 떡이며 밥이며 술이며 김치며 나눠먹고 살고픈 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논밭을 일구며 제힘으로 밥과 옷과 집을 풀어내며 살고픈 이가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거나 공무원 일을 하면서 다세대주택에서 알맞는 전세집 얻어서 살고픈 이도 있습니다. 전통 기와집에서 살고픈 이가 있고, 흙으로 지은 집에 풀로 지붕을 얹어서 살고픈 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나라 정책은 ‘아파트만 우걱우걱 지어내려는 데’로만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안 지켜 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나 아닌 사람이 나와는 다르게 살아가려는 터전’을 고이 껴안으려는 매무새를 잃어가거나 내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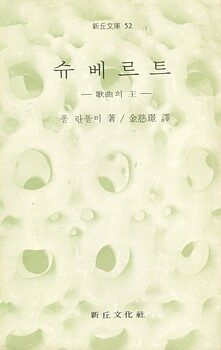
히유, 한숨 한 번 쉰 다음, 모니터 옆에 살짝 기대어 놓은 손바닥책을 잡아서 펼칩니다. 《폴 란돌미/김자경 옮김-슈베르트》(신구문화사,1977)입니다. 신구문화사 손바닥책은 1989년쯤인가 재판을 한 번 찍은 뒤로는 싹 자취를 감추었지 싶습니다. 그 뒤로 한 번 더 찍은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슈베르트가 서먹서먹해 한 곳은 에티켓이 까다롭고 격식만 따지는 상류사회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묵묵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구석에 숨어 있었다. (71쪽)
슈베르트 노래를 아는 이 많을 테며, 슈베르트 노래가 흐르는 ‘고급스러운 까페와 공연장이나 미술관’ 또한 꽤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슈베르트 삶과 생각을 알면서 슈베르트 노래를 듣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슈베르트가 어떤 마음으로 옥구슬 같은 노래를 지어냈는지 차근차근 짚으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얼마쯤 있을까요.
오늘 모처럼 날이 풀립니다. 해가 반짝입니다. 다만, 바람은 퍽 부네요. 책상맡에 가득가득 쌓인 낡은 책에는 이만 눈길을 접고, 내 사는 동네에 있는 할배 헌책방들에 꽂혀 있는 낡은 책을 구경하러 나들이를 가 보아야겠습니다. 등짝으로 햇살을 느끼면서 두 눈과 두 손으로는 낡은 종이장을 느끼며 머리를 식히고 싶습니다. (4341.1.23.물.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