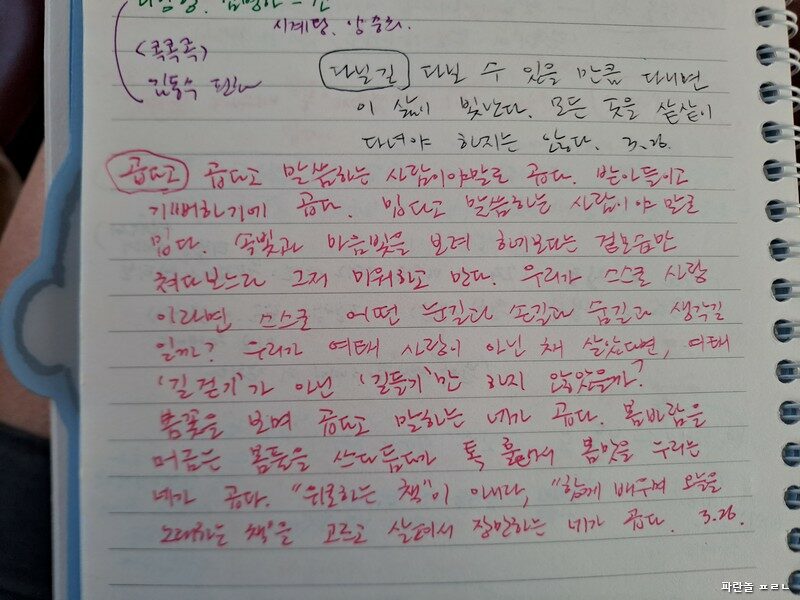숲노래 살림말 / 숲노래 책넋
2025.3.26. 두 시간 기다리기
시골에서는 두어 시간에 슥 지나가는 버스를 타려고 여러 시간 앞서부터 집일을 하면서 때를 살핀다. 나가는 시골버스와 들어오는 시골버스는 딱 하나씩이다. 이때에 맞추어서 모든 읍내볼일을 바람처럼 휘날리며 빈틈 하나 없이 후루룩 마쳐야 한다. 1분조차 허투루 못 보내는 시골길이다. 게다가 2022년 즈음부터 일요일과 공휴일 시골버스가 차츰 줄더니 2025년에는 아예 안 다니다시피 한다.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뿐 아니라, 순천·강릉·구미·춘천·진주·전주 같은 큰고장에서 “버스 안 다니는 일요일”을 생각할 수 없겠지. 오늘날 시골사람은 자가운전을 안 하면 ‘다리꽃(이동권)’조차 없는 셈이다.
서울 부산 인천으로 바깥일을 보러 길을 나서면, 눈앞에서 지나가려는 버스나 전철을 그냥 즐겁게 보낸다. 조금 있으면 뒤이어 널널한 다른 버스나 전철이 올 테니까.
고흥으로 돌아가는 오늘은 가운터(센트럴시티)에서 두 시간 남짓 서서 고흥버스를 기다린다. 다섯 시간이 안 되도록 엉덩이를 붙여야 하니까 기꺼이 서서 기다리며 밖에서 해바라기를 한다. 고흥읍에 닿으면 택시를 불러야 한다. 시골에서 면허증 없이 살려면 오래오래 기다린다.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려면 시골사람처럼 살림하면 된다. 길에서 오래오래 서서 기다려야 하니 다릿심을 저절로 기르며 늘 튼튼할 뿐 아니라, 따로 운동을 할 까닭이 없고, 쓰거나 읽을 틈이 허벌나게 많을 뿐 아니라, 언제나 해바람비를 온몸으로 맞아들이기에 숲빛을 스스로 읽을 만하다.
우리집 네 사람은 날씨알림을 아예 안 보고 안 듣지만 날씨를 미리 알 뿐 아니라 바꾸는 길도 안다.
봄볕이 뜨뜻하고 곱다. 시외버스는 더워서 땀이 난다. 맨뒤에 앉아서 미닫이를 연다. 별돋을 무렵에 읍내에 닿아서 택시를 부르면, 보금자리에는 깊은저녁에 들어설 테지. 뉘엿뉘엿 해가 기우는 모습을 바라본다. 다시 졸립다.
집에 닿으면 쓰러져 곯아떨어질 테니 아직 기운이 남은 이즈음 글조각 하나를 얼른 남겨놓는다.
ㅍㄹㄴ
※ 글쓴이
숲노래·파란놀(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