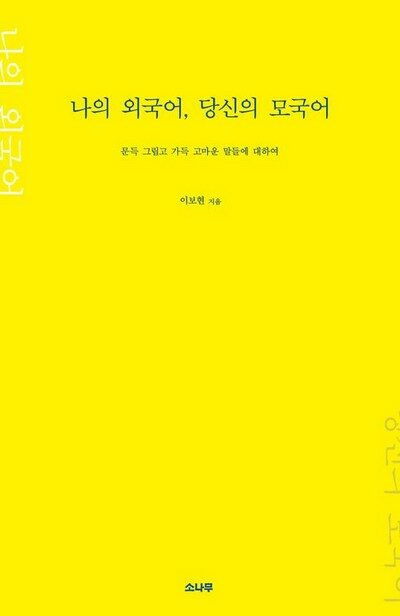-

-
나의 외국어, 당신의 모국어 - 문득 그립고 가득 고마운 말들에 대하여
이보현 지음 / 소나무 / 2022년 12월
평점 :



숲노래 책읽기 / 인문책시렁 2024.12.23.
인문책시렁 384
《나의 외국어, 당신의 모국어》
이보현
소나무
2022.12.5.
우리한테는 말이 있어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말이 없던 고요누리에서는 누구나 으레 눈빛을 거쳐서 마음을 나누었고, 모두 한마음이었다고 여길 만합니다. 눈빛은 눈을 뜨면서 곧장 온누리로 퍼지는 빛살입니다. 눈깜짝 하는 사이란, 온누리가 번쩍 태어나는 겨를입니다.
고요한 빛누리에서 한동아리로 어울리던 마음이던 ‘나’는 어느 날 문득 눈을 뜨면서 ‘나(내)’ 곁에 누가 있는 줄 알아봅니다. 또다른 나이자, 서로 바라보는 사이인, 마주하는 ‘남’인 ‘너’입니다. 나는 날듯 너(네)가 있는 너머로 갑니다. 바야흐로 나랑 너 사이를 넘나드는 길을 엽니다. 너나없던 고요누리에서 너나있는 북적누리로 바뀌니, 이제부터 마음을 소리로 옮겨서 주고받기로 합니다. 바로 말이 태어납니다.
《나의 외국어, 당신의 모국어》는 두 말 사이에서 두 마음이 오가는 동안 보고 듣고 겪고 배우는 나날을 그리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국어·외국어’처럼 일본 글바치가 여민 한자말을 흔히 쓰기는 하는데, ‘우리말·겨레말·배달말·엄마말·한말’ 같은 이름을 새롭게 쓸 만하고, ‘다른말·바깥말·이웃말·너머말’ 같은 이름을 맞물려 쓸 만합니다.
나로서 바라보니 너를 느낍니다. 너로서 마주하니 나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서로 어느 곳에 서느냐에 따라 ‘나·너’를 넘나듭니다. 으레 한자말 ‘당신’을 살짝 높인다거나 살짝 낯선 누구를 가리킬 적에 쓴다고 여기는데, 우리말로 본다면 그저 ‘너’라 하면 되고, ‘그대·자네·이녁’이라든지 ‘그쪽·저쪽·이쪽’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겨레말은 다 다른 터전에서 다 다르게 삶을 일구는 동안 다 다른 눈빛이랑 손길을 거쳐서 태어납니다. 얼핏 보면 다 다른 삶터에서 다 다르게 깨어난 삶말이자 살림말인 바깥말일 테지만, 나랑 너부터 한말을 쓰더라도 한삶이기보다는 다른삶이듯, 우리나라하고 이웃나라 사이에 결이 다른 말은 ‘다른말’이기도 하면서 새록새록 ‘이웃말’입니다.
서로 이웃말이기에, 이웃으로서 어떤 말을 쓰는지 살피고 익혀서 삶과 살림을 주고받고 헤아리고 품고 받아들이고 나눕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얼거리와 길과 틀거리와 짜임새를 차근차근 바라볼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 한자말이나 중국 한자말이기에 안 써야 하지 않고, 영어라서 굳이 가려야 하지 않습니다. 일본말씨에 옮김말씨를 털거나 씻는다면 깔끔하겠지요. 다만, 말이 왜 ‘말’이라는 꼴이고, 마음이 왜 ‘마음’이라는 꼴이며, ‘나·너’가 왜 ㅏ 다르고 ㅓ 다른 꼴로 나란한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냥그냥 나랑 다르다고 여기면 이웃말이나 다른말조차 아닌 ‘남말’입니다. 나하고 너를 새롭게 잇는 다리처럼 주고받는 소리로 여기기에 ‘이웃말’이자 ‘너머말’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머로 가기에, 너머에 있는 네가 어떤 살림(문화·생활·환경)을 누리는지 지켜보고 같이 누리면서 바야흐로 사랑을 알아차립니다. 말이란, 삶에서 비롯하여 살림을 이루는 바탕으로 너울거리다가 사랑을 깨닫는 빛씨로 싹트는 동안 서로서로 즐겁게 어우르는 즐거운 소릿가락입니다.
아이 곁에 서서 말부터 새롭게 바라보기를 바라요. 어른끼리 주고받는 말이라 하더라도, ‘어른끼리 주고받는 말’로 그치지 않는 줄, 바로 ‘머잖아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서 물려받는 말’인 줄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말부터 차곡차곡 일구는 사람이 이웃말을 싱그럽게 웃는 눈짓으로 맞아들이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ㅅㄴㄹ
나는 주변 사람들과 문화를 놓치고 있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단지 독일어라는 작으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과 독일 문화였다. (22쪽)
지방에서 온 우리는 서로의 사투리로 장난을 치며 친해졌다. 사투리는 지방 고유의 색을 나타내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담기도 한다. (64쪽)
외국어로 버텨낸 아이가 다시 모국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77쪽)
정작 나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들은 간단하고 간편한 단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블랑쇼, 푸코, 들뢰즈 논문 안에 들어 있는 단어들로 커피를 시키지 않는다. (99쪽)
번역을 하면서 자주 떠올린 것은 할머니의 말이다. 등을 쓸어내리며 내 마음을 읽어낸 그날의 말을 꺼내고 자주 번역 작업 앞에 세워 둔다. (123쪽)
+
《나의 외국어, 당신의 모국어》(이보현, 소나무, 2022)
내가 만난 사람의 이름, 그 장소의 명칭 그리고 나눈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들
→ 내가 만난 사람 이름, 그곳 이름, 나눈 살림을 가리키는 말
5
모국어와 외국어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언어로 살아가는 삶보다
→ 우리말과 바깥말로 살자면 말 하나로 살기보다
→ 엄마말과 이웃말로 살기란 한 가지 말살림보다
6
여행 가이드를 남편과 내가 자진하고 나섰다
→ 마실 길잡이를 곁님과 내가 나선다
→ 곁님과 내가 나들이 길잡이를 나선다
13
하원 길에서 아이는 어느 때보다 더 느리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 아이는 돌아가는 길에 어느 때보다 느리게 집으로 걷는다
20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이올린을 기내에 실어 가져갔다
→ 다시 베를린으로 가는 길에 가락활을 실었다
→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길에 활가락을 가져갔다
29
할머니에게 물려받았다
→ 할머니한테서 받았다
→ 할머니가 물려주었다
30
같은 모어를 쓰는 사람이었겠지
→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겠지
→ 같은 밑말을 썼겠지
→ 같은 뿌리말을 썼겠지
41
이제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며 선택사항을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 있다
→ 이제는 누름판으로 시키며 여러 가지를 고르거나 바꿀 수 있다
59
지방에서 온 우리는 서로의 사투리로 장난을 치며 친해졌다. 사투리는 지방 고유의 색을 나타내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담기도 한다
→ 시골에서 온 우리는 서로 사투리로 장난을 치며 사귀었다. 사투리는 시골빛을 나타내면서 서로 다른 마을을 헤아리는 징검다리이다
64
그들은 간단하고 간편한 단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 그들은 쉽고 짧게 이야기를 한다
→ 그들은 단출하고 가볍게 얘기한다
99
타인의 신발을 신어 본다는 것은 그토록 진중함을 요하는 것이다
→ 이웃 신발을 꿰어 보면 그토록 무게를 느낄 수 있다
→ 다른 신발에 발을 넣으면 그토록 묵직하다
109
번역을 하면서 자주 떠올린 것은 할머니의 말이다
→ 이웃말을 옮기며 할머니 말을 자주 떠올린다
123
나의 어린 선생님을 떠올렸다
→ 내 어린 스승을 떠올린다
→ 어린 길잡이를 떠올린다
156
보름의 휴가를 내어 독일 남부 지방에서 지내고 있다
→ 보름 쉬며 독일 마녘에서 지낸다
170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