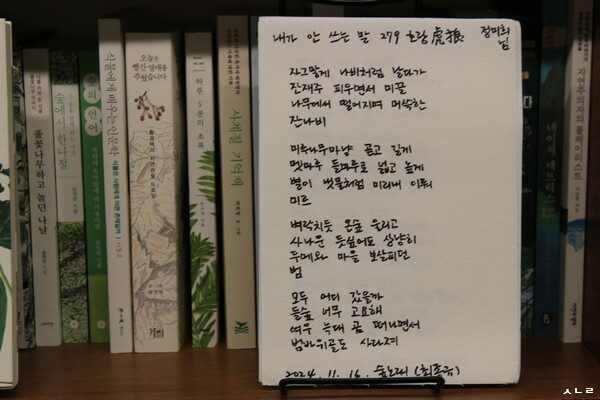숲노래 우리말 / 숲노래 말넋
사라진 말 14 처마 2024.9.14.
처마가 없는 집이 부쩍 늘었기에 ‘처마’라는 말소리를 들은 바 없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골목집이나 시골집에서 지낸 적이 없으면 더더구나 ‘처마’를 알 길이 없다. ‘초리’처럼 지붕 끝이 살며시 나온 곳인 처마요, 집을 이루는 곳에서 처음인 길로 여길 처마이다. 처마에 붙여서 ‘처마종’이다. 처마종은 바람이 불면 살살 춤을 추면서 소리를 낸다. 처마에 붙인 작은 쇠라서 ‘처마쇠’이고, 꽃이나 새나 물고기 모습으로 꾸며서 ‘처마꽃·처마새·처마물고기’이다. 처마끝에서 모이며 떨어지는 물이니 ‘처맛물’이다. 처마를 모르는 탓에 ‘낙숫물(落水-)’ 같은 겹말을 잘못 쓰는 분이 제법 있다. 한자말 ‘낙수 = 떨물·떨어지는 물’이기에, ‘낙수 + 물’처럼 쓸 수 없다. 비가 오면 빗방울이 처마에 부딪히고 모이면서 떨어진다. 처마 밑에 서면 비를 긋는다. 제비는 처마 밑에 둥지를 짓는다. 참새는 아예 처마 둘레에 구멍을 내어 서까래에 둥지를 엮곤 한다. 이제는 굳이 한집(한겨레집)을 지어서 살아야 하지 않으니, 처마가 없는 집에서 살며 처마를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처마를 조금 내기에 집채가 아늑하다. 처마가 빗물을 튕겨 주기에 집채가 고스란하다. 큰고장에 가득한 ‘아파트·빌라’에는 처마가 아예 없다시피 하기에 바깥담은 늘 눈비에 닳고 햇볕에 삭는다. 집에 처마를 놓으면서 오래오래 건사하는 셈이다. 집에 처마가 있기에 누구나 처마 밑에서 비를 긋거나 해바라기를 하면서 가볍게 쉴 만하다. 처마가 있으니 작은새도 깃들어 노래를 베푼다. 살림자리에서 쓰는 이름 하나가 사라질 뿐일까? 살림을 하는 뜻이 나란히 잊히면서 살림 한켠이 사르르 닳거나 삭아서 사라지는 셈이지 않을까? 처마를 낸 오랜 골목집이나 시골집은 두온해(200년)도 닷온해(500년)도 너끈하지만, 다른 집은?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