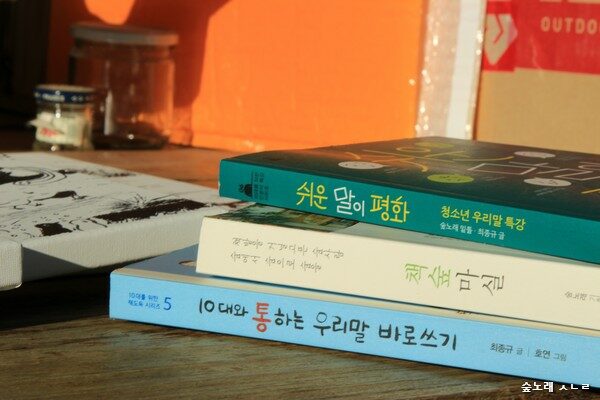국어사전을 쓰는 사람한테는
공휴일도 주말도 없고
주5일이나 8시간노동도 없다.
그저 365일 내내 일에 또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물결이 일듯 즐겁게 일어나는
하루노래로 여기려고 한다.
한글날을 앞두고 즐겁게 읽어 보시기 바라며,
조금 더 깊이 헤아리고 싶다면
<우리말꽃>을 비롯한 숲노래 씨 책을
사서 읽으면 된다.
...
숲노래 우리말 / 숲노래 말넋
말꽃삶 20 집옷밥 밥옷집 옷밥집
저는 어른이란 몸을 입은 오늘날에도 ‘의’를 소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동안 생각하고 가다듬고서야 비로소 ‘의’를 소리냅니다. 혀짤배기에 말더듬이란 몸으로 태어나고 자란 터라, 어릴 적에는 더더욱 고단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요새는 둘레에서 이모저모 ‘입 속에서 혀랑 이를 어떻게 놀리면 되는가’를 밝히거나 알려주는 이웃을 쉽게 만날 만하고, 지난날에는 ‘‘의’를 비롯한 여러 소리를 어떻게 내면 되는가’를 차근차근 보여주거나 알려준 이웃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을식주 으식주
‘을식주’는 무엇이고 ‘으식주’는 뭘까요? 제가 어린배움터(국민학교)를 다니던 1982∼87년 무렵에는 날마다 시키고 때리는 길잡이(교사)가 많았습니다. ‘시험’이란 이름이 붙은 일도 끝이 없었는데, ‘중간시험·기말시험’뿐 아니라 ‘월말시험·쪽지시험’이 꼬박꼬박 뒤따랐어요. 어느 갈래 어느 시험인지는 어렴풋하지만, ‘의식주’로 풀이(답)를 적어야 하는 일(문제)이 있었고, 적잖은 또래는 ‘을식주·으식주’처럼 틀린 풀이를 적었습니다.
예전 배움터에서는, 이처럼 틀린 풀이를 적으면 길잡이가 종이(시험지)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틀린 풀이를 적은 아이’를 자리에서 일으켜세웠어요. “야, 이게 뭐냐? 넌 우리말도 몰라? 어떻게 ‘의’를 ‘을’로 적을 수 있어?” 하고 꾸짖으면서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때 틀린 풀이를 안 적었기에 놀림감이 안 되고 얻어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글로 적는 일’은 틀리지 않았으나, ‘입으로 소리를 내는 일’은 으레 버벅거리거나 헤맸어요.
옷밥집
한자말 ‘의식주’를 우리말로 옮기면 ‘옷밥집’입니다. 저는 혀짤배기에 말더듬이입니다만, 우리말 ‘옷밥집’은 소리가 안 새면서 말할 수 있고, 더듬지 않고도 수월하게 소리를 낼 만합니다.
아스라한 지난날이기는 합니다만, 1982∼87년 그무렵 어린배움터에서 ‘의식주’가 아닌 ‘옷밥집’을 적으라 했으면, 동무들도 ‘을식주·으식주’ 사이에서 틀리지 않고 똑똑히 ‘옷밥집’을 적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밥집옷’이나 ‘밥옷집’으로, 또는 ‘옷집밥’이나 ‘집밥옷’이나 ‘집옷밥’으로 적기도 했을 테고요.
밥옷집
남녘에서는 한자말로 ‘의식주’라 하고, 북녘에서는 한자말로 ‘식의주’라 합니다. 그런데 남북녘은 서로 옳다고 티격태격합니다. 얄궂은 노릇입니다. 옷을 먼저 적든 밥을 먼저 적든 무엇이 대수로울까요.
남북녘은 ‘의식주·식의주’ 사이에서 다툴 까닭이 없어요. ‘옷밥집·밥옷집’ 모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올림말(표준말)을 하나만 세워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단출히 아우르는 낱말을 여섯 가지 올려놓아도 즐겁고 아름다우면서 알뜰합니다.
‘옷밥집·옷집밥’에 ‘밥옷집·밥집옷’에 ‘집옷밥·집밥옷’을 저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즐겁게 쓸 수 있으면 넉넉합니다. 남북녘은 누가 옳거니 그르거니 싸우거나 다투거나 겨루거나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되어요. 서로서로 우리 살림살이를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도란도란 북돋울 노릇입니다.
[숲노래 낱말책]
밥옷집 (밥 + 옷 + 집) : 밥과 옷과 집. 살아가며 누리거나 가꾸거나 펴는 세 가지 큰 살림을 아우르는 이름. 살아가며 곁에 두는 살림살이. (= 밥집옷·옷밥집·옷집밥·집밥옷·집옷밥. ← 의식주, 식의주)
낱말풀이를 할 적에 ‘나란히 쓸 낱말’을 붙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자말이나 영어를 손질하거나 풀어내었는지 덧붙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어느 한 낱말로 가리키겠지요. 그런데 온누리에는 한 사람만 살지 않아요. 숱한 사람이 살고, 숱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한 가지이되, 다 다른 숱한 사람이 바라보는 터라 온갖 말이 태어나거나 깨어나거나 자라날 만합니다.
넉넉히 즐겁도록 여러 말씨를 품고 돌아보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도 즐기고 옷도 누리고 집도 돌보면 됩니다. 옷도 짓고 밥도 짓고 집도 지으면 됩니다. 우리 집을 추스르고 우리 밥을 나누고 우리 옷을 펴면 되어요.
바르다 곧바르다 올바르다 똑바르다
‘바르다’ 하나를 놓고서 여러 낱말이 가지를 뻗습니다. 바탕은 ‘바르다’인데, ‘곧-’을 붙이느냐 ‘올-’을 붙이느냐 ‘똑-’을 붙이느냐에 따라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바르다’를 알맞게 살피면서 마음도 생각도 삶도 새록새록 가꿀 만합니다.
여기에 새말을 슬며시 얹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뜻바르다’나 ‘꽃바르다’나 ‘길바르다’나 ‘삶바르다’나 ‘사랑바르다’나 ‘참바르다’라 할 수 있어요. 뜻이 바르고, 꽃처럼 바르고, 길이 바르고, 삶이 바르고, 사랑스레 바르고, 참다이 바르다는 뜻으로 새말을 여밀 수 있습니다.
‘바른길·바른넋·바른꿈·바른말·바른몸·바른짓·바른일·바른빛·바른꽃·바른숲’처럼 ‘바른-’을 앞에 놓고서 뒷말을 바꾸어 볼 만합니다. ‘꽃바른넋·꽃바른꿈’처럼 앞뒤에 한 마디씩 붙이는 새말을 여미어도 즐겁습니다.
꽃 + 바른 + 말
뜻을 즐거우면서 곱게 담아서 소리를 내기에 수월하도록 엮는 말씨를 지어 봅니다. 누구나 살찌우는 말살림입니다. ‘입바른말(입바른소리)’을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꽃바른말’을 하고 싶습니다. ‘꽃바른길’을 걷고 ‘꽃바른일’을 하면서 ‘꽃바른숲’으로 보금자리를 보듬고 싶습니다.
‘꽃다운삶’을 누리고 ‘꽃다운날’을 보내면서 ‘꽃다운글’을 쓸 생각입니다. 이리하여 ‘꽃담은삶’으로 나아가고 ‘꽃담은날’을 노래하면서 ‘꽃담은글’을 펼 만하지요.
철이 들어 상냥하면서 어질게 빛나는 사람이기에 ‘어른’입니다. 나이만 먹을 적에는 ‘어른’이 아닌 ‘늙은이’입니다. 철들고 빛나는 수수한 ‘어른’이어도 아름다울 테고, 철들고 빛나면서 곱게 ‘꽃어른’으로 설 수 있다면 새삼스레 반가워요.
꽃아이 곁에 꽃어른이 있으니, 서로 꽃사람입니다. 봄꽃을 사랑하는 봄꽃사람은 봄꽃마음으로 서로 만나면서 봄꽃글을 주고받습니다. 늦은꽃은 고즈넉하고, 이른꽃은 의젓합니다. 아침꽃은 해사하고, 저녁꽃은 그윽합니다. 꽃별처럼 초롱초롱한 마음이요, 꽃숲처럼 향긋하게 살리는 터전입니다.
풀꽃책
저는 ‘식물도감’을 펴지 않습니다. 으레 ‘풀꽃책’을 폅니다. 풀꽃나무를 담은 책이면 ‘풀꽃나무책’이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풀꽃을 밥으로 삼으니 ‘풀밥·풀꽃밥’입니다. 굳이 ‘채식·비건’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푸른밥’을 먹고 ‘풀빛밥’을 나눕니다. ‘푸른글·푸른말’을 헤아리면서 ‘푸른책·풀꽃책·숲책’을 옆구리에 끼고서 들길을 걷고 숲길을 지납니다.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숲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