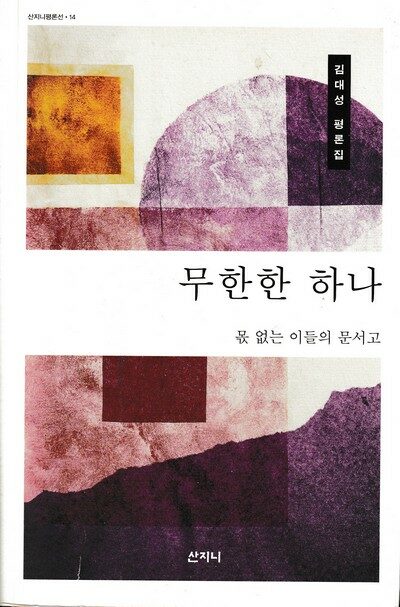-

-
무한한 하나 - 몫 없는 이들의 문서고 ㅣ 산지니평론선 14
김대성 지음 / 산지니 / 2016년 10월
평점 :



숲노래 책읽기 / 인문책시렁 2024.8.29.
인문책시렁 341
《무한한 하나》
김대성
산지니
2016.10.28.
사랑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이라면, 이름 그대로 ‘사랑’이 무엇일까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바라보고 헤아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비록 아직 사랑을 모르고 못 알아채고 못 느낄 수 있어도, 사랑을 품는 길로 한 발짝씩 다가섭니다.
사랑이 아닌 채 시늉이나 흉내나 허울로 꾸미려는 마음이라면, 이 몸짓 그대로 ‘시늉·흉내·허울’로 온통 감싸면서 스스로 물들이거나 망가뜨리는 하루를 쳇바퀴처럼 되풀이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수 있고,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림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 삶을 말과 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오롯이 사랑으로 담는 말과 글이라면, 누구보다도 말님과 글님부터 홀가분하면서 환합니다. 시늉과 흉내와 허울로 감싼 말과 글이라면, 바로 말꾼과 글꾼부더 수렁에 잠긴 채 쳇바퀴에 갇힙니다.
《무한한 하나》(김대성, 산지니, 2016)를 읽으면서 ‘말씀’과 ‘목소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굳이 일본스런 한자말인 ‘비평·평론’을 들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일본스런 한자말인 ‘비평·평론’을 자꾸 들추는 사이에 우리 삶길과 살림길과 사랑길하고는 동떨어진 겉치레와 겉발림과 겉글에 붙들리는구나 싶습니다.
글을 읽을 적에는 “누가 쓴 글”인지 짚되 “누가 쓴 글”이더라도 오직 속빛을 읽어낼 노릇입니다. “누가 쓴 글”이기 때문에 속빛읽기를 안 하면서 겉훑기만 하기에 으레 ‘주례사비평’이 불거질 뿐 아니라 ‘일본 한자말과 영어를 뒤섞은 뜬금없는 빈글잔치’가 넘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누가 쓴 글’이라서 훌륭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누가 쓴 글’이라서 꾀죄죄하거나 추레하지 않습니다. 속빛이 알뜰하기에 알뜰할 뿐이고, 속빛이 후줄근하니까 후줄근할 뿐입니다.
어린이는 어느 글을 읽든 ‘누가 쓴 글’인지 안 따져요. ‘읽을 만한 글’인지 ‘즐거운 글’인지 ‘아름다운 글’인지 가려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비평가·평론가’가 있다면, 주례사비평이란 처음부터 없었겠지요. 어린이 눈길로 글과 그림과 빛꽃(사진)을 읽는 터전이 자리잡았다면, 어렵게 꼬거나 뒤틀어 놓은 얄궂은 말글은 아예 얼씬조차 못 했으리라 봅니다.
하늘은 가없이 하나입니다. 바다는 끝없이 하나입니다. 별도 바람도 빗방울도 이슬도 그지없이 하나입니다. 마음도 오롯이 하나요, 숨결도 언제나 하나예요. 어떻게 왜 어디에서 무엇이 누구랑 하나인지 들여다보려고 다가갈 적에는 누구나 스스로 눈길을 틔우고 귀를 열어서 환하게 알아봅니다. 가없이 하나인 수수께끼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으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말아요.
꾼(전문가)으로 서야 글읽기(문학비평)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삶글을 밝힐 적에 아름답습니다. 꾼(교수·작가)이라는 이름을 얻어야 글쓰기(문학창작·비평)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품으면서 살림글을 나누려는 눈빛이기에 즐겁게 글길을 폅니다.
꾼말과 꾼글이 온누리를 휘감는 꾸밈말과 꾸밈글 울타리는 그놈이나 저놈이 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우지요. 스스로 살펴야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걸어야 스스로 마을과 집과 나라를 가꿉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저마다 즐거우면서 새롭게 나날이 차근차근 하면 될 일입니다.
ㅅㄴㄹ
학연과 지연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어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세계에서, 애와 연대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준다지만 위계화되어 있는 그 힘이 언제라도 서로를 옭아매는 ‘개미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8쪽)
이 두 작가의 소설들이 구체적 현실을 너무나 손쉽게 뒤섞어 버림으로써 현실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간과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83쪽)
갑작스레 나타나 삶을 뭉텅뭉텅 잘라가 버리는 날카로운 이빨은 특정한 장소에 잠복해 있는 위험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것과 접속할 수 있는 접촉면이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200쪽)
쓴다는 것 또한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다. 쓰기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며 어딘가에 ‘빠져야’ 글쓰기가 가능하다. (209쪽)
일상에서 낯선 것들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는 시인 또한 공동체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이임에 틀림없다. (319쪽)
우리가 지금껏 ‘귀’로 했던 일들을 어떤 이는 ‘손’으로 해왔다. (367쪽)
+
만나기 위한 애씀의 노동이다
→ 만나려고 애쓰는 일이다
→ 만나고 싶어 애쓰는 일이다
9
부산으로 내려와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다
→ 부산으로 와 막일로 살림을 꾸리다
→ 부산으로 와서 삽일로 집안을 꾸리다
15
위성도시에 파견된
→ 이웃마을로 보낸
→ 달고을로 맡긴
51
철 지난 유행어가 영속하고 있는 시대를 주관하는 새로운 강령임을 알고 있는
→ 철지난 뜬말이 그대로인 나날을 다스리는 새로운 금인 줄 아는
→ 철지난 바람말이 늘 있는 오늘을 다루는 새로운 길눈인 줄 아는
58
환형동물인 지렁이는 온몸으로 감각한다는 점에서
→ 마디살이인 지렁이는 온몸으로 느끼기에
→ 마디짐승인 지렁이는 온몸으로 느끼기에
188
이 꾸준함의 행보가 내겐
→ 나한텐 이 꾸준한 걸음이
→ 나한텐 이 꾸준한 길이
196
브레이크, 커브, 요철이라는 문턱을 넘어갈 때마다
→ 멈추고, 돌고, 고랑이라는 턱을 넘어갈 때마다
205
부단히 들썩거리는 존재의 울림이기도 하다
→ 끝없이 들썩거리며 울리기도 한다
→ 자꾸 들썩거리며 울리기도 한다
205
힘없고 약한 것들은 그렇게 발아래서
→ 힘없으면 그렇게 발밑에서
210
이선형이 직조하는 시적 공간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이선형이 땋는 노래터를 또렷이 보여준다
→ 이선형이 낳는 노래뜨락을 환히 보여준다
→ 이선형이 여미는 노래자리를 잘 보여준다
217
사회적 결속이 노정하고 있는 행위를 환기시킨다
→ 이웃과 맺으며 걸어가는 일을 돌아본다
→ 둘레와 맞물려 나아가는 모습을 곱새긴다
226
문자라는 형틀은 사물을 구획하고 절단하며
→ 글씨라는 틀은 모두 나누고 뜯으며
→ 글이란 거푸집은 다 가르고 자르며
230
사물(대상)에 음각(陰刻)되어 있는 흔적들을 세심하게 좇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 그곳에 오목새김을 한 자국을 찬찬히 좇는 길하고 다르지 않다
231
시의 음악성이라는 범박한 틀로
→ 노랫가락이라는 겉도는 틀로
→ 노랫결이라는 두루뭉술한 틀로
234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