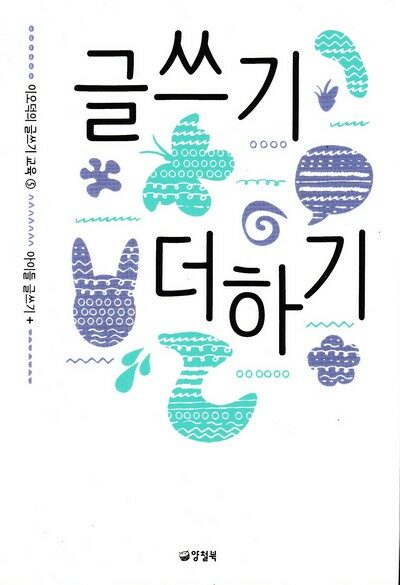-

-
글쓰기 더하기 - 아이들 글쓰기+ ㅣ 이오덕의 글쓰기 교육 5
이오덕 지음 / 양철북 / 2017년 9월
평점 :



이오덕 읽는 하루
― 놀고 일하면서 스스로
《글쓰기 더하기》
이오덕
양철북
2017.9.25.
《글쓰기 더하기》(이오덕, 양철북, 2017)는 예전에 나온 《와아, 쓸 거리도 많네》(1993)하고 《이렇게 써 보세요》(1993)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식산업사’에서는 “이오덕 글쓰기 교실”이란 이름을 걸고서 다섯 자락으로 책을 펴내었는데, 그동안 글삯을 제대로 안 치렀을 뿐 아니라, 얼마나 찍고 팔았는지 이오덕 어른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참다 못한 이오덕 어른은 지식산업서한테 책을 그만 내라고 숱하게 알렸으나 지식산업사는 대꾸를 않고 자꾸자꾸 내놓기만 했습니다.
이오덕 어른은 어린이 누구나 스스로 살피고 생각하고 가다듬어 글빛을 밝히도록 이끄는 꾸러미를 여미었습니다. 곁에서 어른들이 지켜보아도 나쁘지 않되, 어린이 누구나 아무런 눈치를 안 보면서 마음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랐어요. 맞춤길이나 띄어쓰기를 따박따박 챙기기 앞서, 글에 담을 마음을 눈여겨보려 했고, 글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어린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남한테 읽히려고 쓰는 글이지 않습니다. 남이 잘 읽어 주어야 할 글이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내가 되읽으면서 마음을 다독일 글입니다. 나 스스로 오늘을 아로새기는 동안 생각도 숨결도 차분히 추스를 수 있는 글이에요.
병아리는 이따금 ‘삐약삐약·삐악삐악’ 울는지 모르나 늘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가끔 ‘개굴개굴’ 울 수 있으나 늘 이렇게 울지 않아요. 아직 찬바람이 부는 이른봄이나 늦겨울에 멧개구리가 먼저 깨어나는데, 멧개구리 울음소리는 다릅니다. 풀벌레도 저마다 울음소리가 다르고, 같은 메뚜기나 귀뚜라미가 여치나 풀무치여도 서로서로 다르게 울어요.
어른들이 소릿글로 옮긴 대로 울음소리나 노랫소리를 옮겨적을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적으면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본 대로 그리면 됩니다. 우리 다리로 걸어다닌 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 손으로 돌보고 가꾸고 보듬은 대로 담으면 됩니다.
모든 하루는 달라요. 다 다른 하루를 고스란히 쓰면 되기에 쓸거리는 날마다 새롭고 흘러넘칩니다. 모든 삶은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맞이하는 삶을 쓰면 즐거우니 스스로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면서 누린 나날을 차근차근 여미면 돼요.
따로 길잡이가 있어야 글을 쓰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내가 나한테 길잡이입니다. 글쓰기를 하고픈 어린이는 어린이 스스로 길잡이요 읽님(독자)이면서 글동무입니다. 걱정을 하기에 걱정이 피어나고, 골을 부리기에 골부림이 자라납니다. 생각을 하기에 생각이 자라나고, 마음을 기울이기에 마음이 빛나요.
《글쓰기 더하기》라는 이름이 붙어 다시 나온 꾸러미에는, 모든 글빛은 스스로 지으니 늘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스스로 노래하고 꿈꾸면서 붓을 쥐자는 이야기가 흐릅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아요. 가르쳐 줄 어른을 찾지 말아요. 배움터(학교·학원)에 나가야 하지 않습니다. 이 책 저 책 많이 읽어야 글살림을 북돋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에 오늘 이곳을 헤아릴 수 있어요. 어제 하루를 되새기기에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 모레로 가는 길을 알아볼 수 있어요. 새날을 꿈으로 그리면서 마주하기에 가시밭길도 꽃길도 스스럼없이 누비면서 마음 가득 빛줄기가 퍼집니다.
글을 더 많이 쓰기보다는, 하루를 온통 신나게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더 많이 읽기보다는, 집안일을 거들고 밥도 차려 보고 걸레질이며 비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태워 주는 부릉이(자동차)에서 내려 느긋이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마시면서 마을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을 만지면서 풀꽃을 토닥이지 않은 삶이라면 풀도 꽃도 나무도 사귀지 못 하고 만나지도 못 할 뿐 아니라, 풀꽃이며 나무 이야기를 못 씁니다. 책이나 그림으로 만나는 새나 풀벌레로는, 새나 풀벌레가 사람 곁에서 어떤 이웃인지 알 길도 없을 뿐 아니라, 숲빛 이야기를 마음으로 삭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빗방울을 손바닥에 얹어서 가만히 보는 동안 비내음을 글로 옮겨요. 눈송이를 혓바닥으로 받아서 슬며시 맛보는 사이에 눈꽃을 글로 얹어요. 마음을 더하는 글이고, 생각을 더하는 글이며, 사랑을 더하는 글입니다. 어른스럽게 쓰는 글이란, 멋있는 글이나 똑똑한 글이나 자랑하는 글일 수 없습니다. 어른스러이 일구는 글이란, 삶을 그리고 살림을 담고 사랑을 노래하는 글입니다.
아이 곁에서 함께 붓을 쥐고 종이를 펴 봐요.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모든 시끌벅적한 부스러기는 내려놓고서 맨발로 풀밭을 디디면서 맨손으로 나무줄기를 쓰다듬는 하루를 살아내고서 글 한 줄을 써 봐요. 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바다에서 피어나 구름이 되어 찾아온 물빛’을 느끼면서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비가 와서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온누리 티끌을 맑게 씻어 줍니다. 바람이 불어서 춥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온누리 먼지를 훅훅 털어 줍니다.
어른으로서 어린이한테 알려주고 읽힐 글이란, 햇볕을 담고 빗물을 싣고 바람을 품은 글이어야지 싶습니다. 어른으로서 먼저 스스로 읽고서 어린이랑 나눌 글이란, 풀꽃나무를 곁에 두면서 들숲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싹트는 글이어야지 싶습니다.
ㅅㄴㄹ
개구리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는 사람다운 마음이 이 글을 쓰게 한 것이지요. 사람다운 마음은 이와 같이 세상의 참모습을 보게 하고, 훌륭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29쪽)
이런 모든 소리를 기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 듣고, 그렇게 들은 것을 그대로 글에 옮겨 적으면 그 글은 살아납니다. (35쪽)
별난 일, 놀라운 일이라야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겪는 평범한 일이 가장 좋은 글감입니다. (61쪽)
도시 문명을 만들어 살던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정복’이란 말은 나쁜 것들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자연이 왜 나쁠까요? 사람은 자연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을 먹고 마시고 숨쉬고 그 자연에 안겨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125쪽)
우리는 누가 쓴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판단해서 그 글의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233쪽)
요즘은 어린이들도 어른들 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텔레비전과 신문과 책으로 어른들이 하는 유식한 말(이게 바로 병든 말입니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말을, 산과 들에서 뛰어놀고 일하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책과 텔레비전으로 배우는 것 아닙니까? (290쪽)
아기들도 잘 알 수 있는 말이 좋은 말이고 깨끗한 우리말입니다. 이 ‘미소’란 말은 일본사람들이 쓰는 중국글자말을 따라 잘못 쓰게 된 말입니다. 어른들이 뽐내어 쓰는 유식한 말에는 이와 같이 잘못 쓰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296쪽)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리는 사람.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