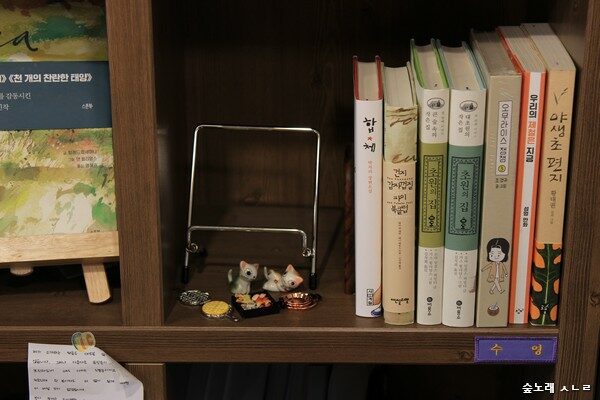숲노래 책숲마실
바람이 된다 (2022.6.21.)
― 인천 〈문학소매점〉
몸을 내려놓으면 바람이 됩니다. 매우 쉬워요. 날마다 흙을 만지고 풀을 쓰다듬고 나무를 품던 옛사람은 누구나 몸을 살며시 내려놓고서 바람이 되는 하루를 누렸으리라 봅니다. 오늘날처럼 온나라가 잿밭(시멘트 도시문명)으로 바뀐 터에서는 따로 ‘요가학원·명상학원’쯤 드나들어야 겨우 ‘몸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구나’ 하고 느낄 테고요. 풀꽃나무를 오롯이 품는 살림길이라면 아무런 배움터(학교·학원)가 없어도 보금자리숲이 고스란히 배움자리입니다.
곧잘 “요즘 아이들(어린이·푸름이) 말씨가 너무 거칠지 않나요?”라든지 “요즘 아이들 인터넷용어가 문제이지 않나요?” 하고 묻는 이웃님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말씨는 어른들한테서 보고 들으며 배운 말씨예요. 어른들이 거칠게 말하면서 아이더러 거칠게 말하지 말라면 앞뒤가 안 맞아요. ‘누리판(인터넷 세상)’은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누리말(인터넷 용어)을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왜 아이 탓을 하나요?” 하고 되묻습니다.
사랑이 안 넘치는 어른이 어린이한테 막말을 하던걸요. 안 즐겁고 안 상냥한 채 스스로 외롭거나 괴롭거나 슬픈 어른이 어린이라는 숨빛을 알아차리지 않은 채 아무 말이나 하던걸요.
아이를 가르치지 맙시다. 아이한테서 배워요. 어른 스스로 바보나라로 만들었거든요. 아이 곁에서 뉘우칠 일이고, 어른이야말로 참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배워야지 싶습니다.
인천 〈문학소매점〉에 깃듭니다. 여름볕을 후끈후끈 누리려고 볕바른 자리로 걷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볕이 드는 길을 골라서 걷습니다. 여름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볕을 누리니 즐겁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달래는 볕을 쬐니 반가워요.
누구나 저마다 다르게 이 삶이라는 옷을 입고서 스스로 깨어나는 길을 또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서 하루를 맞이한다고 느껴요. 천쪼가리도 옷이요, 몸뚱이도 옷이며, 삶길도 옷입니다. 봄에는 봄빛으로 깨어나는 바람결을 담는 몸이고 싶습니다. 가을에는 가을노래로 번지는 바람빛을 품는 몸이고 싶습니다.
여기에 손수 여민 글 한 줄을 곁에 놓습니다. 이웃이 삶길을 적바림한 책 한 자락을 나란히 둡니다. 마음을 그려낸 말은 ‘말꽃’으로 여밀 적에 서로서로 이바지하고, 생각을 그려낸 글은 ‘글꽃’으로 엮을 적에 두고두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꽃으로, 노래는 노래꽃으로, 오늘 하루 만나니 만남꽃으로, 서로 웃으니 웃음꽃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손꽃을 느끼고 골목에 섭니다.
ㅅㄴㄹ
《사치네 사찰 요리 1》(카네모리 아야미/윤선미 옮김, 소미미디어, 2018.2.13.)
《꿈이 다시 나를 찾아와 불러줄 때까지》(이순자, 휴머니스트, 2022.5.9.)
《눈》(기쿠치 치키/황진희 옮김, 책빛, 2022.1.3.)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리는 사람.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