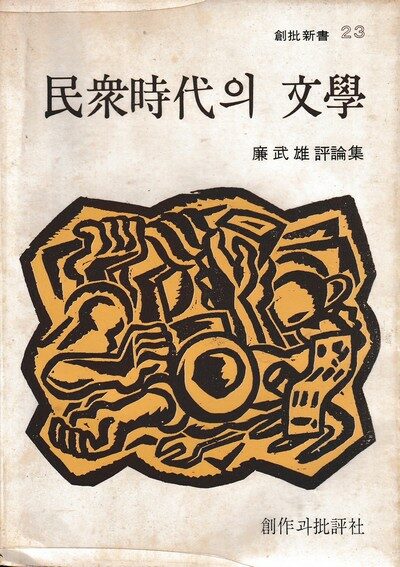숲노래 어제책 2021.12.13.
숨은책 588
《民衆時代의 文學》
염무웅 글
창작과비평사
1979.4.25.
푸른배움터를 다니던 열일고여덟 살에 헌책집에서 처음 《民衆時代의 文學》을 만났습니다. 열 살 무렵에 천자문을 익혔고, 열대여섯 살에 《목민심서》를 한문으로 읽었기에 염무웅 같은 글꾼이 한자를 잔뜩 넣은 글은 하나도 안 어려웠습니다. 다만, 푸른배움터를 통틀어 ‘한자가 새까맣게 박힌 책을 술술 읽는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책을 나누는 여러 동무한테 《民衆時代의 文學》을 빌려주었고, 불꽃을 튀기며 글·삶·사람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무들은 “너무 어려워. 그런 책을 어떻게 읽어? 우리하고 너무 먼 이야기 같아.” 했습니다. 푸른배움터를 마치며 인천을 떠나 서울로 갔고, 서울에서 똑똑하고 잘난 윗내기를 잔뜩 만난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민중’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민중’이란 이름을 안 쓰는구나. 그래, ‘민중’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우리’란 이름을 쓰더라. ‘민중’이란 자리가 아닌 사람만 ‘민중’이란 틀을 붙잡더라.” 줄거리(내용)만 좋대서 글이나 책이 좋을까요? 글쎄, 아니라고 여깁니다. 줄거리가 훌륭하다면, 줄거리로 펼 글도 훌륭할 노릇입니다. ‘훌륭’이란 멋스러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수수한 사람·민중)’가 읽을 ‘우리말’을 쉽고 사랑스레 써야지요.
ㅅㄴㄹ
‘아닌 사람’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보지만,
‘민중·인민·국민·시민’
이런 이름을 붙잡는 사람은
저마다 다르게 권력자요 기득권이면서
거짓말을 하지 싶다.
그저 ‘사람’인 자리로,
‘우리’가 어깨동무하는 자리로,
스스로 ‘들풀·들꽃’이란 자리로,
조용히 바람에 춤추고
햇볕을 나누면서
빗물에 노래할 적에
참말을 하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