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책숲마실
기다리며 지켜보는 (2021.7.18.)
― 제주 〈우생당〉
고흥으로 돌아가는 새벽이 밝습니다. 벼락하고 비하고 바람이 갈마들더니 조용하다 싶으면 구름이 걷혔고, 다시 벼락하고 비하고 바람이 갈마들다가 조용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올 적에는 길바닥이 말끔합니다. 14일에 제주에 닿아 자전거로 움직일 적뿐 아니라, 길손집에 깃들어 빨래를 마치고 거리를 거닐 적에 〈우생당〉 옆을 여러 판 스친 줄 새삼스레 되새기며 천천히 찾아갑니다. 몇 판이나 이 앞을 지나갔으나 책집 코앞에서 무슨 삽질이 한창인 터라, 삽질판에 안 다치도록 자전거로나 두 다리로나 멀찌감치 돌았으니 못 봤네 싶어요.
예전에는 꽤 큼직하게 책손을 맞이한 〈우생당〉일 텐데, 오늘은 “since 1945”라는 글씨만 크구나 싶어요. 어느 고장에나 그 고장에서 책빛을 밝힌 터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 가운데 오늘까지 책살림을 펴는 책집은 드뭅니다. 사라지거나 수그러든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생당〉은 오랜 자취가 있지만, 이곳보다 오래지 않은 헌책집 〈책밭서점〉이 훨씬 넓고 깊게 책을 건사합니다. 더 오래되었기에 책을 더 많이 건사하거나 펼 수 있어야 하지는 않아요. 빈틈없이 건사하거나 눈부시게 다스려야 하지도 않아요. 〈우생당〉다운 이름이 도드라지도록 마을사람하고 나그네한테 빛줄기가 될 책을 차근차근 여미도록 추스르면 좋겠어요.
해가 잘 드는 곳에는 책걸상을 놓고서 책꽂이를 옆으로 물리면 어떨까요. 책이 햇빛에 다치거든요. ‘베스트셀러’라 해도 똑같은 책을 곳곳에 놓기보다는 한켠에만 놓고서 귀퉁이에 곤두박힌 ‘제주 이야기책’을 한복판으로 끄집어내면 좋겠어요. 그림책이나 어린이책은 빽빽하게 꽂을수록 다치기 쉬워요. 어린 손님은 으레 어버이하고 함께 올 텐데, 아이를 이끄는 어버이는 책집까지 오며 힘이 많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림책·어린이책 칸에 나즈막하고 긴 걸상을 놓으면, 아이도 어버이도 쉬면서 ‘책이 덜 다칠’ 만합니다.
제가 한창 책시렁을 돌아보고 골마루를 살필 적에 책집 바깥에서 바퀴걸상(휠체어)에 앉은 분이 서성이면서 두리번거리셔요. 무슨 일인가 아리송했는데, 책값을 셈하면서 밖으로 나갈 적에 저를 부르시더군요. “좀 도와주셔요.” “네? 아? 뒤에서 턱에 받치고 들면 되나요?” 미처 몰랐는데 책집으로 들어서는 턱이 꽤 높고 좁아서 바퀴걸상을 타는 분이 혼자서 들어갈 수 없네요. 그렇다고 손으로 똑똑 두들겨서 알리기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지켜보는 눈길이 있어요. 오래된 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손길이 있어요. 이 모두 한결 느긋하면서 찬찬히 품는 마을책집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ㅅㄴㄹ
《꼬마 할머니의 비밀》(다카도노 호코 글·지바 지카코 그림/양미화 옮김, 논장, 2008.4.15.)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김두엽, 북로그컴퍼니, 2021.5.4.)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나가키 히데히로/서수지 옮김, 사람과나무사이, 20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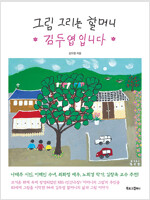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쓰고 “말꽃 짓는 책숲(사전 짓는 서재도서관)”을 꾸린다. 1992년부터 이 길을 걸었고, 쓴 책으로 《곁책》, 《쉬운 말이 평화》,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우리말 동시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시골에서 도서관 하는 즐거움》,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시골에서 책 읽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