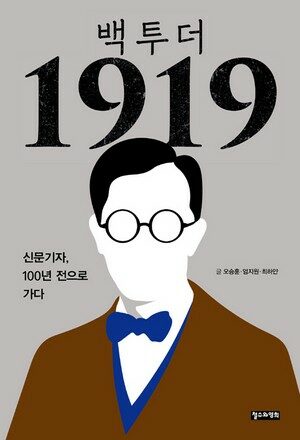-

-
백 투 더 1919 - 신문기자, 100년 전으로 가다
오승훈 외 지음 / 철수와영희 / 2020년 4월
평점 :



숲노래 푸른책
인문책시렁 129
《백투더 1919》
오승훈·엄지원·최하얀
철수와영희
2020.4.11.
식민지 조선에선 쌀값 폭등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일본 동경에서는 ‘돈까스·카레라이스·오무라이스’라는 화양절충 요리가 군부대와 대학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잇따라 관련 음식점들도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67쪽)
총독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한 건 식민통치의 안정화를 위해 친일파들의 존재가 긴요했기 때문이었다. (95쪽)
민중의 고통을 자기 일로 여기며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이나 교사·변호사 같은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어찌 보면 ‘충성스러운 신민’ 말고는 다른 길이 허용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에서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194쪽)
세브란스병원 견습 간호사 노순경(17)은 동기인 김효순(17)·이신도(17)와 종묘 앞에서 만세운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붉은 글씨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만들어 시위를 주도했다가 8호 감방에 끌려왔다. (352쪽)
만세운동의 큰 물결을 이끌어 간 이들은 역시 농민이었다. 조선총독부 자료를 보면 3·1운동 피검자 1만 9525명 중 직업별로는 농업이 55.3%로 가장 많다. (357쪽)
어린 날을 보낸 인천에서는 새벽부터 비둘기나 갈매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1980년대를 돌아보면, 그무렵 나라 곳곳에서 무슨 자리를 꾀할 적마다 ‘평화 상징’이라며 비둘기 날리기를 으레 했고, 그때 풀려난 비둘기는 마을이며 골목 곳곳을 떼지어 날아다녔습니다. 바닷가에 살았으니 갈매기야 고개 들어 하늘만 보면 언제나 보았어요. 철 따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기러기떼나 오리떼도 흔히 보았습니다.
작은아이를 충청도 멧골에 살며 낳았는데, 이때에는 골짝물 소리를 하루 내내 들었어요. 바람이 불어 골짜기 나무를 살랑이는 소리하고 어우러진 물소리는 작은아이를 재우기에 매우 좋았고, 어른으로서도 마음을 달래는 고즈넉한 소리물결이라고 느낍니다.
요즈막에 전라도 두멧시골에서 지내며 하루 내내 멧새 노래를 듣는데, 여름으로 접어드는 이때에는 해거름부터 한밤까지 개구리 노래잔치를 듣습니다. 쉴새없이 노래하는 멧새하고 개구리를 곁에 두면서 생각하지요. 쉰 해 앞서도, 백 해 앞서도, 오백 해나 즈믄 해 앞서도, 만 해나 십만 해 앞서도,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바로 이 멧새·개구리 노래를 언제나 함께했으리라고.
2019년에서 백 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은 어떤 나라였을까 하고 헤아린 이야기를 담은 《백투더 1919》(오승훈·엄지원·최하얀, 철수와영희, 2020)를 읽었습니다. “신문기자, 100년 전으로 가다”란 이름으로 여민 이야기이기에, 시골사람 눈도 아니고, 아이를 돌보는 어버이 눈도 아니며, 1919년 3월 그날을 지식인은 어떻게 바라보았나 하는 눈길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도라에몽 주머니나 책상서랍이 있다면, 2019년을 사는 몸으로도 1919년으로 거뜬히 찾아가서 몸으로 겪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낼 만하겠지요. 도라에몽 주머니나 책상서랍은 만화책에나 나오는 일이라 여길 테지만, 2019년에 1919년을 그리며 옛 신문을 뒤적여 ‘어제를 오늘 새롭게 읽을’ 적에도 꿈으로 엮는 이야기이기는 매한가지예요.
지난날에 누가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역사책은 흔히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들만 다룹니다만, ‘한’ 사람들은 거의 못 다루거나 안 다뤄요. 조선왕조실록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라를 ‘이끈’ 사람들은 다루지만,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좀처럼 못 다뤄요.
오랜 나날을 거슬러서 오늘을 새로 읽는다고 한다면, ‘3·1운동 피검자 1만 9525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어느 책에도 신문에도 이름이 안 적힌’ 돌이순이 이야기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요? 시골돌이하고 시골순이로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흙을 짓는 흙돌이랑 흙순이로서 굽이치는 물결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엮어 볼 만하지 싶습니다.
그나저나 《백투더 1919》를 읽노라면 1919년 그무렵에 ‘공무원이나 교사·변호사 같은 안정적 직업’을 바라는 지식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땅을 가꾸고 숲을 돌보는 사람은 이 길을 고스란히 이었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익힌 이들은 ‘돈을 잘 벌고 자리를 잘 지키는’ 도시 일자리를 바랐다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앞길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만할까 궁금합니다. 백 해 앞을 돌아보았다면, 백 해 뒤를 내다보면 어떨까요. 2199년에도 아직 ‘안정적인 직업’만 바라보는 우리 모습일는지, 그때에는 어깨동무하면서 들숲바다를 푸르게 돌보는 싱그러운 모습일는지, 슬쩍 엿보고 싶습니다. 어제를 보며 오늘을 배우고, 오늘을 살며 모레를 그리는, 슬기롭고 사랑스러운 어린이하고 푸름이가 되도록,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다같이 힘쓰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ㅅㄴㄹ